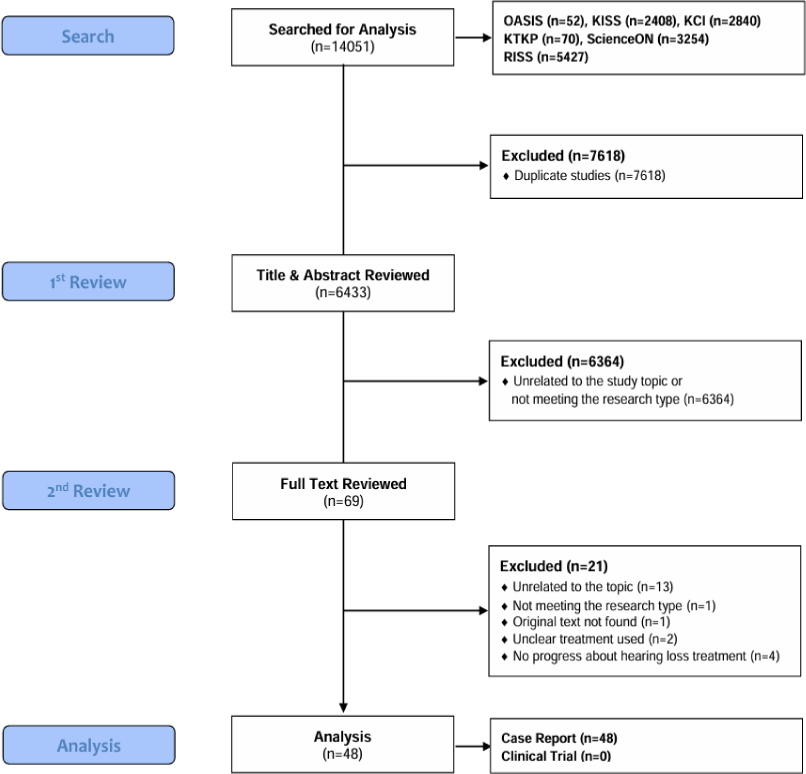Ⅰ. 서 론
난청은 25㏈ 이상에서 나타나는 청력 저하를 총칭하는 말로, 중이염, 내이염, 소음, 약물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 난청은 발생 부위에 따라 전음성, 감음성 난청으로 분류되며, 감음성 난청은 신경성, 중추성, 내이성 난청으로 구분된다2).
전음성 난청은 10 - 20㏈ 이상의 기도 - 골도 청력 차이를 나타내며, 음을 전달하는 기관인 외이, 중이의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다3). 감음성 난청은 음을 인식하는 청신경계 손상에 의해 유발되며, 이 경우 기도 - 골도 청력은 비슷하게 저하되어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1). 난청은 眩暈, 耳鳴, 耳漏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2), 난청 환자는 의사소통 저하로 인한 고립, 좌절,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기도 한다4). 보고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약 16.1%가 어음역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약 31% 정도는 고음역 청력손실을 나타냈다5).
난청의 한의학적 병인으로는 腎虛, 氣虛, 血虛, 肝火, 痰火, 風濕, 風熱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병인이 耳竅를 閉塞시켜 난청이 나타난다고 언급된다6). 한의학에서는 난청을 耳聾의 범주로 보고 陰精虧虛, 心脾兩虛, 氣血瘀阻, 邪遏少陽, 肝鬱化火 등으로 변증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다. 난청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銀杏, 人蔘, 黃芪 등이 난청 환자의 청력 역치를 높이고 이명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보고한 Castañeda 등7)의 연구나, 침치료와 현대의학적 보존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돌발성 난청이 더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음을 확인한 Zhang 등8)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원인 질환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난청 또한 다수 존재하며, 이 경우 특정 질환에 국한된 치료만으로는 효율적 난청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1,2). 또한 환자는 질환보다 증상에 기반하여 의사를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상에서는 질환이 아닌 증상 중심의 접근의 요구되곤 한다. 때문에 난청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증상 위주의 치료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 기존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난청의 한의학적 치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연구는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현존하는 소수의 관련 보고 역시 근 5년간의 최신 지견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난청 중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9,10).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출판된 난청의 한방 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를 수집 - 분석하여 난청의 한방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보고함과 동시에, 추후 진행될 난청 치료 및 후속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자 3인이 KTKP (koreantk.com), ScienceON (scienceon.kisti.re.kr), OASIS (oasis.kiom.re.kr), KISS (kiss.kstudy.com), KCI (www.kci.go.kr), RISS (www.riss.kr)를 통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난청의 한방 치료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검색 키워드로는 “난청”, “Hearing Loss”, “Hearing Impairment”, “Deafness”가 사용되었다.
난청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시행한 임상 논문 (Case Report, Retrospective Chart Review, Clinical Trial)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러 검색 엔진 상 혹은 하나의 검색 엔진 내에서 제목, 게재 학술지, 서지 정보 등이 동일하게 표기된 논문은 중복 논문으로 간주하여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제하였다. 학위 논문, In Vivo, In Vitro, Literature, Review, Protocol, Abstract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한의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난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논문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난청 치료 후 호전이 미진했다고 기술한 논문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약침, 전침 추나와 같은 기타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거나 난청에 대한 치료 경과 파악이 미진한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OASIS에서 52편, KISS에서 2,408편, KCI에서 2,840편, KTKP에서 70편, ScienceON에서 3,254편, RISS에서 5,427편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 중복 논문 7,618편을 제외하고 총 6,433편의 논문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해당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분석하였으며, 주제와 무관하거나 연구 형태가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논문 6,364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선별된 논문 69편 중 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13편, 연구 형태가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논문 1편, 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논문 1편, 사용된 치료법이 불분명한 논문 2편, 난청에 대한 치료 경과 확인이 미진한 논문 4편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48편의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 1).
각 연구의 서지 정보, 주증상 및 동반 증상, 치료 기간, 치료 방법, 치료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방법은 치료 약물(처방), 치료 약물 구성(본초), 치료에 사용된 경락 및 경혈로 세분화했다.
연구 디자인이 전향적인지 후향적인지에 따라 연구 형태를 증례 보고와 임상 시험으로 분류하였다. 이름이 같은 처방은 동일 처방으로 간주해 분석하였으며, 한 연구 내에서 처방 구성이 변경될 경우 각 처방과 본초를 별도의 치료법으로 계산하였다. 처방 구성에 대한 내용이 본문 내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기성 연조제, 과립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정확한 구성 약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본초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초의 기원, 부위는 서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나, 乾薑 - 生薑, 熟地黃 – 生地黃 – 乾地黃 등을 제외하면 본초의 제형, 포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약침, 전침, 구법, 부항, 추나, 물리치료 등의 기타 치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Ⅲ.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48편의 논문 중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이 25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대한침도의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5편), 대한침구의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3편), 사상체질의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3편), 혜화의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3편) 등이 존재하였다.
| Author (Year) | Title | Journal |
|---|---|---|
| Mun et al. (2006)11) | The Assessments of Prognotic Factors o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The Clinical Study with Acupuncture Treatment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
| Kim et al. (2023)12) | A Case of Chronic Meniere's Disease Improved by Korean Medicine Treatment Including Pharmacoacupuncture of Cervical and Temporomandibular Area - A Case Report | Journal of Korean Medicine |
| Lee et al. (2015)13) | A Case Report of Tinnitu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Treated with Melonis Calyx Vomiting Therapy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Lee et al. (2016)14) | A Case Report of Acute Labyrinthitis Diagnosed Patient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Jang et al. (2016)15) | Clinical Case Study of Facial Nerve Paralysis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Tinnitus Caused by Traumatic Temporal Bone Fracture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
| Kwon et al. (2002)16) | The Clinical Study of Three Patients Hospitalized Due to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Park et al. (2014)17) | A Case Report of Tinnitus Occurred in the Sudden Sensory Neural Hearing Loss Treated with Korean Medical Treatments | Herbal Formula Science |
| Kim et al. (2007)18) | A Clinical Case Study on the Tinnitu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Journal of Hyehwa Health & Bio Medicine |
| Yoon et al. (2003)19) | Six Case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Jo et al. (2015)20) | Four Cases of Tinnitu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Treated by Daehamhyung-tang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Lee et al. (2022)21) | Three Cases of Sudden Hearing Loss Improved after East-West Medical Combined Treatment through Cooperation in a Hospital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hin et al. (2019)22) | Treatment of Ramsay Hunt Syndrome Using Korean Medicine Including Sinbaro3 Pharmacopuncture: A Case Report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
| Park et al. (2006)23) | One Cases of Meniere's Disease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Jang et al. (2011)24) | Clinical Reports of the Meniere's Disease in the Diagnosis of Deficiency-Excess |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
| Lee et al. (2005)25) | Two Cases of Meniere’s Disease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Rho et al. (2022)26) | A Case Report of Patient with Meniere’s Disease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
| Lee et al. (2004)27) | Oriental Medical Treatment in Meniere’s Disease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
| An et al. (2016)28) | A Case of Korean Medical Treatment of Relapsing Sudden Hearing Loss Occurred Three Months Later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on et al. (2016)29) | Two Cases of Korean Medical Treatment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out Corticosteroid Treatment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Han et al. (2013)30) | A Case of Korean Medical Treatment of Sudden Hearing Loss with Severe Vertigo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ong et al. (2022)31) | A Case of Adult Otitis Media with Effusion Accompanied by Atopic Dermatiti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Chun et al. (2003)32) | Two Cases of Sudden Deafness Treated with Herbal Acupuncture Therapy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Kang et al. (2021)33) | A Case Report of Yeoldahanso-tang on Sudden Hearing Loss and Tinnitus after Trigeminal Schwannoma Surgery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
| Kang (2016)34) | Bal Mong Ja Acupuncture Treatment of Sudden Sensory Hearing Loss with Tinnitus and Dizziness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
| Park (2004)35) | Clinical Study of Patient with Traumatic Temporal and Occipital Bone Fracture |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
| Kim et al. (2013)36) | A Case of Korean Medical Treatment of Sudden Hearing Loss with Tinnitus, Aural Fullness | Journal of Hyehwa Health & Bio Medicine |
| Kim et al. (2001)37) | The Clinical Observation of 5 Cases of Tinnitus with Physical Conditions and Myology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Lee et al. (2011)38) | A Case Study of a Taeeumin Patient with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that Accompanied with Tinnitus who was Treated with Cheongsimyeonja-tang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
| Hwang et al. (2017)39) | The Clinical Study on 20 Case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 Korean Medical Hospital Last 3 Year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Choi (2023)40) | Case Report of Sudden Hearing Loss Improved by Acupotomy and Combined Korean Medicine Treatment |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of Acupotomology |
| Kang et al. (2023)41) | A Case Report of Tinnitus and Hearing Loss Improved by Treatment of Acupotomy and Intranasal Bloodletting Therapeutics |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of Acupotomology |
| Jin et al. (2021)42) | Case Report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Using Acupuncture and Acupotomy |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of Acupotomology |
| Ma (2020)43) | A Case Study of a Sudden Hearing Loss Patient with Dizziness Who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Chuna Manipulation, Vestibular Rehabilitation |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 Functional Medicine and Nutrition Association |
| Kang et al. (2023)44) | A Case Report of Tinnitus Patient Treated with a Comprehens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Including Acupuncture and Acupotomy |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of Acupotomology |
| Jo et al. (2002)45) | A Clinical Report for Treatment 2 Cases on Takrisodokyeum of Otitis Media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Ko et al. (2021)46) | A Case Report of Vestibular Schwannoma Misdiagnosed as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Jea et al. (2021)47) | Therapeutic Effect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Combined with Threshold Sound Conditioning on Presbycusis: A Case Report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Park et al. (2022)48) | Therapeutic Effect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Combined with Threshold Sound Conditioning on Bilateral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Case Report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ong et al. (2022)49) | A Case Report of 18-year Chronic Tinnitus Treated by Korean Medicine Complex Treatment | Journal of Korean Medical Society of Acupotomology |
| Kim et al. (2019)50) | Three Case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 Complete Recovery by Korean Medical Treatment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ong et al. (2010)51) | A Case of Bilateral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 Incomplete Recovery by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therapy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Seo et al. (2022)52) | A Case Repor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Sudden Hearing Loss Accompanied by Tinnitu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Jeong et al. (2004)53) | Vertigo and Sudden Hearing Loss Caused by Pontine Infarction |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
| Hwang-bo et al. (2004)54) | A Clinical Report for 2 Cases on Hyeonggaeyeongyotanghab-bojungikgitang of Otitis Media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Ahn et al. (2023)55) | A Case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fter COVID-19 Vaccination | Journal of Hyehwa Health & Bio Medicine |
| Kim (2022)56) | A Clinical Case of Lymphadenopathy and Hearing Loss after Covid-19 Vaccination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Yu et al. (2006)57) | Three Case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 Marked or Complete Recovery |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 Kim et al. (2003)58) | A Case Study of One Patient Who Has the Sudden Deafness and Tinnitus Caused by Stress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
돌발성 난청에 대한 증례가 69례로 가장 많았으며, 메니에르병에 대한 증례(12례)도 10례 이상 존재하였다. 이명 환자가 난청을 호소한 경우(5회)나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호소를 보고한 사례(5회)도 다수 확인되었다.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 중에는 耳鳴이 84회로 가장 많았으며, 耳充滿感(50회), 眩暈(41회), 頭痛(1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회 이상 언급된 처방으로는 拱辰丹(12회), 順氣活血湯(11회), 大陷胸湯(9회), 防眩溫膽湯(5회), 苓桂朮甘湯(5회), 導痰活血湯(5회), 五苓散(4회), 半夏白朮天麻湯(4회), 補中益氣湯加味(4회), 淸心蓮子湯加味(4회), 托裏消毒飮加減(4회) 등이 있었다.
다용 본초로는 甘草(70회), 白茯苓(53회), 生薑(46회), 當歸(45회), 陳皮(42회), 柴胡(34회), 半夏(34회), 白朮(34회), 川芎(34회), 山藥(33회), 人蔘(32회), 黃芪(32회), 澤瀉(32회), 大棗(31회), 黃芩(30회) 등이 있었다.
사용된 경락 중에서는 足少陽膽經이 231회로 가장 많았으며, 手少陽三焦經(223회), 手太陽小腸經(117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혈자리는 聽宮(SI19, 83회)이었으며, 翳風(TE17, 76회), 耳門(TE21, 66회), 聽會(GB02, 61회), 風池(GB20, 53회), 百會(GV20, 50회), 外關(TE05, 45회), 完骨(GB12, 33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腎正格(5회), 肝正格(3회), 肝勝格(3회)과 같은 舍岩鍼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駟馬上(3회), 駟馬中(3회), 駟馬下(3회) 등의 董氏鍼法에 대한 연구도 존재했다.
耳部 阿是穴(9회)이나 구개범장근(8회), 승모근(8회), 경추 후관절 및 횡돌기(각 7회), 두판상근(7회), 견갑거근(7회), 두반극근(7회), 구개거근(7회)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침치료 시행 사례도 발견되었다.
각 연구별 자세한 분석 내용은 Table 6과 같다.
Ⅳ. 고 찰
난청은 4개 주파수(500㎐, 1000㎐, 2000㎐, 4000㎐)에 대한 청력 손실의 평균값이 25㏈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1). 난청의 진단에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누가현상검사, 유발 반응 검사 등이 활용되며, 종양, 뇌혈관 병변, 구조적 기형 등이 의심될 경우 CT, MRI와 같은 영상 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2). 난청의 치료에는 혈관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된다. 전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 고실성형술, 유양동삭개술, 이소골성형술 등과 같은 중이 수술 치료 또한 고려될 수 있다3,59).
미국 이비인후과학회는 2019년 돌발성 난청 진료 지침을 통해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 치료를 권장한 바 있으며, 스테로이드와 고압 산소 치료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60). 그러나 장기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체내 글루코스테로이드 대사 교란을 야기하며, 과도한 고압산소 치료 역시 압력 외상성 병변, 산소 독성, 폐쇄공포증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61,62).
난청의 치료 -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새로운 난청 치료법 개발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63). 그러나 새로운 난청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청의 한방 치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연구는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검색 엔진 (KTKP, ScienceON, OASIS, KCI, KISS, RISS)을 통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난청 환자의 한방 치료 관련 임상 논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각 연구의 서지 정보, 주증상, 동반 증상, 치료 기간, 치료 방법, 평가 척도, 치료 결과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료 방법은 사용된 처방, 처방 구성, 경락, 경혈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서는 돌발성 난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69례),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 환자에 대한 보고도 다수 확인되었다(12례). 동반 증상 중에서는 耳鳴이 84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耳充滿感(50회), 眩暈(41회), 頭痛(1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자가 근골격계,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그 수는 적은 편이었다. 환자별 치료 기간은 수일부터 수개월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평균 치료 기간은 42.56일이었다.
난청 치료에 사용된 한약 처방으로는 拱辰丹(12회), 順氣活血湯(11회), 大陷胸湯(9회), 防眩溫膽湯(5회), 苓桂朮甘湯(5회), 導痰活血湯(5회), 五苓散(4회), 半夏白朮天麻湯(4회), 補中益氣湯加味(4회), 淸心蓮子湯加味(4회), 托裏消毒飮加減(4회) 등이 있었다.
치료에 사용된 처방을 분석한 결과, 活血, 行氣, 祛痰 효능을 가진 처방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淸熱, 補氣, 利水 효능을 가진 처방들도 다수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順氣活血湯은 順氣, 活血 효능을 가져 중풍 전조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안면마비, 감각이상, 마비감 등에 사용되는 처방이다64). 紅花, 當歸, 丹蔘, 桃仁, 半夏, 香附子, 枳殼, 桔硬 등으로 구성된 導痰活血湯은 活血, 行氣, 豁痰 효능을 가지는 방제로, 혈압 강하, 혈소판 응집억제 등을 통해 항혈전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처방이다65,66). 氣滯, 瘀血, 痰鬱로 인해 혈액 순환 이상을 호소하는 난청 환자에게 順氣活血湯이나 導痰活血湯을 투여하면 解鬱化痰, 順氣活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鹿茸, 麝香, 山茱萸, 當歸 등으로 구성된 拱辰丹은 과로, 정신적 피로 등으로 인해 신경이 과민해지고 몸이 쇠약해진 肝虛 환자에게 사용되는 처방이다67). 補中益氣湯加味는 中氣下陷, 中氣不足 환자에게 사용되는 처방으로, 益氣升陽하여 환자의 전신 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지닌다68). 이를 고려할 때 拱辰丹이나 補中益氣湯加味는 虛勞한 난청 환자의 元氣를 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茯苓, 澤瀉 등으로 구성된 苓桂朮甘湯, 五苓散은 利水滲濕 효능을 가지는 약물로 口渴, 水腫, 小便不利와 같은 水濕停滯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69). 半夏白朮天麻湯은 頭痛, 眩暈 등의 痰飮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혈관 긴장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어지러움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68,70,71). 상기 효능을 고려할 때 水氣나 痰飮으로 인한 眩暈, 頭痛 증상을 호소하는 난청 환자에게 苓桂朮甘湯이나 五苓散, 半夏白朮天麻湯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防眩溫膽湯은 加味溫膽湯에 淸熱瀉火 효능을 가진 黃連, 黃芩, 梔子, 天麻, 甘菊, 蔓荊子 등을 가감한 처방이며24,72), 淸心蓮子湯加味는 淸熱之劑인 黃芩, 地骨皮 등과 利水之劑인 車前子, 赤茯苓, 補氣之劑인 人蔘, 黃芪 등을 배합한 처방이다68,69). 상기 효능을 고려할 때, 防眩溫膽湯이나 淸心蓮子湯加味는 환자가 痰火로 인한 頭痛, 眩暈 증상이나 口乾, 煩渴, 小便赤澁과 같은 心火上炎 증상을 호소할 경우 淸心利水, 淸熱祛痰을 목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大黃, 芒硝, 甘遂로 구성된 大陷胸湯은 手不可近, 心下滿而硬痛, 胸連臍腹痛硬 등과 같은 大結胸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난청 환자가 동반 증상으로 結胸證을 호소할 때 사용해볼 수 있다73). 消腫, 排膿 작용을 가진 托裏消毒飮加減은 NF-κB 활성 억제를 통해 항염증, 항산화, 항알레르기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처방이다. 托裏消毒飮加減은 염증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난청 환자에게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4,75).
치료에 사용된 본초로는 甘草(70회), 白茯苓(53회), 生薑(46회), 當歸(45회), 陳皮(42회), 柴胡(34회), 半夏(34회), 白朮(34회), 川芎(34회), 山藥(33회), 人蔘(32회), 黃芪(32회), 澤瀉(32회), 大棗(31회), 黃芩(30회) 등이 있었다. 다용 본초 대부분은 半夏白朮天麻湯, 補中益氣湯의 구성 약재였으며, 이는 처방에서 언급되었던 補氣, 利水, 祛痰, 活血 등의 한의학적 치법이 난청의 치료 방향성과 합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甘草, 當歸, 白朮, 人蔘, 黃芪 등은 氣血陰陽이 부족한 환자의 신체를 滋補하여 신체 허약 증후를 해소하는 약재이며, 白茯苓, 澤瀉 등은 체내 水濕을 제거하는 利水渗濕藥 계열의 본초이다76). 본 연구에서 補益藥과 利水藥이 난청 치료에 다용된 까닭은 환자의 精脫腎虛 상태를 치료함과 동시에 귀에 濕邪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耳聾 증상을 해결하기 위함일 것으로 추정된다77,78). 비슷한 이유로 溫熱, 理氣, 化痰, 活血祛瘀, 辛凉解表 작용을 갖는 본초들 역시 耳聾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청 치료에 사용된 경락 중에서는 足少陽膽經이 231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手少陽三焦經(223회), 手太陽小腸經(117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난청 치료에 사용된 경혈로는 聽宮(SI19, 83회), 翳風(TE17, 76회), 耳門(TE21, 66회), 聽會(GB02, 61회), 風池(GB20, 53회), 百會(GV20, 50회), 外關(TE05, 45회), 完骨(GB12, 33회)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지부 혈자리인 外關(TE05)을 제외하면 모두 두면, 경항부에 위치한 혈자리들 이었다.
膽經, 三焦經, 小腸經은 귀 부위에 유주하는 經絡으로, 유주 부위의 氣血循環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당 부위의 寒熱風火를 조절하는 효능을 나타낸다79). 본 연구에서 관찰된 膽經, 三焦經, 小腸經의 난청 완화 효능은 이러한 작용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耳部 阿是穴(9회)이나 구개범장근(8회), 승모근(8회), 경추 후관절 및 횡돌기(각 7회), 두판상근(7회), 견갑거근(7회), 두반극근(7회), 구개거근(7회)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침치료 시행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翳風(TE17), 完骨(GB12), 聽宮(SI19), 聽會(GB02), 耳門(TE21) 등과 같은 두경부 - 이부 혈위에 대한 침치료 역시 난청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난청 치료 시에는 膽經, 三焦經, 小腸經 穴位를 일차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식일 것이며, 해당 經絡의 두경부 - 이부 아시혈에 外關(TE05) 등의 遠位取穴 穴位를 가감하여 사용하면 치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청 호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논문(11편)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大陷胸湯(5회), 半夏白朮天麻湯(4회) 淸心蓮子湯加味(4회), 加味逍遙散加減(2회), 淸肝二四湯(2회), 茯苓杏仁甘草湯(2회), 苓桂朮甘湯(2회), 六味地黃元加味(2회), 滋陰降火湯(1회), 太陰人 太陰調胃湯加味(1회). 加味逍遙散(1회), 淸心蓮子湯(1회), 柴胡加龍骨牡蠣湯(1회), 眞武湯(1회), 橘皮大黃朴硝湯(1회), 黃連湯(1회), 茯苓飮(1회), 愈風丹(1회), 六味地黃湯加味(1회), 補腎之劑 加減方(1회), 加味芪歸補腎湯(1회), 苓桂朮甘湯加味(1회), 鎭肝熄風湯(1회), 防己茯苓湯(1회) 등을 난청 치료에 사용하였으나, 청력 호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관련 논문에 사용된 경혈들로는 聽宮(SI19, 12회), 聽會(GB02, 7회), 翳風(TE17, 7회), 風池(GB20, 6회), 太衝(LR03, 6회), 耳門(TE21, 5회), 合谷(LI04, 5회), 外關(TE05, 4회), 腕骨(SI04, 4회), 陽陵泉(GB34, 3회), 風府(GV16, 3회), 足三里(ST36, 2회), 大迎(ST05, 2회), 太陽(EX-HN5, 1회), 肩井(GB21, 1회), 三陰交(SP06, 1회), 天容(SI17, 1회), 天牖(TE16, 1회), 百會(GV20, 1회), 地倉(ST04, 1회), 頰車(ST06, 1회) 등이 있었으며, 肝勝格(3회), 腎正格(2회), 脾正格(1회), 肺正格(1회), 駟馬上(1회), 駟馬中(1회), 駟馬下(1회)와 같은 특수 부위나, 아시혈(4회), 흉쇄유돌근 쇄골지(2회), 경부 경결점(1회)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침치료 사례도 존재했다. 황 등39) 또한 한방 치료를 시행한 난청 환자 17례 중 8례에서 증상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난청 치료가 무효했던 까닭은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거나, 난청을 주된 치료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치료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난청의 치료 -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난청 치료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난청의 한방 치료에 대한 국내 임상 논문을 분석 -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분석 연구의 근거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여러 개입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법의 개별 효능 분석이 어렵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요약
난청의 한방 치료에 대한 국내 임상 논문을 정리 -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난청에 동반되었던 증상으로는 耳鳴(84회), 耳充滿感(50회), 眩暈(41회), 頭痛(14회) 등이 있었다. 난청을 유발했던 질환으로는 돌발성 난청(69례), 메니에르병(12례), 이명(5례), 중이염(5례) 등이 확인되었다.
-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본초는 甘草(70회), 白茯苓(53회), 生薑(46회), 當歸(45회), 陳皮(42회), 柴胡(34회), 半夏(34회), 白朮(34회), 川芎(34회), 山藥(33회), 人蔘(32회), 黃芪(32회), 澤瀉(32회), 大棗(31회), 黃芩(30회) 등이었다. 상기 본초 대부분은 난청 치료에 사용되었던 다빈도 처방인 半夏白朮天麻湯, 補中益氣湯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
한약 처방 중에서는 拱辰丹(12회), 順氣活血湯(11회), 大陷胸湯(9회), 防眩溫膽湯(5회), 苓桂朮甘湯(5회), 導痰活血湯(5회), 五苓散(4회), 半夏白朮天麻湯(4회), 補中益氣湯加味(4회), 淸心蓮子湯加味(4회), 托裏消毒飮加減(4회)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
경혈 중에서는 聽宮(SI19, 83회), 翳風(TE17, 76회), 耳門(TE21, 66회), 聽會(GB02, 61회), 風池(GB20, 53회), 百會(GV20, 50회), 外關(TE05, 45회), 完骨(GB12, 33회)이 경락 중에서는 足少陽膽經(231회), 手少陽三焦經(223회), 手太陽小腸經(117회)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
난청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에 대한 고려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처방은 大陷胸湯(5회), 半夏白朮天麻湯(4회) 淸心蓮子湯加味(4회) 등이었으며, 사용된 경혈은 聽宮(SI19, 12회), 聽會(GB02, 7회), 翳風(TE17, 7회), 風池(GB20, 6회), 太衝(LR03, 6회), 耳門(TE21, 5회), 合谷(LI04, 5회), 外關(TE05, 4회), 腕骨(SI04, 4회), 陽陵泉(GB34, 3회), 風府(GV16, 3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