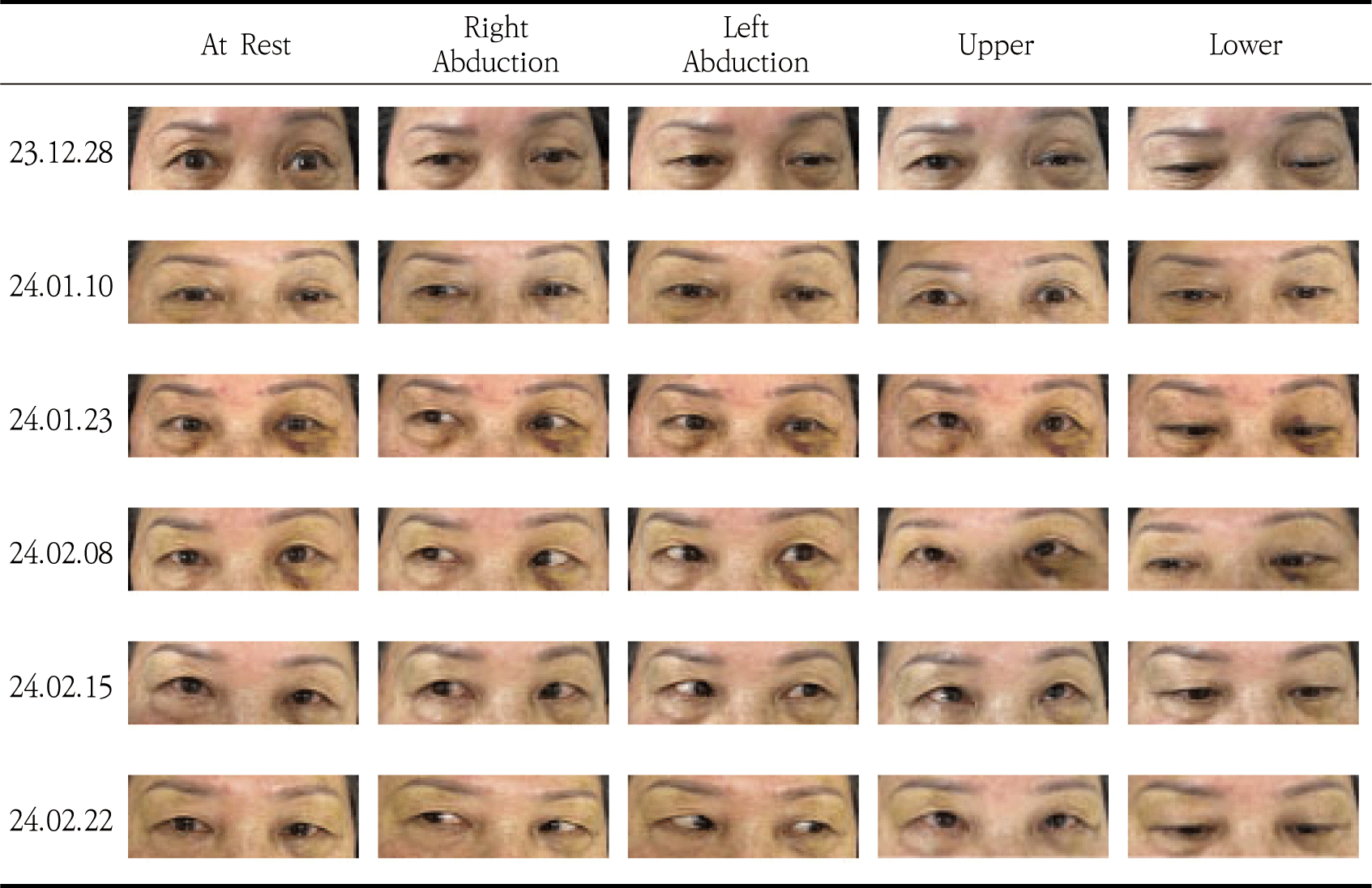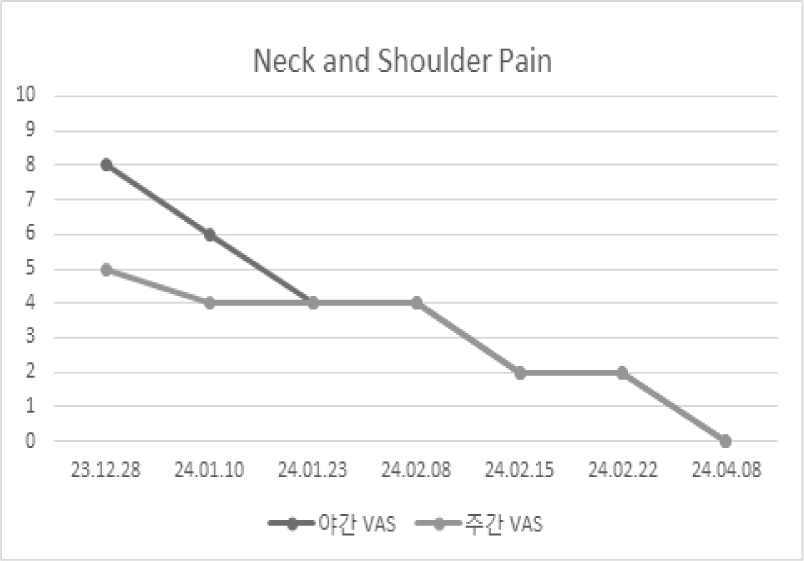Ⅰ. 서 론
밀러 피셔 증후군(MFS, Miller-Fisher Syndrome)은 실조증(ataxia), 건반사 소실(areflexia), 안근마비(ophthalmoplegia)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다발신경증으로, 1956년 Charles Miller Fisher가 실조증, 건반사 소실, 안근마비가 있고 단백-세포해리가 뇌척수액검사에서 보이면서 좋은 예후를 가진 3명의 환자를 보고하면서 MFS를 길랑바레증후군(GBS, Guillain-Barre syndrome)의 아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1). 전 세계적으로 GBS의 연간발병률은 10만 명당 1-2명이고, MFS의 연간발병률은 서구에서 GBS의 1-7% 비율로 드물지만, 아시아에서는 18-25%로 비교적 흔한 편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며, 모든 연령에서 관찰되나 30-39세와 50-59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된다2).
MFS는 약 80%에서 증상 발생 전 선행감염의 병력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생긴 항체에 의해 원인균주 외막에 포함된 지질다당류와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강글리오사이드에 면역반응이 유발되어 발생한다2). 이에 치료로서 면역중재요법인 혈장교환술이나 정맥 내 면역글로불린(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복기간의 단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8).
MFS 관련 국내 한의학적 연구로는 총 10개의 증례보고가 있으며, 2000년 정 등3)이 양안의 완전 외안근마비 및 안면마비를 주소로 1례, 2003년 두 등4)이 동안신경마비를 주소로 1례, 2009년 차 등5)이 불면증 주소로 1례, 2019년 이 등6)이 복시, 동공산대, 하지 운동실조를 주소로 1례, 2020년 윤 등7)이 외전신경마비를 주소로 1례 등 증례마다 다양한 양상의 환자들을 보고하고 있다. 발표된 증례연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초기 증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양방 치료 후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아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였다.
이에 저자는 MFS로 진단받고 양방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 완전 안근마비 및 그로 인한 복시, 현훈, 우측 안면마비 등의 주소가 호전되지 않아 내원한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치험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
연구 윤리 :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승인번호 WKIRB 2024-09).
-
환자 : 정OO F/69
-
진단 : R/O Guillain-Barre syndrome, R/O Miller Fisher syndrome
-
발병일 : 2023년 12월 13일
-
주소증 : Ophthalmoplegia(Both eyes), Rt. facial palsy, Diplopia
-
부증상 : Ophthalmalgia(Lt.), Dizziness, Gait disturbance, Neck & Shoulder pain, Hyporeflexia
-
과거력 : 2013년 우측 회전근개파열 수술, 2015년 양측 무릎수술, 2015년 우측 임파선수술, 2013년 및 2023년 허리협착층 수술.
-
가족력 : 뇌졸중(母)
-
현병력 : 상기 환자 69세 여성으로 2023년 12월 9일 폐렴 진단 하에 씨티병원 입원 중 2023년 12월 13일 Biocular diplopia 발생하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B-MRI 및 안과검사 상 별무이상 소견 듣고 CSF 천자술 권유받았으나 환자 거부 후 재가요양하였다.
2023년 12월 14일 상기 증상으로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Post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23년 12월 18일 Rt. facial palsy 확인되어 조선대학교 병원 진료 권유받고 퇴원하였다.
2023년 12월 18일 조선대학교 병원 내원하여 B-CT, CSF 천자술 시행 후 R/O Guillain-Barre syndrome, R/O Miller Fisher syndrome 소견 하에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IVIg D5을 주입하였다. 이후 상기 증상 호전 없이 지속되었고 환자 및 보호자 적극적인 한방치료 원하여 2023년 12월 28일 퇴원 후, 본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통해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 입원하였다.
食事 : 고형식을 먹지 못할 정도의 소화불량으로 요플레, 계란 등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
食慾 : 식욕부진으로 일반식의 1/3 분량 정도로 섭취
睡眠 : 淺眠 (7시간/일, 경견부 불편감으로 인한 수면유지장애)
小便 : 好
大便 : 平(1회/1일)
面診 : 白
舌診 : 舌淡苔白
腹診 : 軟
脈診 : 細
-
1) B-MRI, B-CT : 2023년 12월 13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B-MRI 및 제반 안과검사 상 별무이상 소견 들음. 2023년 12월 18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B-CT상 별무이상 소견 들음.
-
2) Lab : 2023년 12월 19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혈청 미생물학적 검사 상 Mycoplasma pneumoniae 항체 음성, Cytomegalovirus (CMV)에 대한 항체는 IgG 양성, IgM 음성, Epstein Barr virus(EBV)에 대한 항체는 Viral capsid antigen(VCA) IgG 양성, VCA IgM 음성 확인. 증상 발생 7일인 2023년 12월 19일 시행한 혈청 항GQ1b 항체 검사에서 음성 확인.
-
3) CSF study : 2023년 12월 19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CSF 천자술 시행 후 R/O Guillain-Barre syndrome, R/O Miller Fisher syndrome 소견 들음.
-
4) NCS : 2023년 12월 18일 조선대학교 병원 입원 중 상하지 NCS 2회 시행하였으며, 1차 검사에서는 별무이상 소견, 2차 검사는 시행 중 통증 호소하여 중단함.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심부건 반사 검사 상 Hyporeflexia 소견 들음.
-
5) 안과검사 : 2024년 2월 17일 조선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시력검사, 안압검사, 각막모양검사 및 시신경검사 후 백내장 및 각막 염증 소견 들음.
-
6) 입원당시 주요 검사소견
-
(1) 혈액검사 : 2023.12.28 ESR 102㎜/h, AST (GOT) 60IU/L, γ-GTP 37IU/L, Triglyceride 161㎎/㎗. 2024.02.21 ESR 42㎜/h, AST (GOT) 20IU/L, γ-GTP 12IU/L, Triglyceride 140㎎/㎗, LDL Cholesterol 168㎎/㎗.
-
(2) 소변검사 : 특이사항 없음.
-
(3) Chest X-ray : 특이사항 없음.
-
(4) EKG : 특이사항 없음.
-
(5) 신경학적 검사 및 심부건 반사 : Motor Grade(None specific), pupil(None specific), BTR(+/+) PTR(+/+)
-
-
1) 2023년 12월 18일 조선대학교 병원 입원 중 Arobest 20㎎, Lyrica 25㎎, Atozet 10/10㎎ 복약.
-
2) 2023년 12월 28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처방한 Arobest 20㎎, Lyrica 25㎎, Muscosta 100㎎ 3T#3 tid 14일간 복약.
-
3) 2024년 1월 11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기존약에서 Arobest 20㎎, Lyrica 75㎎, Mucosta 150㎎, Celebrex Cap. 100㎎ 2T#2 bid(아침, 저녁 식후)로 변경하였으나 복약 후 현훈, 두전증, 수면시간 증가 등 부작용 호소하여 2024년 1월 15일 Arobest 20㎎, Lyrica 25㎎, Mucosta 150㎎ 3T#3 tid로 변경하여 17일간 복약.
-
4) 2024년 1월 18일 좌측 눈썹부위 통증 호소하시어 본원에서 처방한 Atnolcet Semi Tab 1T Qd(아침 식후) 37일간 복약.
-
5) 2024년 2월 1일 Arobest 20㎎, Mucosta 150㎎ 소진 후 본원에서 처방한 samsung Baclofen Tab 2T#2 bid(아침, 저녁 식후) 7일간 복약.
-
6) 2024년 2월 6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처방한 Lyrica 25㎎ 3T#3 tid, 본원에서 처방한 samsung Baclofen Tab 2T#2 bid(아침, 저녁 식후), Mucosta 100㎎, Vitamedin Cap. 50㎎1T Qd(아침 식후) 19일간 복약.
동공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안구의 상하좌우 움직이 는 정도를 자로 측정하여 안근마비 정도를 평가하였고, 추가적으로 내외전시에는 최대 안구 운동 시 남아있는 흰자의 길이도 측정하여 경과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Scott and Kraft가 기술한 대로 환측 안구의 환측 주시 장애의 정도는 내자에서 외자까지를 10등분한 후 10등분한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외측을 주시할 때 안구가 외전되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0(정상), ╶1(정상의 75%), ╶2(정상의 50%), ╶3(정상의 25%), ╶4(중간선을 넘지 못함)으로 기록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입원 시 양안의 완전마비로 모든 범위에서 복시 증세를 보여 신체 활동 및 보행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안근마비가 호전됨에 따라 복시 범위가 감소할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검사자의 코를 주시한 상태에서 펜 라이트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의 빛을 하나로 인지하는 최대 각도까지 측정함으로써 복시 범위를 관찰하였다.
우측 안면마비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1976년 일본에서 개발된 국소적 안면신경 평가 도구인 Yanagihara Grad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10개의 각기 다른 안면 기능을 측정하는데, 안면마비 정도에 따라 4-normal, 2-partial paralysis, 0-no motility로 평가하는 3-point system과 4-normal, 3-slight paralysis, 2-moderate, 1-severe, 0-total로 평가하는 5-point system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증례는 5-point system을 활용하였으며, 최고 점수는 40점이다.
일회용 Stainless호침(동방침, 0.3×40㎜)을 사용하였으며, 치료 혈위는 양측 絲竹空(TE23), 攢竹(BL2), 陽白(GB14), 太陽(EX-HN5), 瞳子髎(GB1), 承泣(ST1), 睛明(BL1), 合谷(LI4), 足三里(ST36), 우측 頰車(ST6), 地倉(ST4), 下關(ST7), 巨髎(ST3), 顴髎(SI18), 聽宮(SI19), 翳風(TE17), 百會(GV20), 水溝(GV26), 承漿(CV24)을 선택하였다. 15분 동안 留鍼하며 눈가리개로 안구 부위를 가린 후 안면부에 적외선을 조사하였다. 자침 횟수는 입원치료 시 1일 2회, 외래치료 시 1일 1회 시행하였다.
대한약침제형연구회에서 원외탕전으로 조제 의뢰한 산양산삼 약침 1㎖를 양측 絲竹空(TE23), 攢竹(BL2), 陽白(GB14), 太陽(EX-HN5), 우측 地倉(ST4), 下關(ST7), 翳風(TE17)에 나누어 주입하였으며, 입원치료 시 5회/주, 외래치료 시 매회 시행하였다.
본 증례는 加味補益湯을 탕제로 제조하여 1일 3회 3첩 3팩(120㏄/pack)을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복용기간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총 59일)이다(Table 2).
1일 1회 환측 안면부에 SSP(silver spike point), Lazer, 향기치료, 안면 마사지를 시행하였고, 경항견배부에 ICT, Hot pack, MW(microwave)를 시행하였다.
본원 입원 중에도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경견부의 통증 및 저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처방한 근이완제 Arobest 20㎎,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에 주로 쓰이는 중추신경용약 Lyrica 25㎎, 소화성궤양용제 Mucosta 150㎎을 지속적으로 복약하였으며, 경견부 불편감 지속되어 2024년 1월 11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진통, 소염제인 Celebrex Cap. 100㎎을 추가 처방하고, Lyrica 25㎎→75㎎, Mucosta 100㎎→150㎎으로 증량 후 용법을 tid→bid로 변경하였으나 현훈, 두전증, 수면시간 증가 등의 부작용 호소로 기존의 용법 및 용량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Arobest 20㎎의 이른 소진으로 본원에서 골격근 이완제인 samsung Baclofen Tab.를 대체 처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본원 입원 중 좌측 눈썹부위 통증 완화 목적으로, 진통, 소염제인 Atnolcet Semi Tab, 신경계통 손상의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B제인 Vitamedin Cap.을 투약하였다.
-
(1) 정면 주시 시 우측 안구는 미약하게 우측 편위 되고 좌측 안구는 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며, 양안 모두 상하좌우 운동 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4, 좌측 –4로 측정되었다. 양안 모두 안구운동 시 눈 주변 근육에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며, 좌측 눈썹 상부에서 VAS 6 정도의 통증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호소하였다.
-
(2) 물체의 상이 사선 아래에 맺히는 사선 복시를 호소하였으며, 2개의 상이 겹치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우측 물건 주시 시 복시 증상이 더 심화된다고 하였다. 양안 개안 시 복시 증상으로 인해 눈을 뜨고 있기가 불편하고 VAS 8 정도의 비회전성 현훈 발생하여 보호자 도움 없이 보행 불가하였으며, 복시 증상이 회복되기 전까지 병원 내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였다.
-
(3) 우측 안면의 전반적인 마비로 부위별 미세한 움직임만 보여 Yanagihara score 10점 측정되었으며, 특히 이마 근육의 쳐짐으로 인해 눈썹 높이 차이가 많이 나고 눈꺼풀 또한 쳐져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눈 감는 힘이 부족하여 눈시림, 눈물흘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입을 오므리거나 입꼬리 당기는 동작도 불가하여 음수 시 흘림, 식사 시 끼임 증상을 호소하였다. 안면 감각 저하로 인해 관골부의 마취된 듯한 둔감한 느낌도 호소하였다.
-
(4)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 호소하였으며 주간에는 VAS 5, 야간에는 VAS 8 정도라고 하였다. 상기 증상 심화 시 양측 팔까지 저림 증상 발생하며, 야간에 수차례 각성하여 보호자가 밤새 안마를 해주신다고 하였다. 본원 입원 당시 BTR(+), DTR(+)로 상하지 건반사는 소실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였으나 Motor Grade는 None specific하였다.
-
(1) 우측 안구는 우측 주시 시 2-3㎜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며, 최대 외전 시 유지하는 힘의 부족으로 인해 안진이 발생하였다. 좌측 안구는 좌측 주시 시 거의 움직임이 없고, 양안 모두 상하 주시 시 미약한 움직임만 있었다.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3, 좌측 –4로 측정되었다. 안구 운동 시 눈 주변 근육의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과 좌측 눈썹 상부의 통증은 지속된다고 하였다.
-
(2) 사선 복시 증상은 유지 중이나, 50㎝ 이하로 가깝게 위치한 형체는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고 멀리 있는 형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너비도 좁아 보인다고 하였다. 양안 개안 시 현훈은 VAS 5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치료실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하였다.
-
(3) 우측 이마주름은 전체적으로 잡히나 건측에 비하여 주름이 약하게 잡히고, 눈 감는 힘은 전보다 증가하여 눈물흘림이 소차 호전되었다. 입꼬리를 최대한 당겼을 때 윗니, 아랫니 갯수가 <0/0>→<5/5>로 호전되었으나, 아직 비대칭이 남아있어 음수 시 흘림이나 식사 시 끼임 증상 남아있다고 하였다. Yanagihara score 21점으로 측정되었다.
-
(4)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 VAS 4 정도로 약화되었다. 간헐적으로 야간에 상기 증상이 심화되었다.
-
(1) 정면 주시 시 양안의 동공은 편위 없이 중앙부에 위치하였다. 우안의 동공은 정상의 50%, 좌측을 주시할 때 좌안의 동공은 정상의 25% 정도로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2, 좌측 –3으로 측정되었다. 우측 안구는 좌우 주시 시 흰자가 2-3㎜ 정도 보이고, 좌측 안구는 좌측 주시 시 흰자 3-4㎜ 정도 보이며 우측 주시 시 흰자 2㎜ 정도 보였다. 양안 모두 상하 주시 시 동공의 중심이 2㎜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 우측을 주시할 때 안구 운동 시 좌측 안구의 뻐근함만 발생하며, 좌측 눈썹 상부의 통증도 VAS 3 정도로 약화되었다.
-
(2) 사선 복시 증상은 유지 중이며, 양안 개안 시 현훈은 VAS 4 정도라 하였다. 병실 앞 복도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였다.
-
(3) 우측 이마 근육의 힘의 증가로 이마주름이 더 진해져 약간의 비대칭만을 보였다. Yanagihara score 25점으로 측정되었다.
-
(4)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은 VAS 4로 유지되었다.
-
(1) 우측 주시 시 우안의 동공은 정상의 75%, 좌측 주시 시 좌안의 동공의 정상의 50%로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1, 좌측 –2로 측정되었다. 우측 안구는 우측 주시 시 흰자 1㎜ 미만으로 보이며, 좌측 주시 시 흰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좌측 안구는 좌측 주시 시 흰자 2-3㎜로 보이며 우측 주시 시 흰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측 안구는 상하 주시 시 움직임 거의 제한 없으며, 좌측 안구는 좌상부 움직임에만 제한이 있었다. 좌측 눈썹 상부의 통증은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
-
(2) 사선 복시 증상은 50㎝ 이상의 거리에서 좌측 45도 이상의 시야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우측 80도 이상의 시야와 우상방에서도 약간의 복시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양안 개안 시 현훈 증상은 유지 중이며, 병원 내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한 보행 가능하였다.
-
(3) 눈 감는 힘이 증가하여 눈시림, 눈물흘림 증상은 미약하게 호소하며, 구각부의 힘 증가로 더 이상 음수 시 흘림과 식사 시 끼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안면 감각저하 증상도 더 이상 호소하지 않았다. Yanagihara score 37점으로 측정되었다.
-
(4)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은 VAS 4로 유지 중이다.
-
(1) 우측 주시 시 우안의 동공과 좌측 주시 시 좌안의 동공은 정상의 75%로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1, 좌측 –1로 측정되었다. 우측 안구는 좌우 주시 시 흰자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이며, 우상방 주시 시 약간의 움직임 제한이 있었다. 좌측 안구는 좌우 주시 시 흰자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이며 좌상방 주시 시 약간의 움직임 제한이 있었다. 좌측 눈썹 상부의 통증은 VAS 2 정도로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
-
(2) 사선 복시 증상은 50㎝ 이상의 거리에서 좌측 60도 이상의 시야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우측 80도 이상의 시야와 우상방에서도 약간의 복시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양안 개안 시 현훈은 VAS 3 정도로 약화되어 보호자 보조 하에 치료실 내 이동 시 self-walking 가능하였다.
-
(3) 안면부 마비로 인한 불편감은 거의 없으며, 휘파람 부는 동작에서의 아랫입술의 어색한 느낌만 호소하였다. Yanagihara score 37점으로 측정되었다.
-
(4) 본원에서 처방받은 samsung Baclofen Tab 복약 이후로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은 VAS 2 정도로 감소하였다. 더 이상 야간에 상기 증상이 심화되진 않았다.
-
(1) 우측 안구의 우상방 주시와 좌측 안구의 좌상방 주시 시 미약한 움직임 제한 있으나, 양안 모두 전 방향 움직임에 거의 제한이 없었다. Scott and Kraft score는 우측 0, 좌측 0으로 측정되었다. 이후 본원 외래 치료 종료 시까지 전 방향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좌측 눈썹 상부의 통증은 거의 호전되었다.
-
(2) 사선 복시 증상은 50㎝ 이상의 거리에서 좌측 60도 이상의 시야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우측 80도 이상의 시야와 우상방에서도 약간의 복시 증상 남아있다고 하였다. 양안 개안 시 현훈은 VAS 3으로 유지 중이며, 화장실 이동이나 치료실 이동 등 짧은 거리는 self-walking이 가능하였다.
-
(3) Yanagihara score 39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아랫입술의 도톰한 느낌 외에 우측 안면마비는 거의 호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4) 후경부부터 견갑 전반에 걸친 강직감 및 통증은 VAS 2 정도로 유지하였다. 퇴원 시 상하지 건반사는 BTR(++), PTR(++)로 회복되었다.
Ⅲ. 고 찰
MFS는 선행 감염 후에 발생하는 실조증(ataxia), 건반사 소실(areflexia), 안근마비(ophthalmoplegia)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다발신경증으로, GBS의 아형으로 알려져 있다. 1932년 Collier에 의해 GBS의 변형으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2), 1956년 Charles Miller Fisher가 실조증, 건반사 소실, 안근마비가 있고 단백-세포해리가 뇌척수액검사에서 보이면서 좋은 예후를 가진 3명의 환자를 보고하면서 MFS 를 GBS의 아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1).
전 세계적으로 GBS의 연간발병률은 10만 명당 1-2명이고, MFS의 연간발병률은 서구에서 GBS의 1-7% 비율로 드물지만, 아시아에서는 18-25%로 비교적 흔한 편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며, 모든 연령에서 관찰되나 유아보다는 성인에서 더 흔하고 특히, 30-39세와 50-59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계절적으로는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이는 선행 감염으로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MFS는 증상 발생 평균 8-10일 전에 선행감염의 병력을 가지며, 상기도 감염이 설사를 동반하는 위장관 감염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Campylobacter jejuni가 약 21%, Haemophilus influenzae가 약 8%로 선행감염의 원인균주로 가장 흔하고, 이 외에 CMV, Mycoplasma pneumoniae, EBV, group A streptococcus 등이 있다2).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항원과 체내 세포형질막 구성요소인 강글리오사이드(ganglioside)의 분자유사성으로 인해, MFS는 선행 감염으로 생성된 항체가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여 발생하며, 강글리오사이드가 많이 분포하는 운동신경의 신경근 주변, 신경근육접합부 주변의 축삭, 뇌신경에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MFS는 3,4,6번 뇌신경에 많이 분포하는 강글리오사이드인 GQ1b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안근마비가 주된 증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항GQ1b에 대한 자가항체는 MFS 진단에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혈청학적 지표로 MFS 환자 급성기 혈청에서 약 90%정도 양성을 보인다. 이 항체가는 질환 초기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임상경과가 호전됨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질병 경과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MFS 사례의 약 5%에서는 임상 과정의 급성기 동안 이러한 항체의 역가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17), 실제로 질병의 급성기 동안 수행된 항GQ1b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임상 증상 및 타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통해 MFS로 진단받은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들이 있다18). Koga 등19)의 연구에 따르면, 항-GQ1b항체가 음성인 MFS 환자 중 일부에서 GD1a, GalNAc-GD1a, GM1/GT1a 및 GM1/GQ1b에 대한 IgG 항체 양성 반응을 보여 GQ1b 이외의 강글리오사이드에 대한 항체가 MFS 발병에 병원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MFS 환자를 평가할 때 GQ1b뿐만 아니라 다른 강글리오사이드에 대한 항체를 식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MFS는 대표적인 세 징후인 실조증, 건반사 소실, 안근마비 외에도 안검하수, 안면신경마비, 연하곤란, 이상감각 등이 동반될 수 있다. MFS의 대표적인 증상인 외안근마비는 대부분 양안성이고 대칭적이나 드물게 비대칭적 혹은 단안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외직근 침범이 가장 흔하여 외전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외안근 중에서도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외안근마비의 회복 기간은 1달에서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실조증은 보통 초기부터 나타나고, 심한 경우 약 30%에서 스스로 걷기 힘들 정도의 보행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심부건반사 소실은 초기에 많은 수의 환자에서 나타나지만, 10-20%의 환자에서는 정상 반사를 보일 수 있다. 안검하수는 약 50%, 안면신경마비는 20-30%에서 동반할 수 있다. 급성기에는 이상감각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두통, 등과 사지의 통증, 어지럼증, 눈부심,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2).
진단은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선행감염의 병력과 임상적인 특징으로서 3가지 증상이 있으면 내릴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세포단백해리와 혈청 항GQ1b 항체 양성의 2가지 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료로서 면역중재요법인 혈장교환술이나 IVIg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Mori M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가 회복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8). 대부분은 예후가 좋아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하며, 완전한 회복에는 평균 2-3개월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안근마비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2).
본 증례의 환자는 69세 여성으로 2023년 12월 9일 폐렴 진단 하에 입원 치료받던 중 2023년 12월 13일 Biocular diplopia, Dizziness, Gait disturbance 발생, 2023년 12월 18일 Rt. faical palsy 발생하여 CSF 천자술 시행 후 R/O Guillain-Barre syndrome, R/O Miller Fisher syndrome 소견 하에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23년 12월 19일 시행한 항GQ1b항체 검사 결과 상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양안 완전 안근마비, 사지근육의 약화 없이 발생한 실조증, 건반사 실조 등 전형적인 MFS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증상 발생 약 5일 전 폐렴 이환으로 상기도 감염이 선행되었고,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기에 R/O Miller Fisher Syndrome으로 진단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환자는 약 5일간의 IVIg 치료 이후 폐렴 관련 제반 증상들은 해소되었으나, Ophthalmoplegia, Diplopia, Gait disturbance, Rt. facial palsy, Hyporeflexia, Neck&Shoulder pain 증상 회복되지 않아 적극적인 한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2023년 12월 28일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다.
MFS는 실조증, 건반사 소실, 안근마비의 3대 증상에 근거하여 한의학에서 痿證의 범주로 볼 수 있다. 痿證은 《儒門事親》에서 ‘弱而不用者爲痿’라 하여 四肢가 軟弱無力하여 隨意運動이 不能한 것을 말한다. 痿證의 원인은 脾胃가 無力하여 四肢로 津液을 보내지 못하거나, 肺熱葉焦하여 熱에 의해 체내의 津液이 말라 四肢를 營養하지 못한 것이며, 그 외에 濕熱阻滯, 肝腎虧虛, 脾胃損傷, 勞倦大熱, 精血虧耗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치법은 獨取陽明하니 胃陰을 補하는 것을 주로 삼고, 각각의 원인에 맞게 利濕熱, 補脾胃, 補肝腎陰血, 瀉肺胃之熱, 補氣血, 益精血 등의 치법을 사용한다9). 더불어 MFS의 대표적인 증상인 안근마비는 한의학에서 사시, 복시에 해당하는 神珠將反, 瞳神反背, 視一爲二, 雙目通睛 등의 범주로도 볼 수 있다. 주로 正氣不足으로 脈絡이 空虛한데 風邪가 侵入하여서 나타나며 또는 脾失健運으로 聚濕生痰할 때에 風邪가 들어와서 風痰阻絡하여 氣血이 不行되어 筋脈이 失養하여 생기거나 또는 肝腎陰虛로 肝陽上亢하여 風이 眼目에 上衝하여 발생한다. 치법은 초기에는 疎風通絡시키고, 급성기가 지난 후 肝腎陰虛 혹은 脾氣虛弱하여 氣血不和로 元氣不足한 경우 補血肝腎, 保養益氣시켜야 한다10).
본 환자는 폐렴 발병 직후부터 식욕저하와 고형식을 먹지 못할 정도의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안근마비, 경견부 통증, 안면마비, 보행실조의 증상이 순차적으로 발생함으로 보아 脾胃의 無力 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四肢로 津液을 보내지 못해 四肢를 營養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원 입원 당시 기침, 객담을 포함한 제반 폐렴 증상은 소실되었으나, 지속되는 식욕부진으로 매 식사 시 일반식의 1/3만 섭취하였고 望聞問切 상 面色蒼白, 食少倦怠, 消化不良, 脈細無力, 舌淡苔白 등이 확인되어 脾胃의 기능이 여전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복시로 인한 현훈과 전신 쇠약감으로 휠체어와 보호자의 보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점 및 영양 부족으로 피부가 거칠고 조갑이 윤택하지 못한 상태를 보아, 병정이 길어짐에 따라 氣血虧虛의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기 환자는 사기에 감촉된 이후 脾胃의 기능이 떨어져 사지를 비롯한 안면부 經筋이 滋養받지 못하고 이러한 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혈이 쇠한 것으로 보아 補中益氣湯의 변방인 加味補益湯을 기본방제로 투약하였다.
加味補益湯은 補中益氣湯에 補血, 祛風, 祛痰시키는 약재를 가감한 것으로, 주로 口眼喎斜의 虛症에 응용되어 왔다. 처방 구성은 黃芪, 人蔘, 白朮, 當歸, 熟地黃, 川芎, 白芍藥, 陳皮, 白茯苓, 甘草, 半夏, 天南星, 羌活, 防風, 秦艽, 白殭蠶, 柴胡, 升麻, 大棗, 生薑으로, 《東垣十種醫書》에 수록된 補中益氣湯 원방에 補血하는 四物湯을 가해 補脾氣와 더불어 氣血兩虧로 인한 제반 증상을 다스리고, 祛風시키는 牽正散, 芍藥甘草湯과 祛痰시키는 二陳湯을 가해 선행 감염으로 남아있는 사기를 去하고 두면부의 風症 및 痙攣 증세를 다스린다20). 본 증례에서는 추가적으로 活血通經하는 紅花를 가해 두면부를 비롯한 사지의 혈액순환을 도왔으며, 調消化 健脾和中시키기 위해 山楂, 神麯, 麥芽를 가하였다11).
MFS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정 등3)과 차 등5)은 肝腎陰虛로, 두 등2)과 이 등12)은 脾胃虛로 변증하여 각 장부를 보익하는 처방을 사용하였으며, 이 등6)은 氣血兩虛로 변증하여 보비약과 보기혈약을 합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유 등13)과 송 등14)은 風痰阻絡으로 변증하여 祛痰, 祛風시키는 처방을 사용하였으며, 김 등15)은 정기부족, 혈허한 상태에서 風痰阻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補血하는 처방과 祛痰하는 처방을 합방하여 사용하였다. 본 증례는 비위를 보하면서 祛風 및 祛痰시키는 약재가 적절히 가미된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비위의 기능을 끌어올리면서 기혈허약으로 인한 제반 증상을 해결하고, 두면부의 風症을 해결하려 하였다.
침치료는 마비된 부위에 해당하는 환부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양쪽 絲竹空(TE23), 攢竹(BL2), 陽白(GB14), 太陽(EX-HN5), 瞳子髎(GB1), 承泣(ST1), 睛明(BL1)과 우측 頰車(ST6), 地倉(ST4), 下關(ST7), 巨髎(ST3), 顴髎(SI18), 聽宮(SI19), 翳風(TE17), 水溝(GV26), 承漿(CV24), 百會(GV20)를 선혈하였으며, 안면부는 陽明經이 주행하므로 원위취혈로 合谷(LI4), 足三里(ST36)를 선혈하여 치료하였다. 본원 입원 시에는 발병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으로 祛風通氣보다 益氣養血 補精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양산삼 약침 1㎖를 양측 絲竹空(TE23), 攢竹(BL2), 陽白(GB14), 太陽(EX-HN5), 우측 地倉(ST4), 翳風(TE17), 下關(ST7)에 나눠서 주입하였다. 안근 주변 및 안면부 혈액순환을 위하여 양측 陽白(GB14), 太陽(EX-HN5), 우측 地倉(ST7)에 자락관법(섬관법)을 1일 1회 시행하였으며, 太陽(EX-HN5)에 뜸치료를 1일 1회 시행하였다.
본 환자에게 加味補益湯 투여 및 침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결과 복시 현상이 감소하고, 안구운동장애와 그로 인한 현훈, 안면마비 및 기타 제반 증상이 호전되었다. 상기 환자의 입원 전후 외안근마비를 비교할 때 Scott and Kraft score -4/-4 → 0/0로 호전되었으며, 안면마비는 Yanagihara score 10점 → 40점으로 호전되었다. 입원 시 호소하던 현훈 및 보행장애는 VAS 8에서 퇴원 시 VAS 3으로 감소하였으며, 짧은 거리의 보행은 self walking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2024년 4월 8일 F/U시 환자의 외안근마비와 안면마비는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복시 증상은 우상방 주시 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좌측 80도 이상의 시야 및 좌상하방 주시 시에만 복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의학적 연구로는 본 증후군에 대해 총 10개의 증례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정 등3)이 양안의 완전 외안근마비 및 안면마비를 주소로 1례, 2003년 두 등4)이 동안신경마비를 주소로 1례, 2009년 차 등5)이 불면증 주소로 1례, 2012년 이 등12)이 좌안 안근마비를 주소로 1례, 2016년 유 등13)이 외안근마비를 주소로 1례, 2019년 송 등14)이 지연형 안면마비 및 현훈을 주소로 1례, 2019년 이 등6)이 복시, 동공산대, 하지 운동실조를 주소로 1례, 2020년 김 등15)이 양안 안근마비를 주소로 1례, 2020년 윤 등7)이 외전신경마비를 주소로 1례, 2022년 김 등16)이 외안근마비 및 안면마비를 주소로 1례를 보고하였다.
기존 증례의 환자들은 안근마비가 주된 증상으로 비교적 안면마비가 약하게 동반되었지만, 본 증례의 환자는 발병 당시 양쪽 외안근과 우측 안면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며 그로 인한 수반 증상들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양쪽 외안근마비와 안면마비가 주소증인 2000년 두 등4)과 2022년 김 등16)의 치험례와 비교해보면, 본 증례는 퇴원 시 외안근마비와 안면마비 모두 움직임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퇴원 후 약 한달간의 외래 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한의학적 치료로 3개월 이내에 안구운동 및 수반 증상, 안면마비 증상의 전반적인 호전을 보인 사례로, MFS의 자발적인 회복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증례의 한의학적 치료가 MFS와 관련된 제반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을 빨리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증례는 1례에 그치고 대조군이 없어 자연 경과 시 호전도와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침 치료, 부항 치료, 한약 치료, 물리치료, 양약 치료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 각각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증례의 환자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양쪽 안구의 가동범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였음에도, 양안 최대 외전 시 약간의 복시 증상이 남은 채로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추가적인 한의학적 치험례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FS 환자는 발병 양상이 환자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방치료를 통한 치험례가 10편에 불과하며, 양방 병원에서는 발병 초기 면역글로불린 치료 이후 자발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면이 있어서 환자들은 한방 병의원의 치료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증례의 확보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