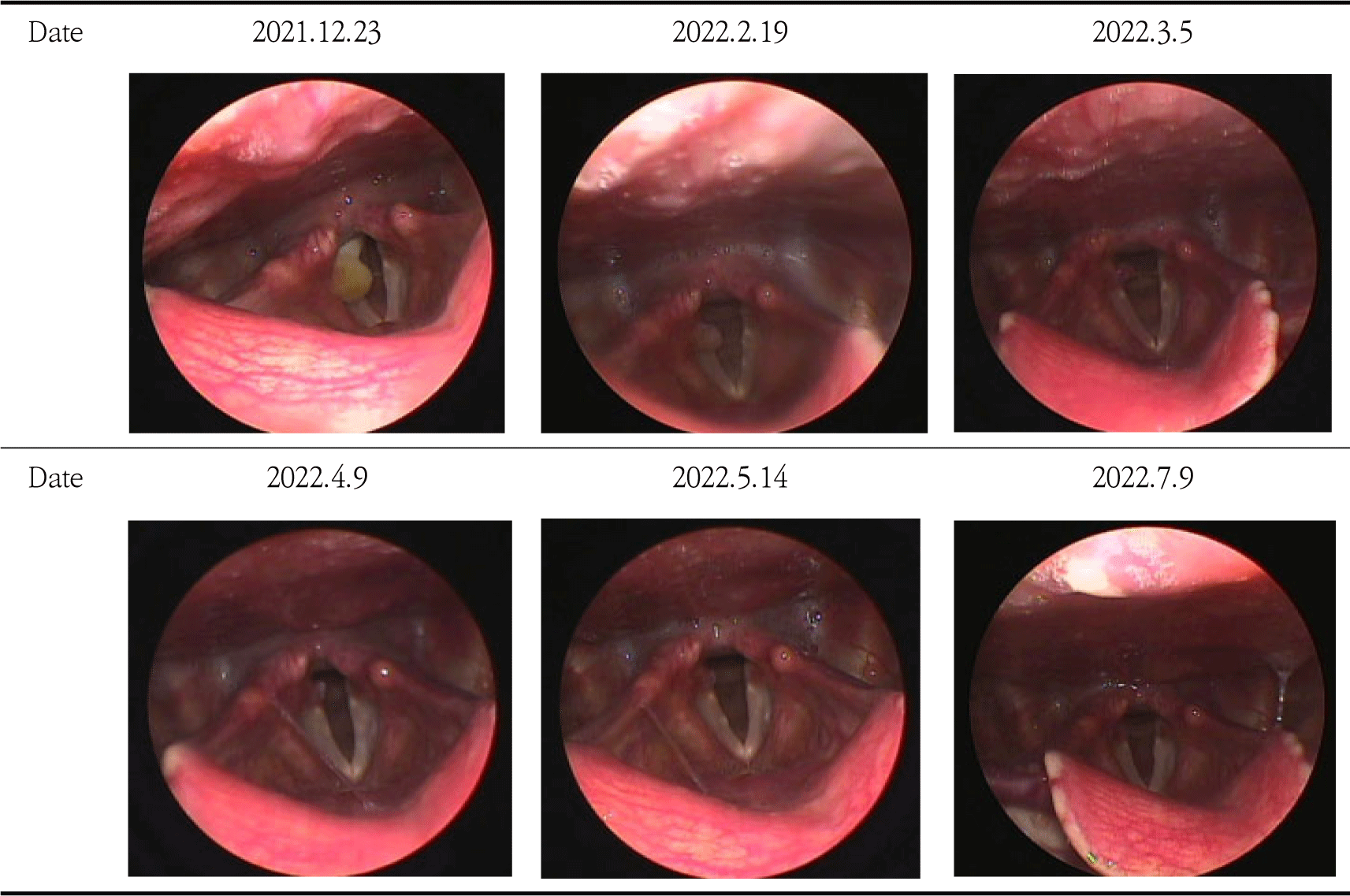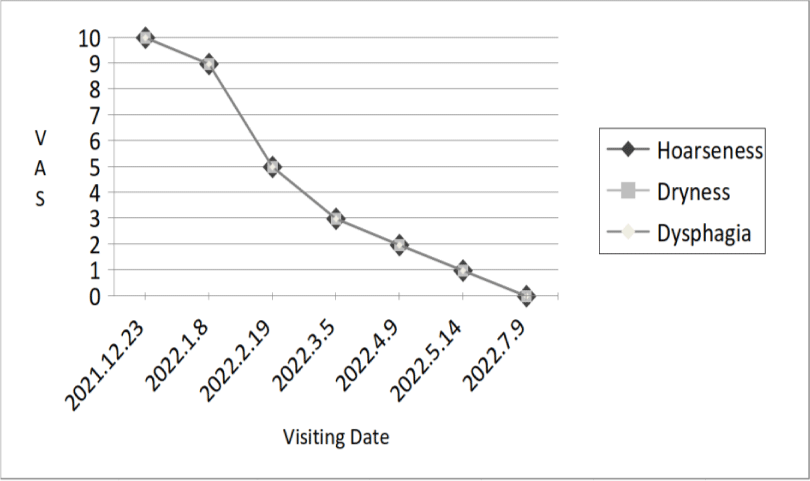Ⅰ. 서 론
성대 육아종 중에서 접촉성 육아종은 성대 후방에 위치한 피열연골의 성대돌기에 양성 비후성 육아조직이 형성되는 것으로 우선 성대돌기 주변 점막의 손상이 발생한 후 그 치유과정에서 점막 상피의 과형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며1) 음성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의 약 1.0-8.9% 가량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
접촉성 육아종의 원인으로는 음성 남용, 습관적인 목 청소, 낮은 목소리 사용, 만성 기침, 위식도 역류 뿐 아니라 흡연, 정신신체 장애, 후비루, 인후두 감염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단일 원인이라기 보다는 관련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3).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흔하며 재발률은 약 20%로 보고되고 있으나 후두경을 통한 미세수술적 제거는 재발률이 적게는 37%부터 많게는 9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접촉성 육아종은 병변의 크기에 따라 그 증상의 정도는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성 시 성대의 완전한 접촉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앓고 있는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쉰 목소리이며, 그 외에 인후부의 통증, 이물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5).
현재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로 제시되는 것은 휴식, 음성치료, 위장관 운동 촉진제, H2 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보톡스 주입, 저용량 레이저 치료, 수술적 제거 등이 있으며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육아종이 너무 커서 기도폐쇄의 위험이 높거나 악성종양 또는 다른 감염성 육아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술적 제거를 시행한다1-5).
하지만 아직 대규모 코호트 연구나 무작위 시험 등을 기반으로 한 치료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접촉성 육아종 뿐 아니라 성대 양성 점막 질환에 대한 한방 치험례가 전무하여 임상적으로 아쉬움이 있어 본 증례에서 접촉성 육아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한의 치료를 통해 양호한 호전도를 보인 환자 1례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Ⅲ. 증 례
2021년 봄 경 초발 당시 별무처치하고 증상 점차 악화되자 2021년 7월 8일 local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폴립 진단 하에 양약 복용 하다 별무 호전하여 상급병원 권유 소견 들었으나 별무 처치 하고 증상 더욱 악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한방 치료 위하여 2021년 12월 23일 본원 외래로 내원하였음
동방메디컬 사의 멸균된 0.20×30㎜ 규격의 1회용 스테인리스 호침을 사용하였으며 내원할 때 마다 시행하였다. 穴位는 경부 양측의 人迎(ST9), 水突(ST10), 氣舍(ST11), 天鼎(LI17), 扶突(LI18)과 璇璣(CV21), 天突(CV22), 廉泉(CV23) 등의 穴位와 그 주변의 후두신경, 반회신경, 미주신경 분지를 따라 選穴하여 橫刺로 약 20분간 留鍼하였다.
약침은 黃連解毒湯 약침(黃連解毒湯, 기린한의원 원외탕전,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침 치료 전에 1회용 주사기(26G×13㎜ syringe, 1㏄ ; ㈜벡톤디킨슨,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天突(CV22)에 1㏄ 자입하였다.
증기 치료는 留鍼 시간동안 시술하였으며 후두 부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艾葉, 桑白皮, 薄荷, 麻黃, 款冬花, 桂枝, 蒼耳子, 細辛 각 3g, 丁香 1g로 구성된 약재를 이용하여 비강을 통해 흡입하도록 하였다.
마사지 요법은 침 치료 전에 시행하였으며 배합 아로마 오일(Jojoba Oil 50cc, Lavender, Peppermint, Rosemary each 6drops)을 사용하여 人迎(ST9), 水突(ST10), 氣舍(ST11), 天鼎(LI17), 扶突(LI18), 璇璣(CV21), 天突(CV22), 廉泉(CV23) 및 주변 후두외근, 후두신경, 반회신경, 미주신경이 위치한 피부 부위를 약 5분간 마사지 하였다.
| Herbal name | Scientific Name | Dose(g) |
|---|---|---|
| 桔梗 |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 0.187 |
| 金銀花 | Lonicera japonica Thunberg | 0.187 |
| 甘草 |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0.08 |
| 桑白皮 | Morus alba Linné | 0.08 |
| Total | 0.53 | |
建肺플러스는 초진 당시 처방하였으며 치료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하였고 聲帶痲痹A와 靑上補下湯加味 연조제는 환자 증상과 사정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처방하였다(Table 4).
| Period | Herbal Decoctions |
|---|---|
| 2021.12.23 - 2022.01.06, 2022.01.22 - 2022.02.05 | 聲帶痲痹A |
| 2022.01.08 - 2022.01.22, 2022.02.12 - 2022.02.26, 2022.03.05 - 2022.03.19, 2022.04.09 - 2022.04.19 |
靑上補下湯加味 |
육아종의 크기와 침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Table 5). 침범 위치에 따라 A(일측성), B(양측성)로 분류하며 침범 정도와 크기에 따라 Ⅰ-Ⅳ로 분류하였다.
초진 당시 후두경상 우측 피열연골 성문돌기 내측을 중심으로 성대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 약 12㎜ 정도 크기의 육아종이 관찰되었으며 Farwell’s Grade상 성대 완전 외전 시 중앙선은 넘지 않으며 성대 돌기를 벗어난 크기인 Grade Ⅲ,A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2022년 2월경에 촬영한 내시경상 초진 당시에 비해 약 절반 크기로 줄어든 육아종(약 6㎜)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022년 3월경 촬영한 내시경상 상기 육아종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2022년 2월 말경 육아종이 저절로 탈락한 후 잔여 육아종만 남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 잔여 육아종 또한 크기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내원 시 후 두경 상 잔여 육아종도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1).
초진 당시 환자는 오후가 되면 목소리가 자주 쉬게 되고, 지속적인 인후의 건조감 및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삼켜도 다 삼킨 것 같지 않은 불편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치료 이후 내원 17일차에 모든 증상이 처음으로 좋아진 듯하며 VAS 9로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육아종 크기가 줄어들면서 내원 59일차에 VAS 5로 초진당시에 비해 증상이 절반까지 줄어들었으며 특히 쉰 목소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육아종 자연 탈락 직후부터는 증상이 더 개선되어 VAS 3까지 감소하였고 인후 건조감으로 인해 헛기침 하던 증상들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였으며 이후 치료 횟수를 점차 줄여가며 경과관찰 한 결과 마지막 내원당시에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Fig. 2).
Ⅳ. 고 찰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성대의 육아종은 성대의 기타질환(J38.3)의 하위 항목에 속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질병 통계에서 해당 코드의 진료 건 수를 살펴보면 2010년 60,978명에서 2023년 145,209명으로 2배 이상 환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7).
국내 성대양성점막질환 환자의 약 2.2%가 성대 육아종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8) 성대 육아종 환자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그에 맞춰 한방 치료로의 접근도 고려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성대 육아종은 1928년 Jackson에 의해 처음 기술된 질환으로 후두 내시경상 피열연골의 성대 내측 혹은 가장자리에 창백한 유두상의 덩어리 양상으로 관찰되며 증상에 따라 삽관성 육아종, 접촉성 육아종, 역류성 육아종으로 구별할 수 있다9). 이 중 삽관성 육아종은 기관내 삽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육아종으로 기도 삽관시에 발생하는 피열 연골 점막의 손상이나 튜브 유지중에 발생하는 압력 괴사로 인해 육아종이 발생하는 것이며 역류성 육아종은 위산의 지속적인 역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도한 음성의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접촉성 육아종과는 차이가 있으나 각 질환의 관련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0,11).
성별로 볼 때 삽관성 육아종은 대부분 여성에게서 발생하며 접촉성 및 역류성 육아종은 남성에게서 발생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후두와 얇은 점막층으로 인해 삽관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2).
성대점막의 양성 질환의 한 종류인 성대 접촉성 육아종은 다른 점막 질환인 성대용종, 성대낭종, 후두 혈관종 등과 감별해야 하는데 주로 성대 후방에 위치하는 접촉성 육아종과는 다르게 성대용종은 주로 성대의 전방 1/3에서 나타나며 출혈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성대 낭종은 성대용종과 비슷한 양상이나 점막의 파동성이 있다는 특징이 감별의 요점이며 주로 성대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두 혈관종은 육안상 창백한 접촉성 육아종과는 다르게 특징적인 푸른색의 병변이 관찰되며 주로 소아에게서 발생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미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3).
현재 양방에서 접촉성, 삽관성, 역류성 육아종 모두에서 기본 치료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항위산역류제와 음성치료 및 생활습관 관리를 결합한 방식이며 안정성이 높고 재발률이 적다고 보고하였으며 해당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스테로이드 흡입제,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보툴리늄 톡신 주사, 그리고 수개월 간의 상기 치료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후두 미세수술을 권하고 있으며 어떤 치료에서든 생활습관의 교정을 병용할 것을 보고하였다14).
국내 연구에서는 항위산역류제와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삽관성 육아종 환자에게서 우수하였으나 접촉성 육아종에는 효과가 떨어지며 보툴리늄 톡신 주사가 접촉성 육아종에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나 치료 이후 애성의 악화, 연하곤란 등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없어 신중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접촉성 육아종은 한의학적인 질환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성대의 과사용,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해 생긴다는 점과 점차적으로 嗄聲, 聲嘶가 심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慢音啞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慢音啞는 《類經》에서 “瘖, 聲啞不能出也, 胞中之絡脈絶則不能言.”로 언급된 바 있으며, 絡脈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한의학에서는 오래된 기침으로 肺陰이 손상되거나 과로로 인해 陰火가 인후를 熏蒸하여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5).
본 증례에서 환자는 애성, 성대 건조감 등의 증상 자각 이후 초기 성대 결절 의증 진단받고 별무처치 하다 발병 4개월 후 처음으로 성대 육아종을 진단받았었으며 당시 양방에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별무처치하다 직장 사무실이 이전하며 더욱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증상 더욱 우심해진 상태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가 수술을 포함한 양방처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문진상 목청소를 자주하는 습관과 가정에서 고함을 자주 지르는 등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확인되어 생활 관리 교육을 병행하면서 한방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침 치료 전에 氣血의 순환 및 긴장된 근육의 이완을 목적으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후경부 근육과 경부 근육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하였고 이후 침 치료를 진행하였다.
침 치료는 足陽明胃經, 手陽明大腸經, 任脈의 경부를 유주하는 경락의 穴位와 경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아시혈을 선정하였다. 人迎(ST9), 水突(ST10), 氣舍(ST11), 天鼎(LI17), 扶突(LI18)과 璇璣(CV21), 天突(CV22), 廉泉(CV23) 등은 반회 신경과 상후두신경 경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성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天突(CV22)은 기침, 연하곤란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16) 해당 穴位에는 침치료 뿐 아니라 藥針요법도 적용하였다. 藥針은 黃連, 黃芩, 黃柏, 梔子로 구성된 黃連解毒湯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보고된 解熱, 鎭痛, 消炎 등의 혈관 이완 작용17)을 통해 주변 혈액 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
침 치료와 같이 증기 치료도 시행하였는데 특히 溫經通絡 효능을 지닌 艾葉과 桂枝, 溫肺祛痰하는 細辛, 解表發寒의 효능이 있는 薄荷, 麻黃등을 煎湯하여 직접 환부에 쏘이는 방식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혈류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침 치료 후에는 溫經散寒의 목적으로 廉泉(CV23)에 무연 뜸을 사용하여 溫鍼치료하였고 天突(CV22)과 그 주변을 따라 뜸 치료도 병행하였다.
한약(聲帶痲痹A, 淸上補下湯加味, 健肺플러스)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聲帶痲痹A는 生地黃, 黃連, 黃芩, 防風, 枳殼, 梔子, 連翹, 甘草, 山豆根, 玄參, 薄荷, 人蔘, 麥門冬, 天門冬, 桔梗, 杏仁, 桑白皮, 地骨皮, 瓜蔞仁, 貝母, 柴胡, 金銀花, 厚朴, 山楂肉, 貢砂仁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제반 성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 되는 처방이며 내원 초기 염증성 육아종의 크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淸熱藥을 主藥으로 사용하였다.
君藥이 되는 生地黃은 淸熱生津하여 咽喉腫通에 효능이 있으며 瀉火하는 효능이 있는 黃連, 黃芩, 梔子와 淸血解毒 및 消炎 작용이 있는 金銀花, 連翹, 山豆根, 地骨皮를 배합하였으며 당시 약간의 감기기운과 함께 증상 악화를 호소하여 發散風熱하며 咽痛을 치료하는 防風, 薄荷, 柴胡를 배합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헛기침 등 인후 불편감을 호소하여 宣肺利咽하는 桔梗, 貝母, 瓜蔞仁과 咳嗽氣喘을 治하는 杏仁, 桑白皮를 배합하였으며 오래된 인후 건조감과 애성을 앓아오며 생긴 氣短乏力을 치료하기 위하여 大保元氣하는 人蔘과 滋陰淸肺하는 玄參, 麥門冬, 天門冬과 甘味로 調和諸藥 하는 甘草를 가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소증은 아니지만 평소 소증으로 가지고 있던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下氣除滿하는 厚朴과 化濕建脾하는 砂仁, 食積을 治하는 枳殼과 山楂肉을 가감하여 전탕하여 처방하였다18).
淸上補下湯加味는 연조 제형으로 원래는 《壽世保元》의 淸上補下丸에서 유래한 처방이다. 만성 및 허증으로 변증되는 천식 질환에서 대표 치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에서는 만성 염증성 폐질환에 많이 응용되며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IL-1β, IL-6 및 TNF-α등의 만성 염증인자 발현 cytokine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19) 본래 염증성 조직인 육아종에 항염 작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거기에 환자의 인후 건조감 소증인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처방에 滋陰淸肺 및 生津하는 沙參, 枸杞子, 石斛, 淸肺止咳의 효능이 있는 百部根과 紫菀, 그리고 溫脾胃 및 消食의 효능이 있는 貢砂仁, 山楂肉, 乾薑을 加하여 투약하였다18).
또한 후두 질환에서 환이나 사탕과 같은 약으로 입안에 오래도록 머금었다 천천히 삼킴으로 환처에 消腫止痛의 치료를 적용하는 含咽法을 근거로 하여 健肺플러스를 처방하였다15). 健肺플러스는 桔梗, 金銀花, 甘草, 桑白皮로 구성되어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트로키 제제로 COPD등 만성 염증성 하부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20) 환자가 건조한 사무실에서 활동 중 증상이 악화 되었을 때 마다 빠르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생활 관리 교육을 치료시마다 진행하였다. 먼저 식생활로는 위산 역류의 방지를 위해 자극적이고 뜨겁거나 찬 음식 피하도록 하였고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소 3시간이 지난 이후 수면을 취하도록 하였다. 음성 치료는 따로 시행하지 않았으나 소리를 지르거나 습관적으로 시행하는 목청소를 줄이도록 하였고 저음역대로 속삭이는 소리를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 증상인 건조함을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따뜻한 수분 섭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애성, 인후 건조감, 연하곤란 모두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후두경상 우측 성대 절반을 넘게 덮고 있는 약 12㎜ 크기의 육아종이 관찰되었으며 Farwell’s Grade Ⅲ,A으로 평가되었다. 치료 시작 한 달 전후로 자각적인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치료 2개월 차에 촬영한 후두경에서(Fig. 1) 초기에 비해 절반정도로 줄어든 육아종이 관찰되었고(Farwell’s Grade Ⅰ-Ⅱ)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육아종 크기와 증상의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환자가 자각 하지는 못했으나 치료 2-3개월 차에 기존의 육아종이 자연 탈락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잔여 육아종은 서서히 줄어들어 마지막 내원 시에는 육아종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환자의 증상도 완전 소실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단 1례의 증례 보고로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으며 접촉성 육아종은 자연 호전율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는 점14)에서 자연 호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일관된 한방 치료를 적용하며 환자의 증상 호전과 또한 육아종의 크기가 같이 줄어들어든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다는 점, 또한 국내의 접촉성 육아종 최초로 한방 단독 치료를 제시한 증례 보고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접촉성 육아종 뿐 아니라 성대의 양성 점막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의 임상적 활용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의 토대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