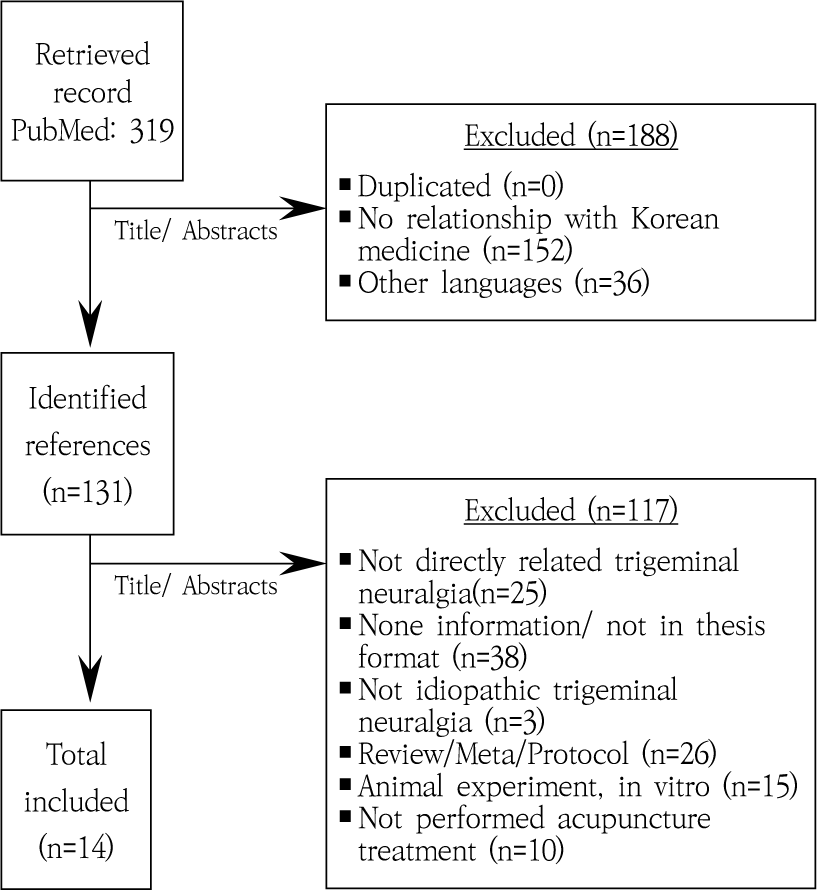Ⅰ. 서 론
삼차신경통은 안면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그 증상은 수 초 동안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발병하는데 발현양상은 얼굴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이 심하며, 칼로 찌르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동통이 발생된다. 또한 동통 유발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들을 하게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삼차 신경통 환자는 전반적으로 정결해 보이지 않고 영양실조에 빠져 있거나 반복적인 발작으로 인하여 동통의 재발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싸여 있기도 한다1). 삼차신경통은 10만명 중 4.5명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강력한 통증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얼굴을 움찔거리므로 ‘tic douloureux’라고 한다2). 삼차신경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군집성 두통과 함께 가장 심한 통증을 나타내며 발작성(paroxysmal) 신경통에 해당하는 일시적 신경병성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다3). 그 원인은 Jannetta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신경혈관 압박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이는 신경교에서 신경초로 바뀌는 부위(Glioneurilemmal junction)가 혈관에 의하여 압박당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삼차신경은 제5뇌신경으로 안면부, 치아, 부비동 등의 감각과 저작근의 운동을 담당하며 ophthalmic nerve, maxillary nerve, mandibular nerve의 세 분지로 나뉜다. 삼차신경통의 동통은 삼차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며1), 대부분 삼차신경의 제 2, 3번 분지의 지배영역에 편측성으로 나타난다2). 따라서 삼차신경 지배영역에 국한되지 않거나, 목이나 귀 등으로 배회하는 통증은 삼차신경통이 아니다. 삼차신경통의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 소견에 의하여 진단이 가능하나 증후성 삼차신경통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경 영상 촬영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맥조영 촬영으로 상소뇌 동맥 등 후방 순환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1).
삼차신경통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크게 수술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나뉘며4) 삼차신경통의 약물에 대한 단계적 치료는 카바마제핀의 단톡투여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나1) 약 25%의 환자는 카바마제핀에 반응하지 않아5)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6). 또한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삼차신경통은 고령의 환자가 많고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고령일수록 증가하는7)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국내 삼차신경통 환자수가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50세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는 점과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8)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임신 중에 카바마제핀을 복용한 산모의 유아에서 기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9)와 carbamazepine 중독에 대한 보고10)등은 삼차신경통에 대한 한의학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삼차신경통은 때때로 자주 악화되고,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경향이 있으며11), 약물의 내성이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약물투여가 불가한 경우에 수술요법을 시행하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고12), 첫 수술시 원인 혈관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불충분한 감압을 한 경우, 새로운 혈관 압박, 보철물 유착 및 용해 등으로 인한 미세혈관 감압술 후 재수술 필요성이 보고된 바 있다13).
한의학에서 삼차신경통은 頭痛, 頭風, 面痛, 偏頭痛, 偏頭風의 범주에 속하는데 특히 面痛에 해당되며4), 《證治準繩·面痛》에 “鼻額間痛 或痲痺不仁 如是數年 忽一日連口脣 頰車 發際皆痛 不開口言語 飮食開放 在額與頰上 常如糊 手觸之則痛”14)이라 하여 그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통증의 원인에 대해 風寒濕 三邪에 의한 經絡氣血의 運行阻滯, 不通則痛으로 보며4) 祛風散寒, 解痙止痛, 活血化瘀, 滋陰潛陽 등의 약물치료와 面部의 동통부위 경혈과 陽明經과 少陽經상의 遠隔取穴을 주로 사용한 鍼刺治療 등을 사용하여 치료한다12). 이를 바탕으로 삼차신경통에 대한 한의학 임상 논문15-17), 고찰논문18,19)이 발표된 바 있으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임상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기존 고찰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고, 침 치료는 삼차신경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12)이라는 점에서 PubMed를 바탕으로 국외 침 치료 임상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임상 연구 활용에 바탕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특발성 삼차신경통을 진단받은 환자 중 침 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인종, 성별,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석 대상이 된 침 치료는 毫鍼치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의 침 치료는 병행치료로 분류하였다.
문헌 검색일은 2024년 1월 31일로 PubMed에서 검색하였고,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문헌으로 제한하였다. PubMed의 검색어는 다음과 같았다. ("Trigeminal Neuralgia"[Mesh]) AND ((((((“acupuncture” [MeSH Terms] OR (acupoint injection)) OR (“pharmacopuncture” [Text Word])) OR (herbal acupuncture)) OR (Korean medicine)) OR (Chinese medicine)) OR ("Herbal Medicine"[Mesh])
PubMed에서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본문을 확인하여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한 임상 연구 논문을 선정하였다. 증례논문과 RCT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특발성 삼차신경통이 아닌 경우, 한의학 논문이 아닌 경우, 삼차신경통에 대하여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논문, 실험논문, 리뷰논문 등은 제외하여(Fig. 1), 최종 1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Table 1).
| Author | Title | Journal |
|---|---|---|
| Huang Z et al20) | Efficacy on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treated with triple puncture technique and electroacupuncture at trigger point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Man PL21) | Acupuncture Analgesia For The Treatment Of Trigeminal Neuralgias: A Series Of Forty-One Cases | J Natl Med Assoc |
| Zhang WW et al22) | Chicken-claw needling at Xiaguan (ST7) combined with intradermal needling on negative emotions in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of phlegm obstruction and blood sta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Chen ZM et al23) | Clinical efficacy observation on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treated with joint needling method at the trigger point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Wu MM et al24) | Clinical observation on deep needling at Xiaguan (ST7) with round sharp needle combined with plum-blossom needle for trigeminal neuralgia of wind and heat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Peng YY et al25) | Clinical observation on three-combination needling method for treatment of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Yang JX et al26) | Clinical research of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treated with electroacupuncture at qi streets acupoints combined with spinal regulation therapy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Gao J et al27) | Effect of Acupuncture on Cognitive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Idiopathic Trigeminal Neuralgia | J Nerv Ment Dis |
| Sun SZ et al28) | Effect of different needle retaining times of electroacupuncture on trigeminal neuralgia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Sert HY et al29) | Successful treatment of a resistance trigeminal neuralgia patient by acupuncture | Clinics |
| Zhang XY30) | Therapeutic effect of deep acupuncture at local acupoints on trigeminal neuralgia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Mishra D et al31) | Trigeminal neuralgia in an octogenarian: sustained clinical response to acupuncture | Explore |
| He L et al32) | Trigeminal neuralgia of hyperactive of liver yang type treated with acupuncture at Xiaguan (ST7) at different dep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
| Zhang YP et al33) | Triple Puncture for Primary Trigeminal Neuralgia: A Randomized Clinical Trial | Curr Med Sci |
Ⅲ. 결 과
최종 선정된 14편의 논문은 미국에서 4편, 중국에서 10편 발표되었으며, 이 중 5편이 영어, 9편이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연도별 분포는 1975년 1편, 2005 2편, 2008년 1편, 2009년 1편, 2011년 1편, 2012년 2편, 2014년 1편, 2017년 1편, 2019년 2편, 2021년 1편, 2022년 1편이었다. 연구 종류는 증례논문이 3편, RCT가 11편이었다(Table 2).
| Author | Country (Year, Language) | Types of Study | Sex (Male/Female) | Age(year) (Minimum, Maximum) [Mean] | Duration of Illness(month) (Min, Max) [Mean] |
|---|---|---|---|---|---|
| Huang Z et al20) | China (2017, Chinese) | RCT* | I† : (8/10), C‡: (9/9) | I: (18, 70) [49±14] C: (20, 67) [49±12] |
I: (1, 72) [34.1±20.3] C: (3, 68) [34.3±18.7] |
| Man PL21) | America (1975/English) | CS§ | (16/25) | [64] | [8.4yrs] |
| Zhang WW et al22) | China (2022, Chinese) | RCT | I: (18/12), C: (13/17) | I: (20, 69) [49±16] C: (20, 71) [46±15] |
I: (2, 11) [5.4±2.1] C: (3, 8) [5.6±1.4] |
| Chen ZM et al23) | China (2012, Chinese) | RCT | I: (18/35), C: (20/30) | I: (18, 75) [58.2±8.6] C: (20, 73) [52.5±6.4] |
I: (2, 60) [14.0±4.4] C: (1, 84) [15.0±6.5] |
| Wu MM et al24) | China (2021, Chinese) | RCT | I: (9/21), C: (11/19) | I: (19, 69) [47±15] C: (20, 68) [47±14] |
I: (2, 28) [12.2±6.4] C: (3, 24) [11.4±6.5] |
| Peng YY et al25) | China (2008, Chinese) | RCT | I: (20/26), C: (17/23) | I: [36.16±2.35] C: [37.34±2.15] |
I: [6.80±1.50] C: [6.50±1.40] |
| Yang JX et al26) | China (2008, Chinese) | RCT | I: (11/19), C: (10/20) | I: (35, 70) [40±9] C: (36, 68) [40±10] |
I: (1, 4.7) [3.1±3.5] C: (0.9, 4.5) [3.2±3.1] |
| Gao J et al27) | America (2019/English) | RCT | I: (20/42), C: (19/35) | I: [63.97±13.63] C: [63.96±11.81] |
- |
| Sun SZ et al28) | China (2011, Chinese) | RCT | I: (20/6), C: (21/5) | I: (43, 72) [58] C: (45, 60) [56.5] |
I: (2, 36) [1.6yrs] C: (1, 30) [1.65yrs] |
| Sert HY et al29) | America (2009/English) | CS | (0/1) | 66 | 25yrs |
| Zhang XY30) | China (2005, Chinese) | RCT | I: (20/25), C: (18/27) | I: (21, 71) C: (19, 78) |
I: (10days, 10yrs) C: (1week, 8yrs) |
| Mishra D et al31) | America (2005/English) | CS | (1/0) | 80 | 12yrs |
| He L et al32) | China (2012, Chinese) | RCT | I: (9/24)-1*(personal issues), C: (9/23)-1*(personal issues) |
I: (38, 75) [54.84±8.99] C: (39, 76) [55.21±9.76] |
I: (3, 55) [20.84±15.80] C: (3, 53) [20.25±12.75] |
| Zhang YP et al33) | China (2019, English) | RCT | I: (12/22)-1*(fear of acupuncture), C: (11/19)-1*(loss of patience) |
I: [47.3±5.7] C: [45.8±9.2] |
I: [4.37±4.1yrs] C: [4.60±3.7yrs] |
연구 대상자는 총 831명이었는데, 증례논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3명, RCT는 788명이었다. 증례논문의 연구 대상자는 1례가 2편29,31), 41례21)가 1편이었으며, RCT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36명20), 가장 많은 경우는 116명27)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성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증례논문은 남자 1례31)와 여자 1례29)가 각각 1편이었고, 1편은 여자가 더 많은 논문21)이었다. RCT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연구가 9편20,23-27,30,32,33),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연구가 2편22,28)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령분포는 1례인 경우 각각 66세29), 80세31)였으며, 평균 연령을 언급하지 않은 1편의 논문30)을 제외한 11편의 논문20-28,32,33)의 평균연령은 40±9세부터 63.97 ±13.63세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최저 및 최고 연령 을 언급한 논문20,22-24,26,28,30,32)에서 최저 연령은 18세, 최고 연령은 78세였다. 이환기간은 Man PL21), Peng YY et al25), Gao J et al27), Zhang YP et al33)을 제외한 10편의 논문에서 언급하였고 최단기간은 1주일, 최장기간은 25년이었다. 평균 이환기간은 10편의 논문20-26,28,32,33)에서 언급하였는데, 3.1±3.5개월부터 4.7±4.1년까지로 나타났다(Table 2).
RCT에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는 2편32,33)으로, He L et al32)은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각각 1명씩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탈락하였고, Zhang YP et al33)은 중재군에서 침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조군에서 인내심 부족으로 각각 1명씩 중도 탈락하였다(Table 2).
중재치료로 침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는 4편23,29,30,33)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른 한방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이 병행한 한방치료는 전침으로 총 6편20,21,26,28,31,32)에서 사용되었고, 이 외에도 피내침22), 매화침24), 혈위주사25), 화침25), TDP26), 脊柱调衡法(spinal regulation method)26)을 함께 사용하였다. RCT의 경우, 대조군에서 중재군과 병행치료는 동일하나 침자법20), 자침깊이27,30,32), 유침시간28)을 다르게 시행하거나 중재군과 침자법과 치료혈을 다르게 시행23), 중재군의 특정 한방치료를 제외25) 혹은 양약을 단독투여22,26,33)하여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Table 3).
| Author | Treatment Period & Session (I*) | Treatment Methods |
|---|---|---|
| Manipulation / Acupuncture Method(I) | ||
| Huang Z et al20) | 1Tx / 2days 1session: 10days Total: 2 sessions |
I: Acu† +EA‡((trigger point) + Acu(LI4, LR3)(20mins) C§: Acu+EA(trigger point: Insert two needles vertically on both sides) + Acu(LI4, LR3)(20mins) - / Triple needling |
| Man PL21) | 1Tx/1day⟶2-3Tx/1week⟶1 Tx/1week⟶1Tx/2weeks⟶1Tx/1month | Acu+EA(Insert the needles into different branches of the trigeminal nerve depending on what branch is involved)(30mins) |
| Zhang WW et al22) | 1Tx / 1day 1 session: 6days Total: 2 sessions |
I: Acu(ST7)(30mins), Thumbtack needle(ST2, Ex-HN4, BL2, SI18, ST6, EX-HNrr, LI4, LR3, AA¶xin, shenmen, pizhixia, mianjia, chuiqian))(1hr) C: WM**(Carbamazepine) twirling draining method / Join valley needling |
| Chen ZM et al23) | 1Tx / 1day 1 session: 5Tx Total: 2 sessions |
I: Acu((trigger point near ST7), LI4, TE5, LR3, ST44)(30mins) C: Acu(ST7, GB2 + (1st: Ex-HN4, Ex-HN5 / 2nd: ST2, LI20 / 3rd: EX-HN, ST9) + (LI4, TE5, LR3, ST44)(30mins) Inducing needle sensation / Joint needling |
| Wu MM et al24) | 1Tx / 1day (5Tx / 1week) Total: 4weeks |
I: Round-sharp needle(ST7)(30mins), Plum-blossom needle((1st: GB14 / 2nd: SI18 / 3rd: ST6)+LI11, ST44, ST2, ST4, LI4)(1-3mins) C: Acu(ST7, GB14, SI18, ST6, LI11, ST44, ST2, ST4, LI4)(30mins) lifting-thrusting draining method / - |
| Peng YY et al25) | 1. Acu - 1Tx / 1day - 1 session: 10Tx - Total: 2 sessions 2. API†† - 1Tx / 2days - Total: 10Tx 3. Fire needle - 1Tx / 5days - Total: 4Tx |
I: Acu(ST7 + (1st: Ex-HN4 / 2nd: ST2 / 3rd: EX-HN) + (pattern of wind-cold assailing the collaterals: GB20, LI4 / intense liver fire pattern: LR2, GB34 / stomach fire bearing upward: ST44, ST36 / qi stagnation and blood stasis: BL17, SP10))(30mins), API((1st: Ex-HN4 / 2nd: ST2 / 3rd: EX-HN) + (pattern of wind-cold assailing the collaterals: GB20 / intense liver fire pattern: LR2 / stomach fire bearing upward: ST44 / qi stagnation and blood stasis: BL17)), Fire needling(ST7)(5s) C: Acu(Same as intervention group)(30mins), API(2-4 tender points) lifting-thrusting method, Inducing needle sensation / - |
| Yang JX et al26) | 1Tx / 1day 1 session: 10Tx Total: 3 sessions |
I: Acu+EA(Ex-HN5, Ex-HN1, ST7, ST6, ST4, GV26, GB20, GB12, BL10, BL18, BL20, BL23, Ex-B2, CV17, CV12, CV6, CV4)(20-30mins), TDP‡‡(20-30mins), Spinal regulation method C: WM(Carbamazepine) Inducing needle sensation, twirling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method / - |
| Gao J et al27) | 1Tx / 1week Total: 10weeks |
I: Acu(ST44, LI4, LI3 + (1st: Ex-HN4, BL2, GB14 / 2nd: SI18, ST2, ST3 / 3rd: ST7, ST6))(20mins), WM(Carbamazepine) C: Same as intervention group (The depth of needling was shallower than that of the intervention group.) |
| Sun SZ et al28) | 1Tx / 1day Total: 4weeks |
I: Acu+EA(ST7, ST4, ST6, ST2, CV24, LI20 + (pattern of liver-gallbladder wind-heat: LR2, GB43 / yang brightness heat: LI4, ST44 / static blood obstructing collateral: SP10, SP6 / yin deficiency with yang hyperactivity: LR3, GB20))(120mins) C: Same as intervention group(40mins) Inducing needle sensation / - |
| Sert HY et al29) | 3Tx / 1week | Acu(TE17, TE21, GB2, SI18, ST2, ST3, ST7, GV26, LI20, TE5, LI4, ST36, ST44, ST45, LR3, AA(shen men, neuro, face, lung))(45mins) |
| Zhang XY30) | 1Tx / 1day 1 session: 10Tx Total: 3 sessions |
I: Acu(ST7, Ex-HN4, ST2, EX-HN)(30-50mins) C: Acu(ST7, LI4, ST44, ST25 + (1st: Ex-HN4 / 2nd: ST2 / 3rd: EX-HN))(30-50mins) (The depth of needling was shallower than that of the intervention group.) twirling draining & lifting-thrusting method / - |
| Mishra D et al31) | For 24 months | Acu+EA(TE17, TE21, GB2, SI18, ST2, ST3, ST7, GV26, LI20, TE5, LI4, ST36, ST44, ST45, LR3, AA(shen men, neuro, face, lung))(30mins) |
| He L et al32) | 1Tx / 2days 1 session: 10Tx Total: 2 sessions |
I: Acu+EA(ST7, LI4, LR3 + (1st: BL2 / 2nd: ST2 / 3rd: EX-HN))(30mins) C: Same as intervention group (The depth of needling on ST7 was shallower than that of the intervention group.)(30mins) Inducing needle sensation & pecking sparrow method / - |
| Zhang YP et al33) | 6Tx / 1week Total: 4weeks |
I: Acu(SI18, GB34, ST40 + (1st: Ex-HN4 / 2nd: ST2 / 3rd:ST7))(40mins) C: WM(Carbamazepine) twirling & lifting-thrusting method / - |
사용된 혈위의 수는 총 47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혈위는 下關(ST7)으로 총 17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合谷(LI4)이 16회, 四白(ST2)이 15회 사용되었다. 경혈 이외에도 통증유발점20),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가지 부위21), 下關(ST7) 근처 압통점23)과 같이 경혈 이외의 통증 부위에 자침하기도 하였다. 또한 삼차신경통의 분지에 따라 한 개25,30,32,33) 혹은 2개 이상23,27)의 경혈을 配穴하여 치료하기도 하였는데, 분지에 따른 配穴에 사용된 혈위는 총 12개로 그 중 1지는 魚腰(Ex-HN4)가 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瓚竹(BL2)이 4회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2지는 四白(ST2)이 9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3지는 俠承漿(Ex-HN)이 6회, 下關(ST7)이 3회 사용되었다(Table 3, 4).
| Branch | Acupuncture Point (n) |
|---|---|
| 1st (Ophthalmic) | Ex-HN4 (7), BL2 (4), GB14 (2), Ex-HN5 (1) |
| 2nd (Maxillary) | ST2 (9), SI18 (2), ST3 (2), LI20 (1) |
| 3rd (Mandibular) | Ex-HN (6), ST7 (3), ST6 (2), ST9 (1) |
유침시간은 모든 논문에서 언급하였는데, 20분부터 120분까지 다양하였고 그 중 30분21-25,31,32)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9편의 논문에서 자침 시 得氣感을 유도하였는데, 捻轉22,26), 提揷24,25), 提揷捻轉30,33), 雀啄法32)과 같은 手技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齊刺(triple needling)20), 合谷刺(Join valley needling)22), 關刺(Joint needling)23)와 같이 특정 침자법을 중재군에 적용하거나 圓利鍼(Round-sharp needle)과 梅花鍼(Plum-blossom needle)을 중재군에 적용24)하여 치료효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다(Table 3).
침 치료 횟수는 Mishra D et al31)을 제외한 13편의 논문에서 언급하였으며, 매일 치료한 경우가 7편22-26,28,30)으로 가장 많았고, 격일 치료가 2편20,3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주 1회27), 주 3회29), 주 6회33)가 각각 1편이었으며, 치료 횟수를 통증 감소에 따라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한 달에 1회로 점차 조절한 경우21)도 있었다(Table 3).
치료기간은 Man PL21), Sert HY et al29)를 제외한 12편의 논문에서 언급하였으며, RCT의 경우 대부분 疗程(session)를 기준으로 명시하였고 1차 疗程은 5회23), 10회25,26,30,32), 10일20), 6일22)이었으며, 총 疗程은 2차20,22,23,25,32), 3차26,30)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논문에서는 4주24,28,33), 10주27), 24개월31)으로 총 치료 기간을 명시하였다(Table 3).
14편의 논문에서 삼차신경통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6개의 평가 지표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痊愈, 显效, 有效, 无效으로 나눈 유효율평가(Efficacy rate)가 각각 9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VAS(Visual analogue scale)가 8회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통증 정도나 빈도 등을 0-20점으로 평가한 综合症状评分(Comprehensive symptoms score)와 中医证候评分(Chinese medicine symptom score)가 각각 3회, 발작빈도, PRI(Pain rating Index), 혈액검사가 각각 2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척도는 1회씩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논문20,22-27,30,32,33)에서 2개 이상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종류는 삼차신경통의 통증 이외에도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상태와 삶의 질 및 인지기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Author | Evaluation Index | Results* (I† /C‡) |
|---|---|---|
| Huang Z et al20) | 1. Comprehensive symptoms score | 1) 14.17±3.44→4.33±1.72(p<0.01)/14.28±3.36→7.46±1.84(p<0.01) 2) Comparison(I/C): p<0.01 |
| 2. VAS | 1) 6.37±1.64→3.04±1.09(p<0.01)/6.12±2.06→4.21±0.94(p<0.01) 2) Comparison(I/C): p<0.01 | |
| 3. Efficacy rate & Cure rate | 1) 88.9%(16/18)/66.7%(12/18) & 44.4%(8/18)/27.8%(5/18) 2) Comparison(I/C): p<0.05 & p<0.05 | |
| Man PL21) | Degree of improvement | Moderate to marked: 88%(36/41) |
| Zhang WW et al22) | 1. VAS | 1) 7.03±1.71→2.57±1.25(p<0.05)/6.93±1.55→3.67±1.65(p<0.05) 2) Comparison(I/C): p<0.05 |
| 2. SAS | 1) 63.47±8.19→46.27±7.60(p<0.05)/65.50±8.21→55.23±8.02(p<0.05) 2) Comparison(I/C): p<0.05 | |
| 3. Chinese medicine symptom score | 1) 13.97±3.54→5.20±2.47(p<0.05)/15.00±3.11→6.83±2.79(p<0.05) 2) Comparison(I/C): p<0.05 | |
| 4. Blood test (β-EP§, SPrr, 5HT¶) | 1) β-EP (Comparison(I/C): p<0.05) 103.57±18.37→230.63±27.35(p<0.05)/111.70±21.62→183.03±21.90(p<0.05) 2) SP (Comparison(I/C): p<0.05) 541.13±54.56→285.80±53.71(p<0.05)/546.87±82.72→336.07±50.43(p<0.05) 3) 5HT (Comparison(I/C): p<0.05) 32.37±4.43→45.93±4.91(p<0.05)/31.40±4.59→37.93±3.50(p<0.05) |
|
| 5. Efficacy rate | 1) 93.3%(28/30)/83.3%(25/30) 2) Comparison(I/C): p<0.05 | |
| Chen ZM et al23) | 1. VAS** | 1) 7.58±1.73→1.18±1.13(p<0.05)/7.42±1.65→2.87±1.42(p<0.05) 2) Comparison(I/C): p<0.05 |
| 2. Comprehensive symptoms score | 1) 17.56±2.11→2.11±1.56(p<0.01)/17.38±2.21→6.76±1.87(p<0.01) 2) Comparison(I/C): p<0.05 | |
| 3. Efficacy rate | 1) 90.6%(48/53)/72.0%(36/50) 2) Comparison(I/C): p<0.05 | |
| Wu MM et al24) | 1. SF-MPQ†† (VAS, PRI‡‡, PPI§§) | 1) VAS (Comparison(I/C): p<0.05) 6.46±1.55→2.25±0.49(p<0.05)/6.31±1.54→3.00±0.46(p<0.05) 2) PRI (Comparison(I/C): p<0.05) 5.90±2.22→2.22±0.58(p<0.05)/5.78±2.08→3.26±0.77(p<0.05) 3) PPI (Comparison(I/C): p<0.05) 2.29±0.75→0.60±0.30(p<0.05)/2.39±0.72→0.92±0.41(p<0.05) |
| 2. Chinese medicine symptom score | 1) 15.60±3.78→4.56±1.97(p<0.05)/15.76±4.10→6.60±3.06(p<0.05) 2) Comparison(I/C): p<0.05 | |
| 3. PGICrrrr | 1) 4.45±0.72→2.89±0.70(p<0.05)/4.39±0.86→3.72±0.61(p<0.05) 2) Comparison(I/C): p<0.05 | |
| 4. Comprehensive symptoms score | 1) 13.00±3.66→4.35±1.28(p<0.05)/12.77±4.00→7.02±1.67(p<0.05) 2) Comparison(I/C): p<0.05 | |
| 5. Blood test (IL¶¶-6, TNF***-α, VIP†† † , β-EP) | 1) IL-6 (Comparison(I/C): p<0.05) 27.79±5.67→22.11±4.56(p<0.05)/27.20±5.88→25.53±4.44(p<0.05) 2) TNF-α (Comparison(I/C): p<0.05) 40.05±9.13→27.96±8.78(p<0.05)/40.19±7.64→32.94±7.92(p<0.05) 3) VIP (Comparison(I/C): p<0.05) 473.49±45.57→331.22±43.71(p<0.05)/471.55±50.14→398.44±45.63(p<0.05) 4) β-EP (Comparison(I/C): p<0.05) 110.35±15.97→187.35±11.08(p<0.05)/109.30±13.30→147.56±12.67(p<0.05) |
|
| Peng YY et al25) | 1. Efficacy rate & Cure rate | 93.5%(43/46)/65.0%(26/40) & 60.9%(28/46)/22.5%(9/40) 2) Comparison(I/C): p<0.01 & p<0.01 |
| 2. Frequency of attacks | 1) 10.26±0.12→2.06±0.15(p<0.01)/9.45±0.07→4.15±0.26(p<0.01) 2) Comparison(I/C): p<0.01 | |
| 3. Recurrence rate (3 months F/U‡‡‡) | 1) 11.6%(5/43)/53.8%(14/26) 2) Comparison(I/C): p<0.01 | |
| Yang JX et al26) | 1. Efficacy rate & Cure rate | 1) 100%(30/30)/96.7%(29/30) & 76.7%(23/30)/63.3%(19/30) 2) Comparison(I/C): p>0.05 & p<0.01 |
| 2. PRI | Comparison(I/C): p<0.05 (F/U 2 and 6months) | |
| 3. HAMD§§§ | 1) 17.3±3.9→8.6±3.9(p<0.01)→(F/U 6months) 9.0±3.9(p<0.01*)/18.1±3.6→10.6±6.9(p<0.01)→(F/U 6months) 13.0±6.6(p<0.01*) 2) Comparison(I/C): p<0.05 (F/U 2 and 6months) | |
| 4. LSIrrrrrr-B | 1) 7.29±2.14→13.13±2.83(p<0.05)/7.76±2.01→9.95±2.30(p<0.05) 2) Comparison(I/C): p<0.05 | |
| Gao J et al27) | 1. Pain (VAS, Headache(%), Generalized body pain(%)) | 1) VAS 4.3±4.1→3.5±4.0(p<0.05)→(F/U 6weeks) 2.6±3.1(p<0.05, <0.05rrrrrr)/4.1±3.7→3.7±3.8→(F/U 6weeks) 4.0±3.5 2) Headache 58.06%(36/62)→19.35%(12/62) (p<0.05)→(F/U 6weeks) 22.58%(14/62)(p<0.05)/62.96%(34/54)→57.41%(31/54)→ (F/U 6weeks) 55.56%(30/54) 3) Generalized body pain 51.61%(32/62)→24.19%(15/62)(p<0.05)→ (F/U 6weeks) 16.13%(10/62)(p<0.05, <0.05rrrrrr)/62.96%(34/54)→53.70%(29/54)→(F/U 6weeks) 57.41%(31/54) |
| 2. Cognitive function evaluation (MMSE****, Tracing score, Memory score, TMT†††† -A score, TMT-B score, VFT‡‡‡‡ score) | 1) MMSE 21.5±6.2→24.3±7.6(p<0.05)→(F/U 6weeks) 27.1±7.9(p<0.05, <0.05¶¶¶)/20.3±5.9→21.5±6.8→(F/U 6weeks) 21.1±7.5 2) Tracing score 29.9±5.5→33.4±6.9(p<0.05)→(F/U 6weeks) 34.1±7.3(p<0.05)/30.1±6.6→28.6±5.8→(F/U 6weeks) 29.5±7.1 3) Memory score 12.8±4.7→14.4±5.1(p<0.05)→(F/U 6weeks) 16.3±6.0(p<0.05, <0.05¶¶¶)/11.6±4.4→12.9±4.2→(F/U 6weeks) 13.1±5.3 4) TMT-A score 47.5±8.7→44.1±10.2(p<0.05)→(F/U 6weeks) 40.2±9.1(p<0.05, <0.05¶¶¶)/48.1±9.3→46.9±8.5→(F/U 6weeks) 49.0±10.5 5) TMT-B score 87.3±14.2→81.4±15.3(p<0.05)→(F/U 6weeks) 80.1±16.7(p<0.05)/88.2±17.2→87.1±16.9→(F/U 6weeks) 87.6±15.3 6) VFT score 11.3±4.3→13.4±5.2(p<0.05)→(F/U 6weeks) 14.3±4.9(p<0.05)/10.8±3.8→9.7±4.6→(F/U 6weeks) 11.1±5.8 |
|
| 3. SF-36§§§§ | 1) Role emotional 46.3±9.6→63.1±11.2(p<0.05)→(F/U 6weeks) 64.5±12.1(p<0.05)/42.8±8.8→46.9±9.1→(F/U 6weeks) 48.2±10.5 2) Vitality 46.9±9.5→47.4±7.9→(F/U 6weeks) 60.7±8.8(p<0.05, <0.05¶¶¶)/48.2±8.7→46.4±9.4→(F/U 6weeks) 49.8±10.2 3) General health 43.1±7.7→56.9±8.1(p<0.05)→(F/U 6weeks) 53.6±6.0(p<0.05)/42.8±6.3→45.7±7.1→(F/U 6weeks) 40.9±6.6 4) Body pain 41.9±8.7→58.1±9.2(p<0.05)→(F/U 6weeks) 64.5±8.9(p<0.05, <0.05¶¶¶)/43.7±8.3→44.1±7.6→(F/U 6weeks) 47.2±6.8 5) Physical function 42.8±7.4→44.6±8.3→(F/U 6weeks) 46.2±9.1/44.2±6.9→46.9±7.8→(F/U 6weeks) 43.8±6.4 6) Role physical 63.3±8.3→78.8±9.2(p<0.05)→(F/U 6weeks) 64.9±8.5(p<0.05¶¶¶)/60.4±9.7→65.1±6.7→(F/U 6weeks) 60.2±11.2 7) Social function 60.7±9.1→58.9±10.6→(F/U 6weeks) 62.7±11.3/57.9±8.4→61.1±8.2→(F/U 6weeks) 63.3±7.3 8) Mental health 44.9±6.9→50.2±7.8(p<0.05)→(F/U 6weeks) 58.8±9.1(p<0.05, <0.05¶¶¶)/43.5±7.9→43.6±9.6→(F/U 6weeks) 42.7±10.6 |
|
| Sun SZ et al28) | Efficacy rate & Cure rate | 1) 100.0%(26/26)/80.8%(21/26) & 84.6%(22/26)/34.6%(9/26) 2) Comparison(I/C): p<0.05 & p<0.01 |
| Sert HY et al29) | VAS | 10→0 (after 6weeks Tx and lasts until the end of 6 months) |
| Zhang XY30) | 1. Efficacy rate & Recovery (cure + marked improvement) rate | 1) 95.6%(43/45)/75.6%(34/45) & 80.0%(36/45)/48.9%(22/45) 2) Comparison(I/C): p<0.05 & p<0.05 |
| 2. 6-point evaluation | 1) 3-4→0-1/3-4→1-3 2) 2) Comparison(I/C): p<0.05 | |
| Mishra D et al31) | Patient statement pain level (10 points) | 12/10→2/10 |
| He L et al32) | 1. VAS | 1) 6.38±2.26→2.56±2.18(p<0.01)/5.97±1.40→3.97±3.10(p<0.01) 2) Comparison(I/C): p<0.05 |
| 2. Chinese medicine symptom score | 1) 15.94±3.95→4.47±4.27(p<0.01)/15.41±4.15→6.97±4.03(p<0.01) 2) Comparison(I/C): p<0.05 | |
| 3. Efficacy rate (Mann-Whitey test) | 1) 37.19/26.65 2) Comparison(I/C): p<0.05 | |
| Zhang YP et al33) | 1. Efficacy rate | 1) 90.9%(30/33)/75.9%(22/29) 2) Comparison(I/C): p<0.05 |
| 2. VAS | 1) 5.12±1.12→1.12±0.12(p<0.001)→(F/U 3months) 1.41±0.47(p<0.01)/4.98±1.21→2.01±0.59(p<0.001)→(F/U 3months) 2.58±0.94(p<0.01) 2) Comparison(I/C): p<0.05(end of treatment and F/U) | |
| 3. Frequency of attacks | 1) 9.64±2.81→3.89±1.24(p<0.001)→(F/U 3months) 4.41±1.07(p<0.01)/9.56±2.94→5.51±3.09(p<0.001)→(F/U 3months) 6.22±2.56(p<0.01) 2) Comparison(I/C): p<0.05(end of treatment and F/U) |
총 11편의 RCT에서 중재군은 대부분의 평가 척도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한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20,22-28,30,32,33), 치료 종료 후 추적관찰을 시행한 3편의 논문 모두에서도 유의한 호전양상을 보였다26,27,33). 두 군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지 않은 1편의 논문27)을 제외한 10편의 RCT 모두에서20,22-26,28,30,32,33) 치료 후에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으며, 추적관찰 기간 또한 중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26,33). 3편의 증례논문은 88.0%에서 중등도 이상의 호전이 나타나거나21), 환자 표현에 의거하여 VAS 10에서 VAS 0으로 ‘통증이 거의 사라졌거나(almost pain free)’29), ‘10’을 최고의 통증으로 기준 했을 때 치료 전에는 그 이상인 ‘12’에서 치료 후 ‘2’로 감소하였고, 카바마제핀 감량(Tapering of carbamazepine)31)과 같은 호전 양상이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삼차신경통 환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 특히 국내 삼차신경통 환자의 수는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50세 이후 환자수가 급격이 증가하였는데8),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초)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체계 정비 등이 지속적인 당면 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35)과 삼차신경통으로 인한 통증은 말하기, 먹기, 미소 짓기, 세수나 면도하기, 화장품 바르기, 양치하기, 심지어 미풍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얼굴 접촉이나 움직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36)은 삼차 신경통의 치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통증조절에 대한 방법으로 고대부터 침자극이 이용되어 왔고, 최근까지 opioid peptide를 비롯한 다양한 침 치료의 통증 제어 기전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37) 침 치료가 삼차신경통에서 주로 활용되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12)을 바탕으로 의학 분야 서지정보 대표 DB이며, 미국 외 70여 국가의 생의학 저널을 수록하고 매일 갱신되어 최신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38) PubMed를 중심으로 침 치료 임상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14편의 논문은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되었고, 197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증례논문(21.4%)에 비해 RCT(78.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연구가 10편(71.4%)이며, 연구 대상자는 총 남자 340명, 여자 495명으로 탈락자 4명32,33)의 성별을 명시하지 않아 탈락자를 모두 여자 대상자의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자 대상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삼차신경통은 여자에서 더 빈번하게 이환 되며4) 국외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다수 보고된 바 있고, 우리나라 또한 여성 환자수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유병률은 두 배 이상 높았던 점8) 등에서 이러한 특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침 치료는 대부분 전침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침은 2개 이상의 경혈에 자침한 후 鍼柄이나 鍼體에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침자극과 함께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법으로 자극 강도나 빈도 등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신경섬유 자극 및 신경자극물질 분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주로 통증치료, 신경마비 질환에 효과적이고 진통효과 면에서 단순 침요법보다 효과가 우수하다는 보고가 많다4). 또한 전침의 신경병증성 통증의 통증억제에 대한 실험39,40) 및 임상 연구41)등이 발표된 바 있어, 이러한 치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시술조작이 아주 간단하며 통증조절과 연관하여 적응증이 광범위한42) 피내침, 피부를 두드려서 경락 장부의 기를 소통시키는4) 매화침, 항염증, 신경보호, 신경손상 완화 등의 연구결과43)가 보고된 灯盏花素 혈위주사(DengZhanHuaSu), 火力을 빌려 寒邪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증 질환에 사용할 수 있고, 국부의 氣血壅滯를 치료하는4) 화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 도구를 병행하였는데 삼차신경통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이며3), 한의학에서 그 원인을 風寒濕 三邪에 의한 經絡氣血의 運行阻滯, 不通則痛으로 보는 것4)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자침 후 得氣感을 유도하거나 염전, 제삽, 작탁법 등과 같은 刺鍼手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得氣는 진짜침과 거짓침을 구별 짓는 요소로44) 《靈樞·九鍼十二原》에서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 刺之要 氣至而有效, 效之信 若風之吹雲明乎 若見蒼天.”45)이라 하여 得氣가 자침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침수법은 침의 補瀉작용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補虛瀉實의 질병치료 원칙에 따른 치료방법이며4) 이를 시행한 논문 대부분22,24,25,32)에서 자침수법을 활용하여 補瀉작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齊刺20), 合谷刺22), 關刺23)와 같은 침자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 齊刺는 《靈樞·官鍼》에 “齊刺者, 直入一 傍入二 以治寒氣小深者, 或曰三刺, 三刺者 治痺氣小深者也.”45)라 하여 寒邪로 인해 병변의 면적이 크지 않고 부위가 비교적 깊은 痺症의 치료에 적합하며4), 合谷刺는 《靈樞·官鍼》에 “合谷刺者 左右鷄足 鍼于分肉之間, 以取肌痺, 此脾之應也.”45)로 몇 개의 방향으로 투자하는 刺法으로 肌痺를 치료하고4), 關刺는 《靈樞·官鍼》에 “關刺者 直刺左右盡筋上, 以取筋痺 愼無出血, 此肝之應也.”45)로 筋痺症을 치료하는데4), 이 들은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痺症을 치료하는 침자법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은 한의학의 痺症의 범주에 속하고16), 痺症은 《素問·痺論》의 “黃帝問曰 痺之安生? 岐伯對曰 風寒溼 三氣雜至 合而爲痺也.”46)와 같이 그 원인 또한 風寒濕 三邪로 인한 氣血凝滯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삼차신경통의 한의학적 원인4)과 공통된 바가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양한 침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경혈은 下關(ST7)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下關(ST7)은 足陽明胃經의 경혈로 消腫止痛, 消風活絡하여 口眼喎斜, 삼차신경통과 같은 面部동통 질환에 사용되는데47), 下關(ST7)이 한의학문헌에서 삼차신경통의 通治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이었던 것48)과 일치한다. 또한 경락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가 장 많은 경혈이 사용된 경락은 足陽明胃經으로 총 11개의 경혈이 사용되었고(Table 6) 동시에 가장 많이 활용된 경혈 1, 3, 4위 모두 足陽明胃經에 속한 경혈이었는데(Table 7) 이는 面은 諸陽之會로 手足 六陽之脈이 모두 面에 이르지만, 足陽明胃經의 脈은 起於鼻, 交額中, 入齒, 挾口環脣, 倚頰車, 上耳前, 過客主人, 維絡于面上하므로, 面病은 특히 足陽明胃經에 屬한다는 점49)에서 이러한 경락 및 경혈 선택의 특성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삼차신경통은 특성 상 각 분지 별 통증에 따라 취혈하는데4), 각 분지 별로 사용된 경혈을 살펴보면 1지(ophthalmic branch)는 눈썹 정중앙에 위치하고50) 淸熱散風 鎭靜安神하여 두통, 眼疾에 활용되는51) 魚腰(Ex-HN4), 2지(maxillary branch)는 infraorbital foramen에 위치하며 舒筋鎭痛하여 삼차신경통 등을 主治하는50) 四白(ST2), 3지(mandibular branch)는 承漿(CV24) 양측 각 1寸에 위치한51) 俠承漿(Ex-HN)이 각각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人迎(ST9)을 제외한 경혈들 또한 모두 각 분지가 주행하는 위치 상에 존재한 경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魚腰(Ex-HN4)와 四白(ST2)은 삼차신경의 끝가지가 얼굴로 나오는 구멍인 안와위구멍, 안와아래구멍의 위치와 유사하여 마취점으로 이용하는 부위와 유사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12). 또한 俠承漿(Ex-HN)은 下關(ST7), 合谷(LI4)과 함께 삼차신경통을 치료하는데 활용50)하는데, 실제로 3편의 논문23,30,32)에서 세 경혈의 조합을 사용하였고, 1편25)에서는 俠承漿(Ex-HN)과 下關(ST7)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3지 통증에 사용된 人迎(ST9)은 안면부에 위치하지 않았으나 足陽明胃經과 足少陽膽經의 交會穴47)로서 《靈樞·經脈》45)에 “膽足少陽之脈…其支者 別銳眥 下大迎 合于手少陽, 抵于䪼下加頰車”, “三焦手少陽之脈…所生病者 頰痛”, “胃足陽明之脈…循頰車 上耳前過客主人”와 《東醫寶鑑》에 “面病은 특히 足陽明胃經에 屬한다는 점”49)에서 足少陽膽經과 足陽明胃經이 안면을 주행하고 頰痛과 연관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3지 순행부위에 해당하는 하악(mandible)에 위치한 頰車(ST6)50)를 지난다는 점과 人迎(ST9)은 11번 뇌신경과 C2, C3의 지배를 받는 근육으로, 손상되면 두통, 안면통 등의 통증 및 근육 이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흉쇄유돌근52)의 前緣에 위치한다는 점47)에서 삼차신경통 3지 통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12편의 논문20,23-33)에서 삼차신경통 발병 부위인 안면 近位穴과 遠位穴을 병행하여 치료하였는데, 이는 침구 치료가 혈위나 경락 침구를 통하여 국소로서의 지체나 내장기관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생체에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頭部의 병변은 근위혈을 선택하여 主穴로 삼고 遠部穴을 配穴로 삼아 치료한다는 遠近配穴法4)과 같은 침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 Ranking | Acupoint | Number of Uses |
|---|---|---|
| 1 | ST7 | 17 |
| 2 | LI4 | 16 |
| 3 | ST25 | 15 |
| 4 | ST44 | 14 |
| 5 | LR3 | 9 |
치료 기간은 10일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하였으며, 치료 횟수는 매일 치료와 격일치료가 대부분(69.2%)을 차지하였다. 특징적으로 Peng YY et al25)은 침 치료는 매일, 화침은 5일에 한번 치료하였는데 화침은 침을 자침 전에 붉게 달군 후 인체의 경혈에 자입하는 치료로 자침했던 침공이 다 아물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다시 자침하지 않아야 하며, 자침부위를 보호함으로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4)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척도는 유효율이 9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治癒(痊癒, 临床治癒, 临床痊癒, complete remission), 显效(partial remission), 有效(好转, mild remission), 无效(no response)인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9편의 논문20,22,23,25,26,28,30,32,33)모두 통증의 호전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 중 5편의 논문22,23,25,26,28)에서는 안면 감각 기능도 함께 평가하였으며, Yang JX et al26)은 이 외에도 정신심리 점수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He L et al32)은 함께 사용된 평가 척도 중의 하나인 中医证候评分를 기준으로 유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中医证候评分를 활용한 3편의 논문22,24,32)은 모두 主症과 次症을 輕, 中, 重으로 나누어 主症은 2, 4, 6점 次症은 1, 2, 3점으로 평가하였는데, 모두 主症의 항목은 통증의 정도 횟수로 동일하였으나, 次症의 항목은 Zhang WW et al22)은 명시하지 않았고, Wu MM et al24)은 통증 부위의 灼熱感, 目赤面紅, 口渴喜飮, 便秘溺赤 등이었으며 He L et al32)은 心煩易怒, 面紅目赤, 口乾口苦, 脇痛으로 그 기준이 달랐다. 이러한 세부기준의 차이는 결과의 객관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례논문21,29,31) 중 2편29,31)의 논문은 VAS를 비롯한 환자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 진술에 의거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통증의 평가는 통증을 느끼는 환자 본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통증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53) 통증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가능한 정확히 평가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위한 통증의 정량화 작업이 진행되어 다양한 객관적 평가 도구가 존재하므로54)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삶의 질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상태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삼차신경통은 통증만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며, 실제 삼차신경통으로 인한 통증 발생의 공포감과 일상생활 및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국내 증례 보고가 있고55) 삼차신경통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11),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풍요가 도래하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56) 이러한 삶의 질 및 정신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은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료 결과는 Gao J et al27)의 연구에서 SF-36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항목 중 vitality, physical function, social function을 제외한 모든 결과가 중재군에서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고, RCT의 경우 두 군의 결과를 비교하지 않은 논문27)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의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 특히 Yang JX et al26) 연구에서 PRI와 HAMD(Hamilton depression scale)가 치료 후에는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종료 후 2개월과 6개월의 추적관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와 함께 Gao J et al27)의 경우 중재군의 유의한 호전이 치료 6주 후의 추적관찰에서도 유의하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은 침 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인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특히 양약복용을 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26)은 약리학적 효과보다 더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경차단술57)에서도 치료 지속을 위하여 약 일주일의 간격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58)에서 차별화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관찰한 논문의 수가 적다는 점은 유의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치료 후 추적관찰 효과에 대한 더 많은 결과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14편의 논문 중 5편의 논문24,26,31-33)에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중 3편의 논문24,26,33)에서 이상반응이 확인되었다. 발생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치료 없이 소실되거나 대증요법 후 감소 혹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고26),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의 발생건수가 더 적거나24) 발생률 또한 유의하게 낮았다26,33). 또한 Yang JX et al26)은 치료의 안정성 확인을 위하여 치료 전후 혈액검사와 혈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肝腎기능 및 심혈관시스템59)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치료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침 치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상반응과 안정성을 확인한 연구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침 치료의 안정성을 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가 PubMed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생각되며, 향후 다른 국외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Ⅴ. 결 론
-
침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는 4편(28.6%)으로, 10편의 연구(71.4%)에서 병행치료를 시행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은 下關(ST7)이었고, 가장 많은 경혈이 사용된 경락은 足陽明胃經이었다. 치료혈의 조합은 12편의 논문(85.7%)에서 近位穴과 遠位穴을 동시에 取穴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차신경 분지 별 통증에 따라 취혈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각 분지가 주행하는 위치 상에 존재한 경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침 시 得氣를 유도하거나 捻轉, 提揷, 雀啄法 등과 같은 다양한 刺鍼手法을 사용하였고, 3편의 연구에서는 齊刺, 合谷刺, 關刺와 같은 다양한 鍼刺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
14편의 논문 모두 치료 후 대부분의 평가 척도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한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적관찰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가척도는 유효율(efficacy rate)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VAS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综合症状评分, 中医证候评分, 발작빈도 등과 같은 다양한 통증 관련 척도 외에도 심리상태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확인한 총 5편의 논문 중 3편의 논문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고 그 중류는 피하 혈종, 자침부위 통증, 가려움증 등으로 대부분 치료 없이 소실되거나 대증요법 후 감소 혹은 소실되었고 혈청 BUN, Creatinine, ALT 수치와 평균 동맥압 및 심박수로 안정성을 평가한 논문에서 치료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국외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PubMed를 중심으로 삼차신경통의 침 치료 임상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침 치료가 효과적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71.4%)에서 병행치료를 시행하였고, 평가 척도의 세부 기준이 달랐다. 또한 치료 후 추적관찰을 시행한 연구의 수(28.6%)와 이상반응과 안정성을 확인한 연구의 수(35.7%)가 적었다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유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