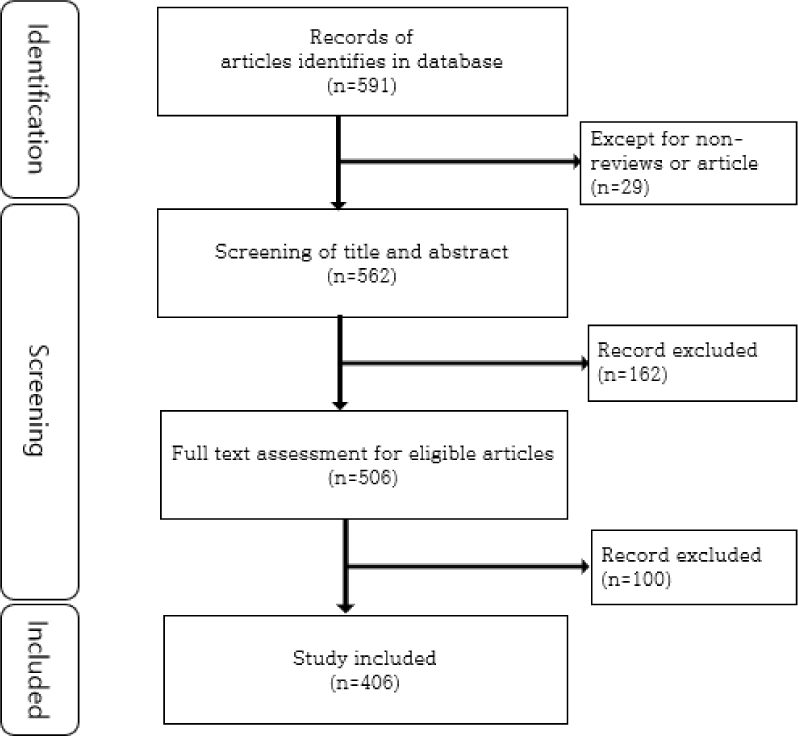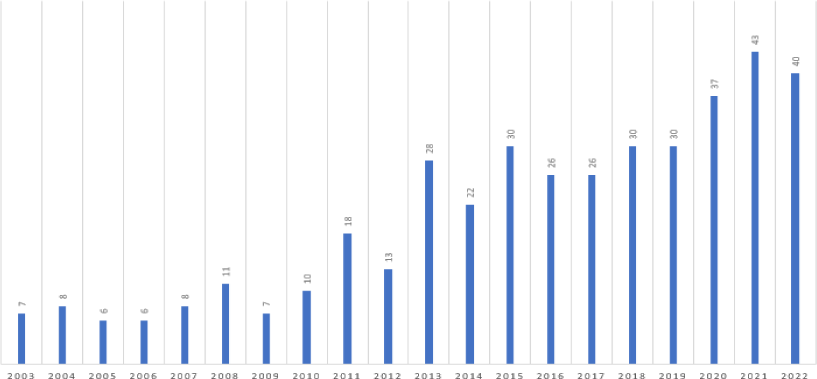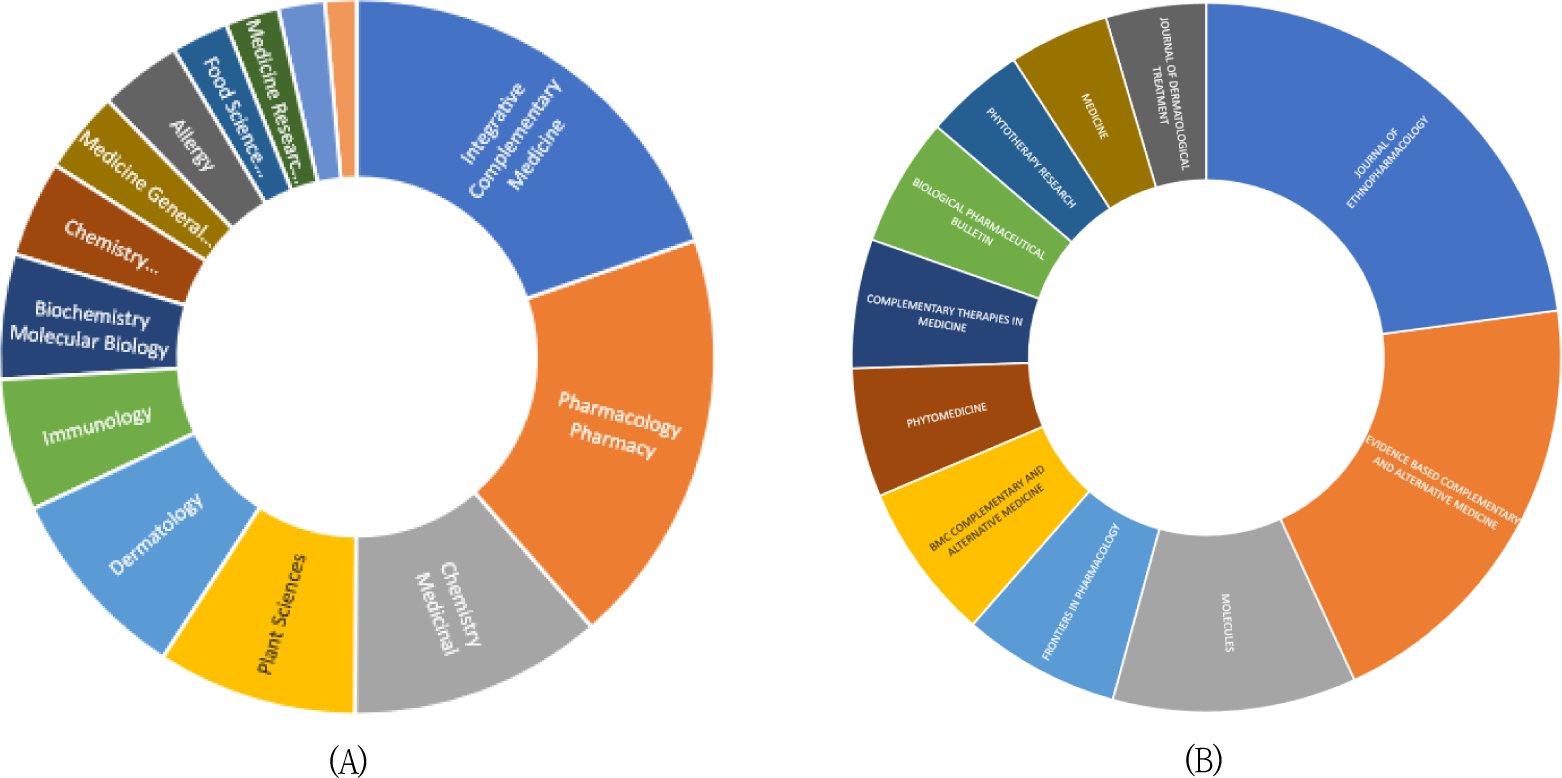Ⅰ. 서 론
아토피(atopy)란 다양한 항원 및 알레르겐(allergens)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IgE의 과잉 생산을 일으키는 유전적 소인을 말한다.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결막염, IgE 매개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은 가역적인 기도 폐쇄와 기도 과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2), 알레르기성 비염은 비강 내 염증반응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3), 아토피성 피부염은 소양감을 동반하는 습진 병변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염을 말한다4). 이러한 아토피 질환의 발생은 기관지, 코 점막, 피부 등 발생 부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항원 및 알레르겐에 대한 Th2 분화와 IgE의 과잉 생산이 주로 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알레르겐에 노출되면 항원제시세포(APC)가 알레르겐을 흡수하여 Th2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활성화된 Th2 세포는 IL4, IL5, IL13 등의 사이토카인(cytokine)을 유리시킨다. 이 사이토카인은 B림프구에서 IgE로의 동형전환(isotype switching)을 촉진하여 알레르겐 특이 IgE를 생성하는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는 비만세포, 호염기구 등 각종 세포 표면의 고친화성 IgE 수용체(FeεRI)에 결합된다. 알레르겐에 재노출 시 알레르겐은 해당 세포 표면의 IgE에 결합하여 비만세포 및 호염기구를 활성화하며 히스타민, 류코트리엔과 같은 신경 및 혈관활성 매개체를 방출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4-7).
아토피 질환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발 요인 회피를 통한 예방이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약물요법 또는 원인 알레르겐을 소량씩 투여하는 면역요법을 통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다만, 증상 조절이 필요하거나 만성적인 재발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8).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혈관 투과성 억제, T세포, 비만세포 및 대식세포로부터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 랑게르한스세포의 항원 제시 방해 등의 항염증 작용을 하며 대부분의 아토피 질환에서 사용된다9). 기관지 천식의 경우 흡입제로10),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비강 내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되며11)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주로 외용제로 사용되지만 증상에 따라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12). 스테로이드제는 적절한 사용 시 위험이 거의 없으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피부 위축, 자반병, 선조, 모세혈관 확장증 등의 국소 부작용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13), 장기간 사용 시에는 여러 전신적인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14). 따라서 아토피 관리를 위한 대안적 치료법이 필요하고, 국내외에서 아토피 질환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15).
한의학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한약 치료가 고려되며 증상에 따라 한약재를 활용한 외치법 및 침 치료를 병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의과와 의과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의 재발 위험은 의과가 한의과보다 각각 1.7배, 1.6배, 1.1배로 높게 나타났다16).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한약의 유의한 효과17) 및 천식 환자의 한약 병행 치료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였다18). 최근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약재 및 한약 추출물의 기전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고 있으나, 나라별, 기관별,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19). 향후 효율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하여, 현재까지 아토피의 한약 치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은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식의 배포와 소통 과정 그리고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속성과 형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의 목적은 논문 및 학술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공동연구의 패턴과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고, 현존하는 문헌에서 특정 영역의 지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20).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로 보완대체의학과 COVID-19 감염 이후 지속되는 증상의 관리에 대한 연구21),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통합의학의 연구 동향22), 뜸을 이용한 통증 치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23) 등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연구가 보고되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24)도 보고된 바 있으나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를 주제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한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을 통해 향후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과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논문 검색은 2023년 3월 21일 경희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Database(WOSCC)를 사용하여 2003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간된 논문에서 “Topic”: ("atopy" OR "atopic") and ("herb*" OR "herbal" OR "herb therapy" OR “herb medicine” OR "phytotherapy" OR "ethnobotany")로 검색하였으며 언어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WOSCC)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고 수준 높은 저널이 포함하고, 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지학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25). Web of Science는 Pudovkin과 Garfield에 의해 만들어진 알고리즘26)과 다수의 어림법을 사용하여 학술지들을 약 250개의 연구 분야로 분류한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논문들로 구성된 학술지의 특성을 담기 위해 Web of Science의 연구 분야 분류는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며, 각 학술지는 1개에서 6개까지의 연구 분야로 분류된다27).
총 59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article’, ‘review’에 해당하는 영어 논문으로 제한하여 56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며 (1) 아토피와 관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연구, (2) 아토피 질환의 특성에만 국한된 연구, (3) 양방 치료만 언급된 경우, (4) 철회된 논문, (5) 원문 확인이 불가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논문들의 원문까지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406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데이터는 추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 txt 형식으로 내보내졌다(Fig. 1).
출판연도, 연구 분야, 학술지, 국가, 연구기관, 저자, 키워드 등의 모든 데이터는 Web of Science에서 추출 후 다운로드 되어 VOSviewer(v.1.6.18,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eiden University, Leiden, The Netherlands)에서 분석되었다. VOSviewer는 거리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관 강도에 따른 유사성을 측정한다. 프로그램에서의 높은 연관 강도는 동시에 발생한 빈도가 높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용어 간의 더 큰 유사성을 의미한다28). 프로그램에서 형성되는 원의 크기는 국가, 연구기관, 저자, 키워드 등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며, 연관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 노드 간의 거리가 결정된다29). 밀접하게 관련된 노드들의 집합체가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이를 클러스터라고 부른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Waltman과 Van Eck30)의 스마트 로컬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클러스터 개수는 해상도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클러스터별로 다른 색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Ⅲ. 결 과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연도별로의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도는 2021년으로 43편(10.9%)의 연구가 발표되었다(Fig. 2).
연구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Integrative Complementary Medicine(122편, 30.1%)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Pharmacology Pharmacy(117편, 28.8%), Chemistry Medicinal(71편, 17.5%)이 그 뒤를 이었다(Table 1, Fig. 3A).
| Rank | Research Areas | Record Count | % |
|---|---|---|---|
| 1 | Integrative Complementary Medicine | 122 | 30.1 |
| 2 | Pharmacology Pharmacy | 117 | 28.8 |
| 3 | Chemistry Medicinal | 71 | 17.5 |
| 4 | Plant Sciences | 56 | 13.8 |
| 5 | Dermatology | 55 | 13.6 |
학술지별로 분석을 한 결과 Journal of Ethnopharmacology(35편, 8.6%)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그다음은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31편, 7.6%), Molecules(17편, 4.2%) 순이었다(Table 2, Fig. 3B).
국가별로 분석을 하면 1편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국가는 총 41개였으며, 한국(148편, 36.5%)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다음은 중국(101편, 24.9%), 미국(44편, 10.8%), 일본(30편, 7.4%)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Table 3).
| Rank | Countries | Record Count | % of 406 | Total Link Strength |
|---|---|---|---|---|
| 1 | SOUTH KOREA | 148 | 36.5 | 7 |
| 2 | PEOPLES R CHINA | 101 | 24.9 | 29 |
| 3 | USA | 44 | 10.8 | 20 |
| 4 | JAPAN | 30 | 7.4 | 6 |
| 5 | TAIWAN | 25 | 6.2 | 9 |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14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VOSview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판 논문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연계된 국가들끼리는 같은 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연관성이 높을수록 노드 간 거리가 가깝게 나타났다. 클러스터 1에는 한국,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이 있으며, 클러스터 2에는 인도, 폴란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 속했다. 클러스터 3에는 일본, 독일, 이란이 속하며 클러스터 4에는 이탈리아, 클러스터 5에는 대만이 속했다(Fig. 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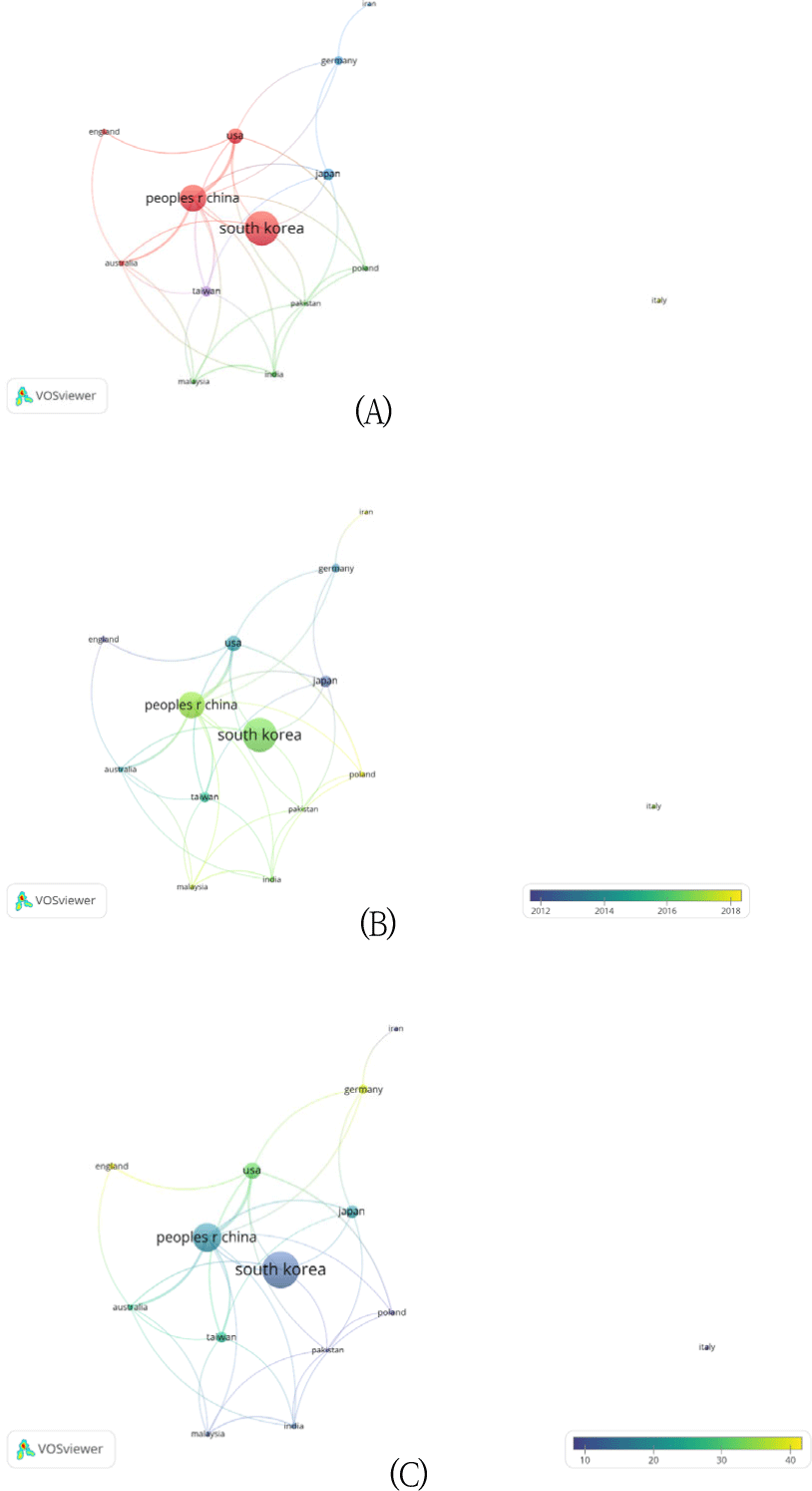
출판연도의 평균을 분석하여 각 국가에 대하여 색상의 막대로 표시하였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과거를 나타내며 노란색은 최근을 나타낸다(Fig. 4B). 평균 인용 횟수를 분석하였을 때 색상의 막대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인용 횟수가 적음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인용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Fig. 4C).
연구기관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기관은 경희대학교(11.6%)였으며, 그다음은 한국한의학연구원(11.3%),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7.4%), Prince of Wales Hospital(4.2%),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3.5%)이 그다음이었다(Table 4).
VOSviewer에서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3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클러스터 1에는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산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9개의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클러스터 2에서는 Chang Gung University, China Medical University, National Yang Ming University 등 6개의 기관이 속했다. 클러스터 3에는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Guangdong Provincial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등 4개의 기관이 속하였으며, 클러스터 4에는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Maca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속했다. 클러스터 5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6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개의 기관이 속했다. 클러스터 7에는 Chung-Ang University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8에는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클러스터 9에는 Osaka Metropolitan University, 클러스터 10에는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클러스터 11에는 University of Freiburg가 속했다(Fig. 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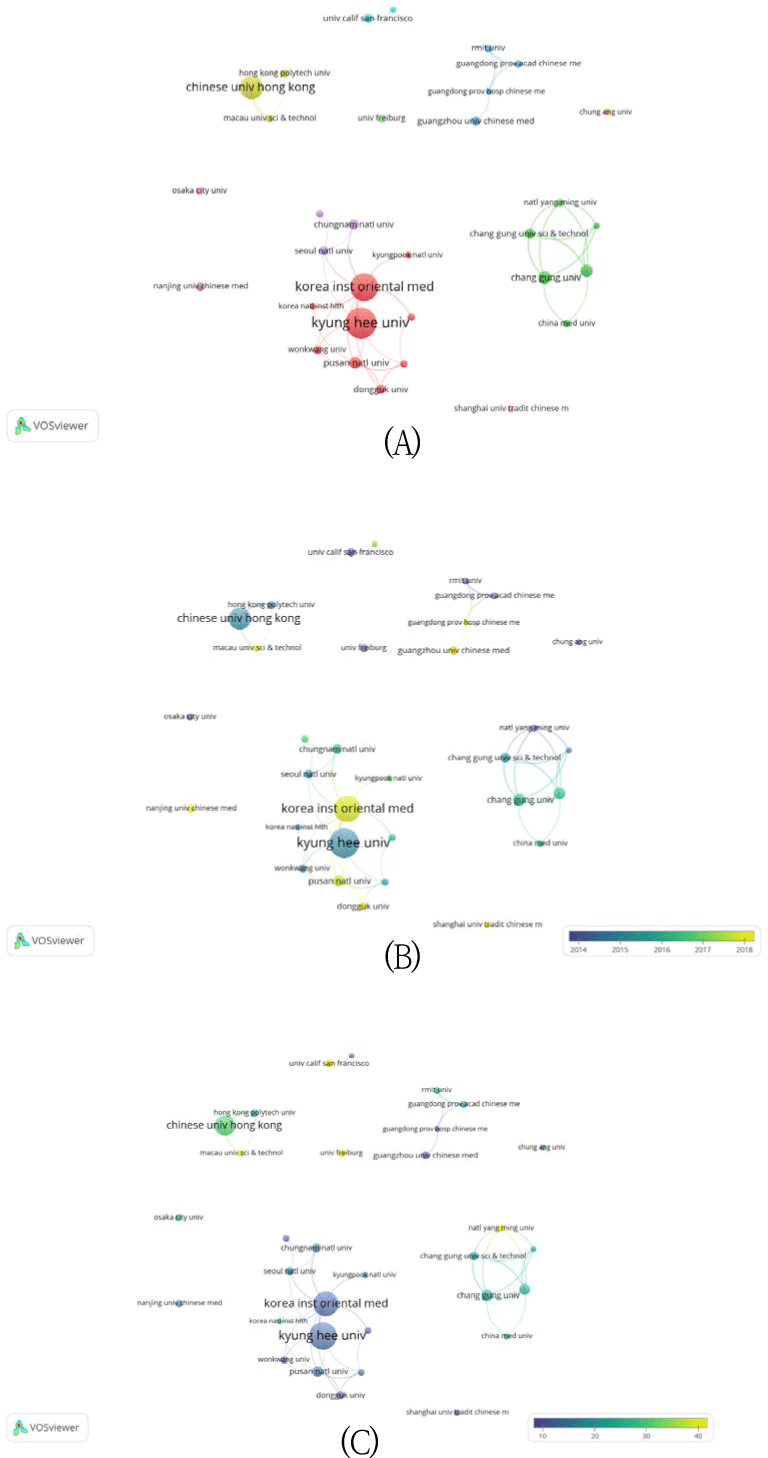
출판연도의 평균을 분석하여 각 연구기관에 대하여 색상의 막대로 표시하였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과거를 나타내며 노란색은 최근을 나타낸다(Fig. 5B). 평균 인용 횟수를 분석하였을 때 색상의 막대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인용 횟수가 적음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인용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Fig. 5C).
저자의 기여도에 중점을 두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별 분석이 진행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저자는 Leung Ping Chung(17편, 4.19%)이었으며, 그다음은 Hon Kam Lun(16편, 3.9%), Ma Jin Yeul(13편, 3.2%), Chan Ben(11편, 2.7%), Wong Chun Kwok(10편, 2.5%) 순이었다(Table 5).
| Rank | Author | Record Count | % of 406 | Total Link Strength |
|---|---|---|---|---|
| 1 | Leung Ping Chung | 17 | 4.2 | 60 |
| 2 | Hon Kam Lun | 16 | 3.9 | 48 |
| 3 | Ma Jin Yeul | 13 | 3.2 | 20 |
| 4 | Chan Ben | 11 | 2.7 | 43 |
| 5 | Wong Chun Kwok | 10 | 2.5 | 39 |
VOSviewer에서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41명의 저자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판 논문 수가 많은 저자일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연계된 저자들끼리는 같은 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연관성이 높을수록 노드 간 거리가 가깝게 나타났다. 클러스터 1에는 10명의 저자가 포함되었으며, Leung Ping Chung, Hon Kam Lun, Chan Ben 등이 속했다. 클러스터 2에서는 Kim Kyu Seok, Choi In Hwa, Ko Seong Gyu 등 8명의 저자가 속했다. 클러스터 3에는 Lim Hye Sun, Seo Chang Seob, Shin Hyeun Kyoo 등 6명의 저자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4에는 Chen Dacan, Xue Charlie C., Mo Xiumei 등 4명의 저자가 속했다. 클러스터 5에는 Ma Jin Yeul, Cho Won Kyung, Yang Ju Hye 등 4명의 저자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6에는 Chen Hsing Yu, Chen Yu Chun, Lin Yi Hsuan 3명의 저자가 속했다. 클러스터 7에는 Elias Peter M., Man Mao Qiang 2명의 저자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8에는 Loo Steven, Lin Zhixiu 2명의 저자가 속했으며, 클러스터 9에는 Schempp Christoph, Woelfl Ute 2명의 저자가 속했다(Fig. 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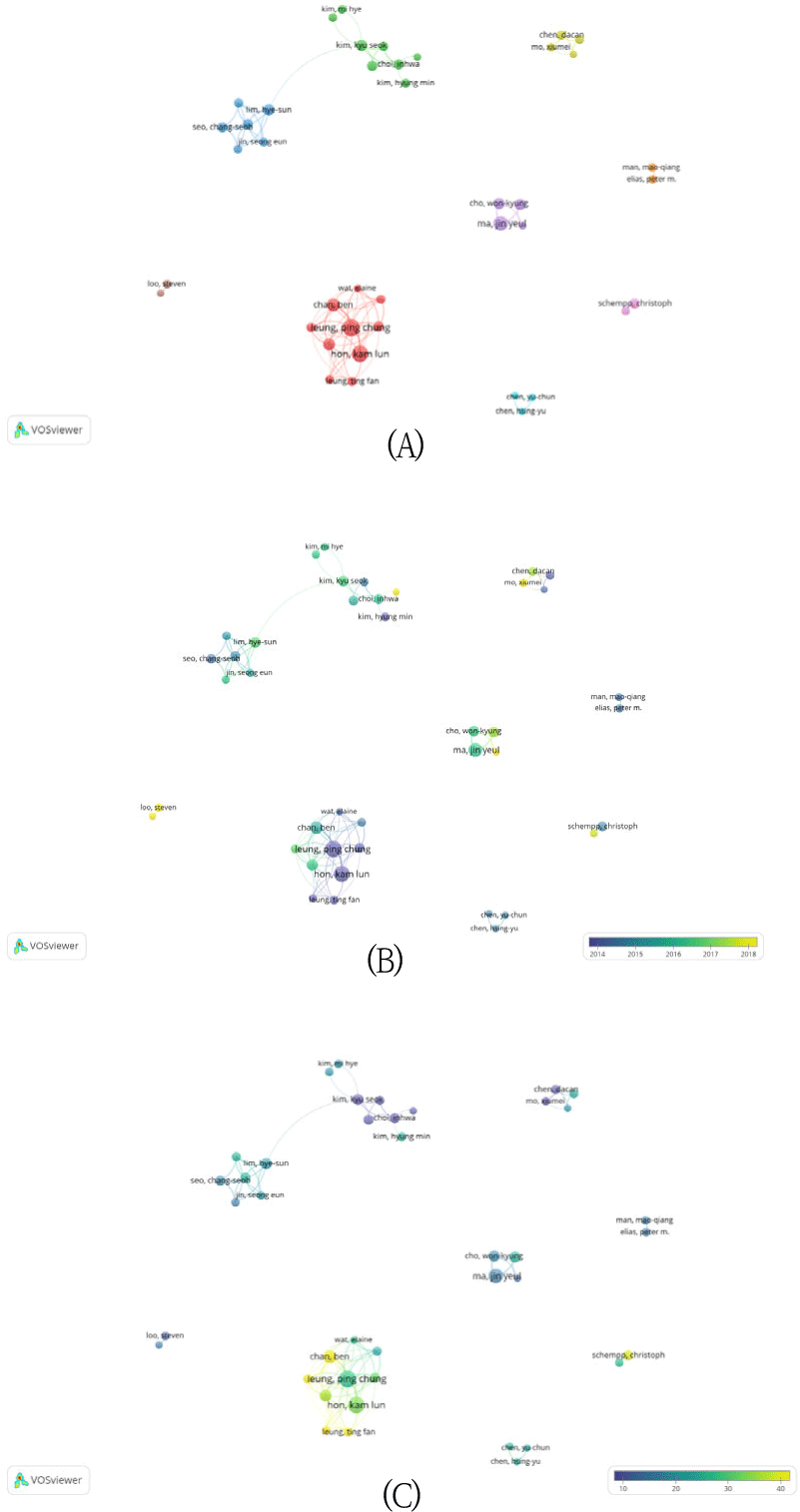
출판연도의 평균을 분석하여 각 저자에 대하여 색상의 막대로 표시하였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과거를 나타내며 노란색은 최근을 나타낸다(Fig. 6B). 평균 인용 횟수를 분석하였을 때 색상의 막대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인용 횟수가 적음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인용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Fig. 6C). 저자를 대상으로 분류된 클러스터별 평균 출판연도와 평균 인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클러스터 1의 경우 다른 클러스터들의 저자보다 평균 출판연도가 비교적 오래되고 평균 인용 횟수가 높은 클러스터로 구분될 수 있었다.
406편의 연구에서 포함된 키워드를 VOSviewer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 필드에서 언급된 총 1,842개의 키워드 중 10회 이상 등장한 총 68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Fig. 7A). 가장 많이 발생한 키워드일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노드 간 거리가 가까우며 노드 간 연결고리도 많게 나타난다. 클러스터는 총 3개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 1은 빨간색, 클러스터 2는 초록색, 클러스터 3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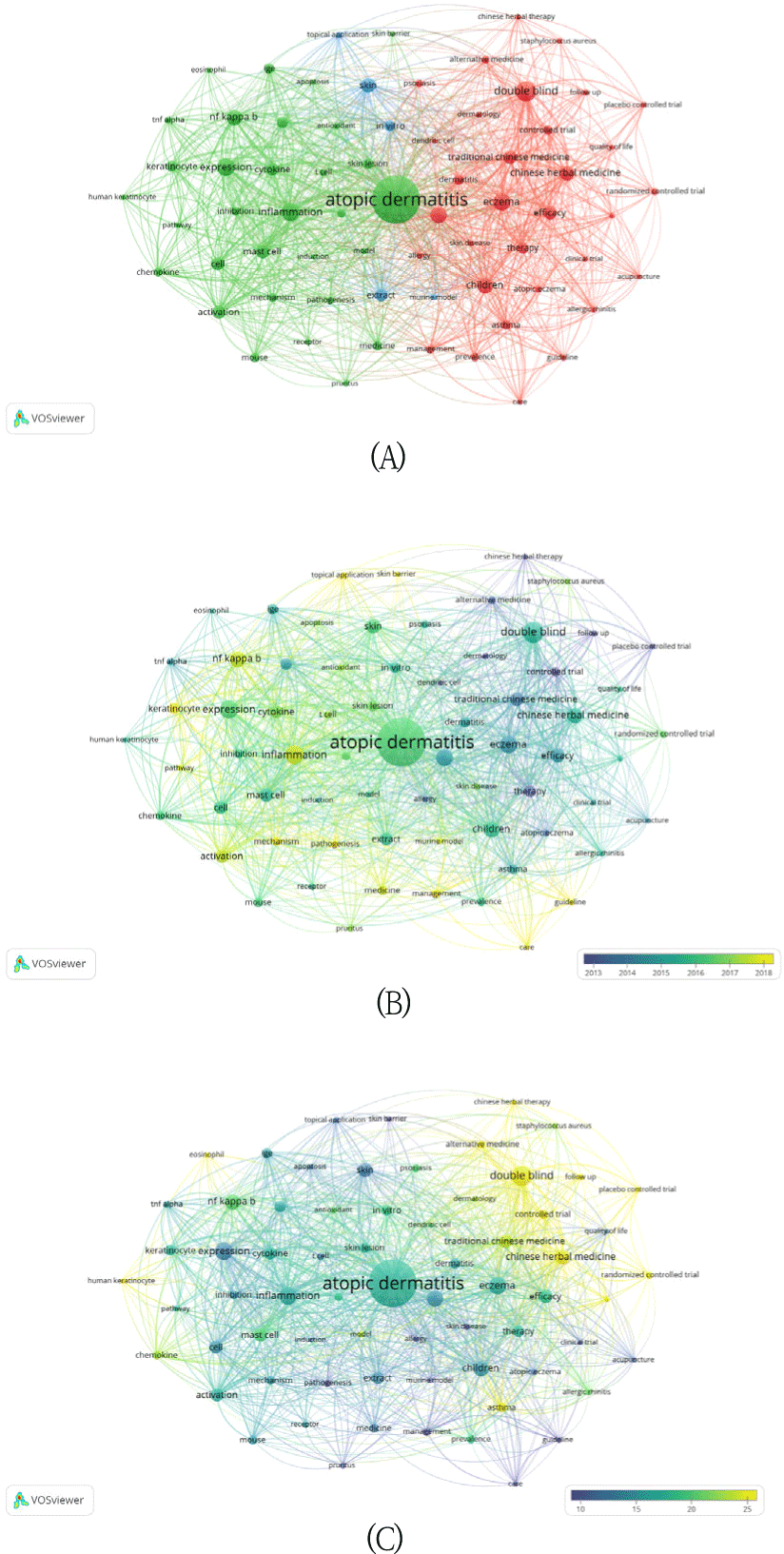
가장 최근에 발생된 상위 3개의 키워드는 topical application(2019.2년), skin barrier(2018.9년), care(2018.6년)였으며, 가장 오래된 상위 3개의 키워드는 follow up(2007.7년), chinese herbal therapy(2008.8년), controlled trial(2011.6년)이었다(Table 6).
출판연도의 평균을 분석하여 각 클러스터에 대하여 색상의 막대로 표시하였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과거를 나타내며 노란색은 최근을 나타낸다(Fig. 7B). 평균 인 용 횟수를 분석하였을 때 색상의 막대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인용 횟수가 적음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인용 횟수가 많음을 나타낸다(Fig. 7C).
Ⅳ. 고 찰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406편의 논문을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초기 10년 동안(2003년에서 2012년까지) 발행된 논문 수(94건)보다 최근 10년 동안(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논문의 수(312건)가 대략 3.3배 정도 많았다. 이를 통해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 임상 연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분야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Integrative Complementary Medicine, Pharmacology Pharmacy, Chemistry Medicinal 순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아토피 질환 치료법 중 한약은 통합의학과 보완·대체의학적인 측면에서 높은 비중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약리학적 및 의화학적 연구를 통해 한약 또는 약재들의 약리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학술지별로 분석을 한 결과 Journal of Ethnopharmacology(35편, 8.6%)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그다음은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31편, 7.6%), Molecules(17편, 4.2%) 순서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상위 5개의 학술지 중 가장 높은 IF를 가진 학술지는 Frontiers in Pharmacology(6.0)였으며 가장 낮은 IF를 가진 저널은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7)이었다.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는 상위 5개 학술지의 IF 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순으로 많은 논문이 출판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시기별 특징으로는 과거에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서구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시 출판물 발생 빈도의 총합(total link strength)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7, 중국이 29로 확인되어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출간된 논문 수는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독립적으로 연구가 시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별 평균 출판연도와 평균 인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영국(2011.8년, 45.20)과 독일(2013.47년, 37.05)은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 출판연도가 비교적 오래되고 평균 인용 횟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출판연도가 빠를수록 평균 인용 횟수가 높아지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판연도가 가장 빠르고 평균 인용 횟수가 높은 연구는 영국의 Leicester 의과대학 부속병원 피부 클리닉에서 아토피 피부염 소아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보완·대체의학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대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였다31). 연구 결과, 아토피 환자들이 보완·대체의학 치료제가 국립 보건 서비스에 포함이 되길 희망하거나 보완·대체의학 치료제를 사용할 의지가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아토피 질환 치료에 보완·대체의학적 치료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것과 동시에 초기 연구로서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관별 분석 결과, 최근 20년 동안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ince of Wales Hospital,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순으로 많은 논문이 출간된 점을 알 수 있었다.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3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11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클러스터 1의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산대학교 등의 9개 기관과 클러스터 5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은 한국 소속으로 총 32개의 기관 중 12개의 기관(37.5%)을 보유한 한국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 출판물 발생 빈도(link strength)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경희대학교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5의 link strength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클러스터 간 link strength가 확인되지 않아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자별로 분석한 결과, Leung Ping Chung, Hon Kam Lun, Ma Jin Yeul, Chan Ben, Wong Chun Kwok 순서였다.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41명의 저자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9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특히, 클러스터 1에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상위 5명의 저자들 중 4명이 포함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상위 5명의 저자별 평균 인용 횟수와 total link strength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Chan Ben은 총 인용 횟수 433회, 평균 인용 횟수 39.36회, total link strength 43회로 영향력 있는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알레르기성 천식 및 아토피성 피부염을 포함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의 항염증 치료를 위한 IL-33/ST2 축을 표적으로 하는 한약의 향후 약리학적 전략 및 적용에 관한 연구32)와 5개의 한약재들(金銀花, 薄荷, 牧丹皮, 蒼朮, 黃柏)로 구성된 한약인 Pentaherbs의 약리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를 2008년33)부터 2022년34)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며 아토피 한약 치료의 연구에 큰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상위 3개의 키워드는 topical application(2019.21년), skin barrier(2018.91년), care(2018.6년)였으며, 가장 오래된 상위 3개의 키워드는 follow up(2007.79년), chinese herbal therapy(2008.82년), controlled trial(2011.62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에는 한약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임상시험 위주로 진행된 점을 알 수 있다.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약 및 약재들의 약리학적 기전이 연구됨에 따라 최근에는 한약 및 약재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개선 효과와 관리법에 관한 연구까지 확장되어 외치법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키워드는 VOSviewer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연구 결과에 포함된 키워드 내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빈도를 기반으로 유사성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관한 주요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대략 ‘임상연구’, ‘약리학적 기전’, ‘외치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 이중 맹검(double blind), 습진(eczema), 한약(herbal medicine, chinese herbal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아동(children), 효능(efficacy), 치료(therapy), 피부염(dermatitis), 대조시험(controlled trial) 등 아토피의 한약 치료와 임상연구에 관한 33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33개 키워드 중 상위 10개 키워드의 특성을 담으면서 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연구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한약재의 효능 및 내약성을 평가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가 있었다.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아동 환자를 두 실험군으로 나누어 金銀花, 薄荷, 牧丹皮, 蒼朮, 黃柏으로 구성된 한약 또는 위약 캡슐을 총 12주 동안 1일 2회 투여한 결과, 한약 투여군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사용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35).
두 번째 클러스터에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표출(expression), 염증(inflammation), NF-kappa B, 활동(activation), 비만세포(mast cell), 사이토카인(cytokine), 세포(cell), nc/nga mouse, 각질 형성 세포(keratinocyte) 등의 31개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즉, 아토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 및 약재들의 약리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위 키워드 중 실험 방법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세포 내의 경우 nc/nga mouse model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세포 외의 경우 HaCat cell(human keratinocyte cell)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출(expression), 염증(inflammation), NF-kappa B, 활동(activation), 비만세포(mast cell), 사이토카인(cytokine)과 같은 키워드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Th2 사이토카인 매개 면역질환이고 Th1, Th17, 비만세포, B림프구와 같은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활동이 발병과정에 포함되는 특성36)을 반영한다. 이에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주로 선택되지만, IL-10과 같은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자극하는 방법도 고려되는 추세이다37). 아울러 NF-kappa B 활동 억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 및 Phosphoinositide 3-kinase(PI3K)와 같은 케모카인(chemokine) 발현 하향조절, 혈청 IgE 저하 등의 복합적인 조절이 가능한 한약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38).
세 번째 클러스터는 피부(skin), 추출물(extract), 생체 외(in vitro), 국소 투여(topical application), 쥣과 실험체(murine model)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생체 외 실험으로 실험체의 피부에 추출물을 국소적으로 투여하여 특정 약재의 항염증, 항알레르기 및 피부 장벽 개선 효능과 관리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시기적 변화에 따른 키워드들의 특징처럼 다양한 한약 및 약재들의 약리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외치법 연구까지 확장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화 추출물(chrysanthemum morifolium extract)인 apigenin을 국소 외용제로 사용했을 때 접촉성 피부염 실험체에서 급성 염증반응이 억제되고 표피 수분 손실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다39). 반면에 피부 각질층의 산도가 표피 투과도 항상성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약재 구성과 상관없이 낮은 산도(≤pH 5.5)의 외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토피 병변에 효과적임을 밝혀낸 연구도 있었다40). 이를 바탕으로 apigenin과 같이 피부 병변의 염증반응을 줄이고 피부 장벽 항상성에 도움을 주는 기전의 특성을 가지면서, 낮은 산도의 성질을 가지는 외용제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고 외치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언어를 영어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Web of Science에서 검색된 결과 중 영어로 기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전체 논문(591개)의 95.1%가 영어 논문(562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에 포함했다면 더욱 광범위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Science Citation Index 학술지를 포함한 WOSCC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한약 및 약재들의 경우 VOSviewer 프로그램에서 키워드로 인식이 되지 않아, 한약 및 약재들의 mapping 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을 한계로 가진다.
Ⅴ. 결 론
-
연도별 분석에서 2021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는 통합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약리학적 및 의화학적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했다.
-
최근 20년간 아토피 질환의 한약 치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출간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5개 이상의 연구를 발표한 총 32개의 기관 중 37.5%인 12개의 기관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
406개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가장 최신의 상위 3개 키워드는 ‘topical application’, ‘skin barrier’, ‘care’였다.
-
VOSviewer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키워드들은 공동으로 나타나는 빈도를 기반으로 유사성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본 논문의 경우 총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임상연구’와 관련된 ‘double blind’, ‘eczema’, ‘herbal medicine’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약리학적 기전’과 연관 있는 ‘atopic dermatitis’, ‘expression’, ‘inflammation’, ‘NF-kappa B’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는 ‘외치법’과 관련된 ‘skin’, ‘extract’, ‘in vitro’, ‘topical application’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