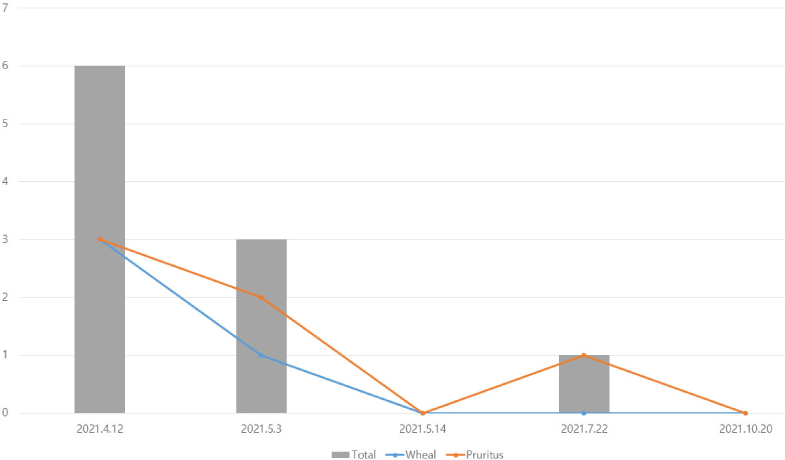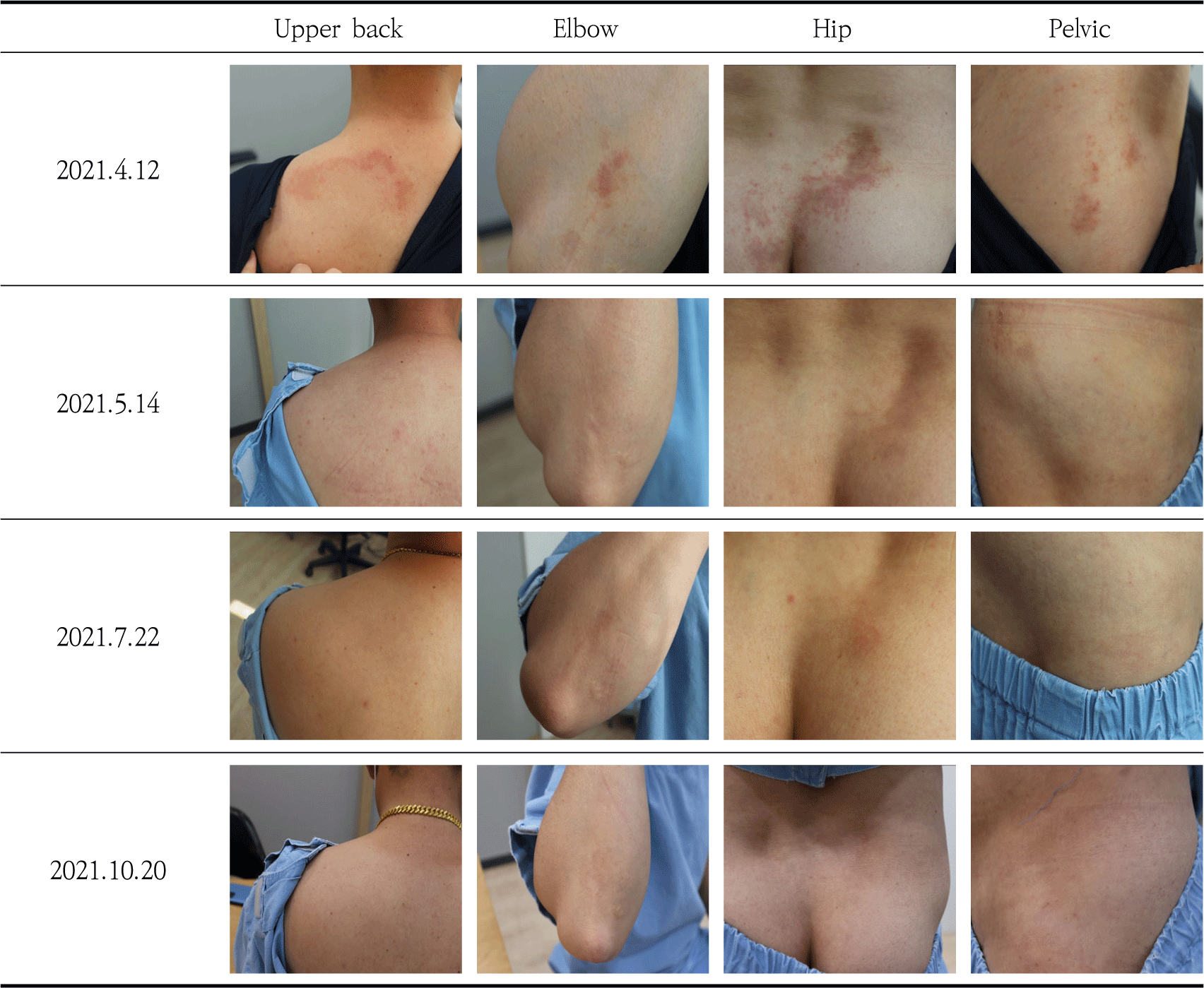Ⅰ. 서 론
두드러기는 진피에 일시적으로 부종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 이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몹시 가렵고 경계가 명확하며 홍색이나 흰색으로 붓는 증상이 특징적이다1). 이외에도 호흡곤란, 천식양 발작 등의 호흡기 증상과 복통, 설사 등의 위장증상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2).
두드러기는 2020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KCD-8) 두드러기(L50)로 분류되며, 2021년 대한민국의 요양기관에 두드러기 상병(L50)으로 2,324,505명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두드러기는 비교적 진단이 쉬우며, 이환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 두드러기는 음식, 약물, 감염 등에 의해 나타나는 6주 미만의 일시적인 질병이다. 급성 두드러기는 원인이 소실되면 호전될 수 있다. 그리고 6주 이상의 이환기간을 가지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만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원인 불명의 특발성으로 경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4,5).
양방에서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효과는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6).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가 1차 약물 치료이고, 2-4주 간격으로 증상이 지속될 시 표준 용량의 4배까지 증량이 가능하다. 고용량의 H1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omalizumab이나 cyclosporine을 추가 치료로 권장할 수 있다7).
한방에서는 두드러기를 癮疹, 風疹塊, 蕁麻疹, 風痧, 風塊癮疹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8), 風寒型, 風熱型, 風濕型, 脾胃型, 血熱型, 血瘀型, 腸胃濕熱型 등으로 원인과 증상에 맞추어 구분하고, 祛風散寒, 淸熱, 健脾勝濕, 袪風止痛, 凉血淸熱 하여 치료한다9). 국내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급·만성 두드러기에는 茵蔯蒿湯, 大黃黃蓮瀉心湯, 黃蓮湯, 大柴胡湯, 葛根湯, 梔子大黃豉湯, 小柴胡湯10), 加味升麻葛根湯9) 加減仙防敗毒湯11), 加減通淸散12) 등의 淸熱藥, 解表藥 위주의 처방을 사용하여 치료해왔다.
본 증례는 2019년 10월에 증상이 시작되어서 양방 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1례에 대한 보고이다. 현재까지 緩下劑인 調胃承氣湯 加減方을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사용한 증례보고는 없었고, 단독 한의치료를 시행한 결과 효과적인 양상을 보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증례는 2021년 4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한의원에 내원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증례 보고로서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WS-2022-21).
Greaves13)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항히스타민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UAS를 이용하여 환자를 평가하였다. 이는 소양증과 팽진의 발생빈도를 4point score(0-3)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팽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 24시간 동안 총 발생 개수가 20개 미만 시 1점, 20개 이상 50개 이하일 경우를 2점, 50개 초과이거나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를 3점으로 채점하였다. 소양증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0점, 소양증이 존재하나 신경쓰이지 않을 때를 1점, 소양증이 신경쓰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하지 않을 때를 2점, 소양증으로 일생상활의 불편함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할 때를 3점으로 매기도록 하였다. 증례 환자는 본원 내원 1달 전부터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중지한 상태였으므로, 항히스타민 복용 빈도에 대한 항목은 추가로 평가하지 않았다(Table 1).
Ⅲ. 증 례
-
1) 환자 : 김OO (M/42)
-
2) 주소증 : 엉덩이, 골반, 등 위쪽,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구진성 두드러기와 중등도 이상의 소양감을 호소
-
3) 발병일 : 2019년 10월경
-
4) 치료기간 : 2021년 4월 12일 – 2021년 10월 20일
-
5) 과거력 및 가족력 : 별무
-
6) 현병력
상기 환자는 직업상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42세의 남환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우측 골반을 중심으로 구진성 병변, 소양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 발병 이후, 3곳의 피부과를 방문하여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단받고, 항히스타민제와 주사, 연고제 등의 치료를 받았음. 그러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좌측 상부 승모근, 엉덩이, 우측 팔꿈치 등으로 두드러기의 부위와 횟수가 증가하는 상태로 2021년 4월 12일에 본원을 내원함.
-
7) 望聞問切
환자는 본원을 내원하기 전에 3곳의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 및 외용 양약 제제로 치료한 병력이 있으나 큰 호전이 없었으며, 본원 내원 시에는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1달 이상 중지하고, 외용 연고제와 알로에만 발랐던 상태로, 양약 연고제 유지로 인해 얻는 치료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한의 단독 치료를 시행하였다.
본 환자는 체지방률 28.7%의 습담한 체형으로, 홍반, 구진성 두드러기를 주증으로, 상열감, 대변곤란, 식후 창만 등을 호소하여 陽明腑實證으로 변증하여 調胃承氣湯을 기본방으로 하고, 추가로 소화기 증상을 해결하고자 黃連湯을 합하여 調胃承氣湯 合 黃連湯 加減方을 처방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재들을 가감하였다.
각 처방은 《傷寒論》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Table 2), 하루에 2회(1회당 110㏄)씩 2021년 4월 12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복용하였다.
-
① 호침 : 호침은 stainless steel 호침(동방침구제작소, 대한민국)을 사용하였으며, 인체 전면부 혈위에는 0.2×30㎜, 후면부 혈위에는 0.25×30㎜, 둔부에는 0.25×60㎜를 사용하였다. 1회 시술당 전면부 10분, 후면부 10분 총 20분간 유침하였으며, 별도의 수기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전면부에선 百會(GV20), 率谷(GB8), 曲池(LI11), 合谷(LI4), 外關(TE5), 足三里(ST36), 豊隆(ST40)을, 후면부에선 風府(GV16), 風池(GB20), 大椎(GV14), 肺兪(BL13), 腎兪(BL23), 둔부에선 環跳(GB30)에 자침하였다.
-
② 전침 : 침 치료 시행 시 같이 시행하였으며, 침전기자극기(스트라텍,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兩側 風池(GB20), 身柱(GV12)-至陽(GV9)에 시행하였다.
-
③ 약침 : 黃連解毒湯 약침(자생원외탕전원)을 30guage, 1㎖ 주입기를 이용하여 환부와 환부 주위 督脈에 1㏄ 피내주입하였다. 환자 내원 시마다 약침 시술을 하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환자는 엉덩이, 골반, 등 위쪽, 오른쪽 팔꿈치에 구진성 양상의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초진 시 UAS는 6점이었다. 치료 시작 이후 구진 양상은 빠르게 호전되어 1주일 후 24시간 동안 소양감과 두드러기가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에 허리띠 라인을 따라 압박성, 열성 양상의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둔부에도 구진성 두드러기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육안적으로 보이는 팽진이나 소양감이 내원 전보다 적었고, UAS가 0점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 종료 시점에는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으며, 이후 2022년 2월 4일까지 follow-up한 결과 재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
① 2021년 4월 12일
내원 당시 엉덩이, 골반, 등 위쪽, 우측 팔에 소양 감을 동반한 홍반, 두드러기가 있었음. 소양감이 심해 잠들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변은 3일에 1번 보는 정도로, 잔변감이 있음.
-
② 2021년 5월 3일
어제부터 허리띠 라인을 따라 소양감이 있으나, 수면에 지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압박성, 열성 양상의 두드러기도 골반 쪽을 중심으로 조금 올라왔음. 이외에도 왼쪽 팔꿈치 쪽에 수포발진이 몇 개 나타남.
-
③ 2021년 5월 14일
최근 3일 동안 두드러기가 올라온 것이 없었으며, 초진 시 구진성 두드러기가 있었던 엉덩이 부위에 약간의 착색이 생겼음. 그 이외 환부의 피부 발적감은 더 호전됨. 변은 2일 1번 보는 정도로, 잔변감이 덜하다고 함.
-
④ 2021년 7월 22일
한약 복용을 중지한지 10일째 되는 날로, 엉덩이 한 부위에 구진의 양상이 아닌 약간의 발적이 나타났고, 가려울 듯 말 듯 한 정도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소양감을 호소하였음. 오른쪽 팔꿈치에 약간의 착색이 보이고, 엉덩이 부위에 있던 착색의 범위는 줄어들었음. 대변은 한약처방을 중지하였지만, 한약 중지 직전과 같이 1일 1번 본다고 함.
-
⑤ 2021년 10월 20일
5일 전, 왼쪽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부위에 조그맣게 구진성 양상이 올라왔으나, 긁을 정도로 가렵지 않으며, 스스로 가라앉았다고 함. 내원 당시에는 구진성 병변도, 소양감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난 한 달간 환자가 두드러기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함. 여전히 엉덩이와 오른쪽 팔꿈치의 착색은 남아있으나, 색이 더욱 옅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것임을 지도하고 치료를 종료하였음. 한약 투약을 중지한 후, 치료 종료까지 변비를 호소하신 적은 없었음.
Ⅳ. 고 찰
본 환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이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70-80%에 해당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4). 또한 두드러기는 난치성 질병 중 하나이며, 재발이 잦으므로 한방의 개인 체질을 고려한 辨證施治가 원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과체중(170㎝, 71.2㎏)의 체형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엉덩이, 골반, 등 위쪽,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구진성 두드러기와 소양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최초 발병일은 2019년 10월경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총 3곳의 피부과에 내원하여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해왔지만 호전이 없고 병변 부위가 확장되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해당 환자의 경우 구진성 두드러기를 비롯한 홍반이 병변 부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발진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
본 환자는 상열감, 대변곤란, 식후 창만을 동반한 습담한 체질로, ‘大便秘結, 脘腹痞滿, 腹痛拒安’의 陽明腑實證으로 변증하여 調胃承氣湯를 기본방으로 하였고, 腸胃不和 및 습과 열로 인해 두드러기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調胃承氣湯 合 黃連湯 加減方을 처방하였다.
調胃承氣湯은 《傷寒論》에 최초로 기록된 처방으로 大黃, 芒硝, 甘草로 구성되어 陽明腑實證을 치료하는 緩下劑이다. 大黃·芒硝를 사용하였지만 大承氣湯에 비해 瀉下시키는 힘이 비교적 약하며 甘草와 配伍하여 더욱 大黃ㆍ芒硝의 瀉下하는 성질이 완화되고, 胃腸에 머물면서 瀉熱潤燥하는 작용이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16). 黃連湯은 淸熱燥濕하는 黃連을 군약으로 한 처방으로, 《藥徵》에 따르면 “治心煩 心下痞硬 上衝 欲嘔吐者”라 하여 煩을 내리는 작용이 있으며, 임상에서는 복통, 위염 등의 소화기 장애와 불면,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17). 이에 두 처방을 합방하여 변비, 소화적체로 인한 濕을 제거하며 熱을 내리고, 心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消腫解毒 작용으로 痒疹, 癤腫에 사용하는18) 樺皮를 加하였으며, 환자의 脈虛를 개선하기 위해 補氣血 및 壯元陽하는 鹿茸을 加하여 처방을 구성하였으며, 처방 구성이 溫性으로 치우쳐 환자의 상열감을 높일 것을 우려하여 桂枝를 去하는 것을 기본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하였다.
침 치료는 百會(GV20), 率谷(GB8), 曲池(LI11), 合谷(LI4), 外關(TE5), 足三里(ST36), 豊隆(ST40), 風府(GV16), 風池(GB20), 大椎(GV14), 肺兪(BL13), 腎兪(BL23), 環跳(GB30)에 자침하였으며, 淸熱解毒작용이 있어 두통, 불면, 화병 등의 제반 火熱證에 효과가 있는 黃連解毒湯 약침을 사용하여 환자의 소양감 완화와 상열감을 내릴 목적으로 하였다19). 이외에도 가벼운 조사로 광범위한 병원체 박멸 효과가 있는 PDT를 통해 소양감과 반복되는 긁음으로 인한 환부의 피부 발적 및 2차 감염을 예방하였다20).
치료 기간 동안 소양감 및 구진성 병변의 발생 빈도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지만 6개월 동안 꾸준한 치료를 통해 UAS 0점(2021년 10월 20일)으로 종결하였다. 또한 대변은 1주에 3-4회로 정상에 가깝게 호전되었고, 소화기능 또한 개선되었다. 이후 2022년 2월 4일까지 추적 관찰하였으나 재발은 확인되지 않았다. 6개월의 치료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나, 치료의 초기에 명확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 환자와 rapport 형성이 잘 되어 꾸준한 내원이 가능했다. 또한 치료 기간 및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은 없었다.
본 연구는 소화불량과 변비를 동반한 만성 두드러기를 한방 단독 치료를 통해 호전시켰으며, 특히 항히스타민제와 외용 양약 제제로 치료되지 않았던 환자의 증상이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증례의 환자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복부에 열이 쌓여 변비가 생겼고, 몸에 쌓인 열이 상부에 올라가 상열감과 피부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調胃承氣湯으로 대변을 빼냄으로써 열을 풀어 만성 두드러기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를 통해 소화기 증상 및 변비를 동반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調胃承氣湯 加減方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기 제한적인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자연 호전이 병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약 치료 이외에 여러 한의 치료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단일 증례이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