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서양의학의 발달과 신약의 발전, 다양한 제형의 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부 외용제가 피부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한방 외용제는 제형의 다변화, 제품 개발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 증가와 내성 세균에 의한 중증 감염질환이 21세기의 주요 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피부 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항염증작용, 면역 억제 작용 외에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피부위축을 초래하고 면역 억제 작용에 따른 세균 및 진균감염을 초래하여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위축, 혈관확장, 색소 탈실 및 팽창 선조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1,2). 송 등3)의 “피부 외용제에 의한 부작용 사례 연구”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구기간 동안 전국의 피부과 31개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 중 피부 외용제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1,257건으로 이 중 부작용의 빈도가 가장 많았던 외용제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로 전체 외용제 부작용 사례의 약 83%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함께, 한약 치료로 인한 스테로이드 부작용 증상 개선 사례에 대한 보고4)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한방 외용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金匱要略》은 서문에 林億 등이 “嘗以方證對者 施之於人 其效若神5)”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최근 중국의 경방가들과 일본의 고방가들, 한국의 여러 임상 의가들에 의해서 임상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후세에 많은 방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 처방들의 祖方이 되었다. 《金匱要略》은 특히 내치약을 임상에서 많이 응용한다.
하지만 《金匱要略》에는 내치약 뿐만 아니라 외용제도 다수 기술되어 있다. 《金匱要略》 시대에 외용제는 종창 피부 질환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金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료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가 《金匱要略》에 기술되어 있다. 《金匱要略》에서 외용제는 내치약과 함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항생제 등의 부족으로 인한 감염질환이 많던 시절에 단용으로도 실제 질환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金匱要略》의 외용제는 고대 시대의 외용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한의학 외용제의 개발 및 임상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金匱要略》 외용제 연구는 한의사의 임상 현실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金匱要略》 외용제에 대한 박 등6)의 연구에서는 《金匱要略》 외용제의 질환에 대한 분류, 제형, 시술법, 처방의 수, 본초의 분류 등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金匱要略》 외치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현대적 응용 방법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하고, 독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Wan 등7)의 연구는 《金匱要略》에 대한 방해가 잘 이루어졌지만, 현대 약리학적 해석이 없으며 현대 제형에 대한 고찰, 독성에 대한 연구는 역시 제시하지 않아서 연구를 임상에서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金匱要略》 외용제의 경우 독성 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헌 연구를 통한 《金匱要略》 외용제의 약리작용, 현대적 제법, 현대적 제형, 독성을 실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金匱要略》 외용제의 본문 및 처방 구성을 분석하고 제법 제형 독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金匱要略》 외용제의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明 趙開美가 復刻한 《金匱要略》5)을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25편 중 後人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마지막 雜療方 3편8)을 제외한 22편에 수록된 처방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Ⅲ. 결 과
《金匱要略》 외용제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金匱要略》에 수록된 처방은 205종(25편 중 雜療方 이하 3편을 제외)이며9) 그중 외용제는 白合洗方, 苦參湯, 雄黃 등을 포함한 11종으로 이 처방들에 대한 《金匱要略》의 본문과 구성 약물, 기술된 제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金匱要略》에 수록된 전체 205종 처방 중 약 5.36%를 차지한다(Fig. 1,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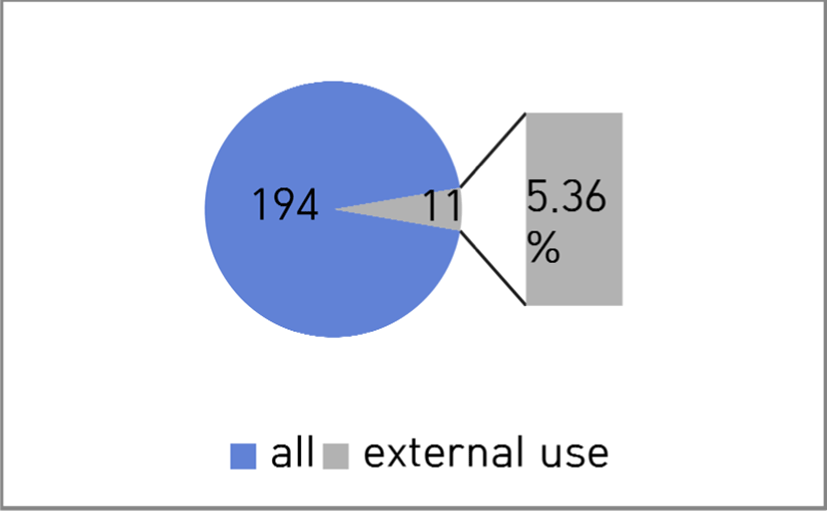
《金匱要略》에 외치 요법이 응용된 질환은 12종으로6) 다음과 같다. 내과 질환 3종(심혈관계 질환 1종, 신경계 질환 1종, 자가면역계 질환 1종), 신경정신과 질환 1종, 외과 질환 1종, 피부과 질환 1종, 부인과 질환 5종, 치과 질환 1종이다. 《金匱要略》에 외치 요법이 응용된 질환과 구체적 질병명, KCD8 질병코드와 빈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2).
《金匱要略》에 수록된 205개의 처방 중 사용된 한약재의 수(25편 雜療方 3편을 제외)는 156가지이며9), 그 중 외용제의 사용된 한약재는 23(槐枝 포함 시 24)가지이다. 식물성 약물은 18종(白粉을 쌀가루로 보면 19종)이며 동물성 약물은 2종, 광물성 약물은 3종(白粉을 鉛粉으로 보면 4종)이며 이중 독성 약물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3). 특히 독성이 심한 약물은 雄黃이나 鉛粉 등이며 주의를 요한다. 반고형제제나 환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약물은 猪脂, 蜜이 있다. 재료로 사용되었으나 외용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물질은 槐枝가 있다.
《金匱要略》에 수록된 외용제 11개(25편 雜療方이후 3편을 제외) 중 單味製劑는 6개(黃連粉)을 單味로 하면 7개) 2개의 약재로 구성된 二味製劑는 4개(黃連粉)을 單味로 하면 3개) 複合製劑은 1개이다(Table 4).
| Prescription | |
|---|---|
| Single Flavor(單味) | 百合洗方 苦參湯 雄黃 礬石湯 蛇床子散 狼牙湯 <黃連粉> |
| Two Flavors(二味) | 頭風摩散 礬石丸 小兒疳蟲蝕齒方 <黃連粉> |
| Combination Formulation(複合製劑) | 王不留行散 |
《金匱要略》에서는 洗瀝熏摩侵敷坐烙法의 8법을 임상에서 응용하였다. 洗法은 2번, 瀝法은 1번, 熏法은 2번, 摩法은 1번 侵法은 1번, 敷法은 2번, 坐法은 2번, 烙法은 1번 사용하였다. 《金匱要略》 외치법 중 시술법의 횟수와 처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Table 5).
《金匱要略》의 외용약제 중 散劑는 5종이며 膏劑는 1종 湯劑는 4종 丸劑는 1종이다. 《金匱要略》의 외용제의 제형을 정리한 표이다(Table 6). 또한, 현대 제형에 따라 분류를 하면 아래 표와 같다(Table 7).
| Prescription | |
|---|---|
| Powder(散) | Realgar(雄黃) 頭風摩散 王不留行散 黃連粉 蛇床子散 |
| Paste Ointment(膏) | 小兒疳蟲蝕齒方 |
| Decoction(湯) | 百合洗方 苦參湯 礬石湯 狼牙湯 |
| Pill(丸) | 礬石丸 |
| Prescription | |
|---|---|
| Powder Formulation | 雄黃 頭風摩散 王不留行散 黃連粉 |
| Liquid Formulation | 百合洗方 苦參湯 礬石湯 狼牙湯 |
| Suppository | 礬石丸 蛇床子散 |
| Semi-Solid Formulation | 小兒疳蟲蝕齒方 |
Ⅳ. 고 찰
《金匱要略》에 기술된 외용제는 百合洗方, 苦蔘湯, 雄黃, 頭風摩散方, 礬石湯, 王不留行散, 黃連粉, 礬石丸, 蛇床子散, 狼牙湯方, 小兒疳蟲蝕齒方 11종이다.
百合洗方은 百合 單味로 구성된 처방이다. 百合病이 낫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되어 갈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응용한다. 百合病이 무엇인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설이 있다. 먼저 百合이 百合病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百脈이 모두 병이 걸리기 때문에 百合病이라고 한다는 설이다. 세 번째는 百合이 房失過度를 의미한다는 설이다10). 百合洗 方은 洗法을 사용하였다. 洗法은 洗滌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약재를 우려낸 물로 환부를 씻어내는 방법11)을 말한다. 따라서 百合洗方은 百合을 漬하여 액상형의 약액을 추출한다. 百合은 甘潤하여 補하고 苦寒한 性味는 淸熱시키는 효능이 있다12). 百合은 약리학적으로는 stigmasterol과 β-daucosterol 등이 작용을 하며, 그중 stigmasterol은 기침을 완화하고,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이런 현대 약리 내용은 百合洗方의 약리작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대 약리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외치법을 병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陳紀番은 “내복하는 약만을 사용하면 약력이 부족하여 큰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지만 내복하는 탕액을 기초로 하고 다시 본방을 외치하여 內外를 모두 施治하여 함께 養陰淸熱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였다14). 이 내용을 비추어볼 때 洗法으로 外治하는 것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百合洗方을 응용 시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임산부의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산부가 teratogenesis 작용이 있는 양방 약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胚胎와 태아에 대한 독성작용을 증강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5).
苦蔘湯은 苦蔘 單味로 구성된 처방이다. 狐惑病으로 인해 발생한 蝕於下部한 것을 치료한다. 狐惑病에 대해 陳修園의 《金匱要略淺注》에서는 “狐惑、蟲病”라 하였으며16), 《醫宗金鑑》에서 吳謙은 “狐惑 牙疳下疳等瘡之古名也 近時惟以疳呼之”이라 하였다17). 현대로 넘어오면서 狐惑病은 ‘베체트병(Behcet’s disease)과 유사’한 것으로 많이 인식되는데, 口·目·舌·咽喉 및 前後二陰이 潰爛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8). 苦蔘湯은 熏洗法을 사용하였다. 洗法은 특정 약재를 우려낸 물로 환부를 씻어내는 방법이며, 熏法은 특정 약재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환부에 쏘이는 방법이다11). 苦蔘湯은 煎하여 응용해야 함으로 현대적으로는 탕제로 만들어 훈증기로 熏하며 물에 희석하여 洗하는 방법을 응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苦蔘은 味苦性寒하여 燥濕淸熱하는 효능이 있으며 또한 去風 殺蟲하여 止痒하는 효능이 있다12)고 알려져 있다. 苦蔘에 있는 케르세틴(Quercetin)은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이며, Azoxymethane/Dextran sodium sulfate(AOM/DSS)로 인한 발암 진행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또한, dehydromiltirone은 LPS로 유도된 Kupffer 세포에서 p38 및 NF-κB 신호 전달 경로를 시작하는 항염증 화합물이다. 또한 루테올린(Luteolin)이 Nrf2/ARE, NF-κB 및 MAPK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苦蔘 추출물이 다중 성분 및 다중 표적을 통해 항염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 시험에 따르면 苦蔘의 독성과 부작용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19).
雄黃은 雄黃 單味로 구성된 처방이다. 역시 狐惑病의 蝕於肛에 응용하는 처방이다. 雄黃은 熏法을 사용하는데, 熏法이란 특정 약재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환부에 쏘이는 방법이다11). 雄黃熏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이문은 “前陰과 항문은 모두 가장 아래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까지 미칠 수 없으므로 熏法의 방법을 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4). 筒瓦란 대롱과 같이 둥글고 긴 반원형의 기와인데 속이 빈 두 개를 합하여 안에 넣어서14)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약재를 잘 薰할 수 있고 연기가 항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雄黃을 보관 유통하기 위해서는 雄黃을 散劑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적합해 보이며, 본문 역시 “一味爲末”한다고 하였다. 雄黃은 辛溫有毒하고 解毒작용이 비교적 강하며 피부의 개선충을 살충시키므로 외과의 要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12). 약리학적으로는 雄黃의 주요 성분은 비소제제로 AS2S2가 주요 성분이다. 서양에서 19세기에는 비소 및 비소염은 방부제, 진경제, 조혈제, 진정제, 궤양 및 암 치료제의 핵심 성분으로 응용하였다. 파울러 용액(1% 아비산칼륨)과 같은 비소제제를 백혈병, 호지킨병, 악성 빈혈과 같은 악성 질병 및 건선, 천포창, 습진 및 천식과 같은 질병의 치료에 많은 의사들이 사용했다. 현대에는 비소제제는 항종양제에 응용한다20). 雄黃은 AS2S2를 함유하고 있는데 고온에서 煆하거나 삶는 과정 중에 AS2O3를 발생시킬 수 있다21). 따라서 《金匱要略》에서 사용한 훈증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내재한 치료법이다. “雄黃이 불을 만나면 독이 비상과 같다.”라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왔다21). 따라서 熏法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頭風摩散方은 頭風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다. 《金匱要略》에서 頭風을 어떤 증상으로 인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東醫寶鑑》에서는 頭風을 ‘목에서부터 귀, 눈, 입, 코, 이마까지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증상’과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며 머리의 피부가 뻣뻣해서 감각을 모르고 입과 혀가 잘 놀려지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발작할 때 통증이 있어서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려고 하는 증상’이라고도 하였다22). 따라서 頭風은 가볍게는 편두통의 양상부터 심한 경우는 중풍으로 인한 감각마비의 증상을 아울러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頭風摩散方은 二味之劑로 大附子 一枚와 炮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鹽炮附子가 시중에 유통되므로 鹽炮附子를 갈아서 散劑로 만들어 응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附子는 辛熱燥熱하여 溫裏 扶陽 去寒의 要藥으로 알려져 있으며, 回陽補火 散寒除濕 하는 효능을 가진다12). 鹽은 소금으로 性味가 鹹寒하여 淸하여 하강시키는 효능을 가진다23). 附子에 있는 Aconitine에 의한 중추 진통 작용은 noradrenaline(NE) 신경계와 관련이 있으며 noradrenaline(NE)의 uptake를 억제한다. 또한 附子의 포제 방법에 의한 Aconitine의 함량이 鹽附子로 만들 경우 生附子보다 약 10배 정도 함량이 낮지만, 진통 작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되어 있다24). 摩法은 밖에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內治하기 어렵고 마찰하여 자극을 주고자 할 때 응용하는 방법이다. 頭風摩散의 경우 陳修園은 “內服하면 그 火를 助할 우려가 있으니 火가 動하여 風이 더욱 그 勢를 乘한다. 때문에 外摩의 법을 쓴다.”고 본 방에서 摩法을 사용하는 의의를 기술하였다16). 摩法의 경우 內治法에 비하여 효과가 약하여 보조적 요법으로 많이 응용한다. 하지만 실제 頭風摩散과 補陽還五湯을 중풍 후유증에 쓴 증례에서 補陽還五湯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대조군(83.87%)보다 頭風摩散의 摩法을 같이 사용한 실험군(總有效率95.24%)에서 보다 높은 치료율을 보였듯이25) 내치 치료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附子의 주요 독성은 Aconitine의 독성이다. Aconitine의 독성은 주로 신경계에서 나타나는데, 부교감 신경과 감각신경을 흥분시킨 다음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附子 중독의 경우 전신 경련, 오심, 구토 등에 이어 현기증, 동계, 저혈압, 냉기를 견디지 못하는 증상, 혼수 양태가 나타난다. 심전도에서는 빈맥, 심근의 진전, AV block 및 심근 손상이 나타난다. Aconitine은 직접적으로 심근에 작용하여 부정맥을 야기하기도 하고, 鹽附子로 만들 경우 Aconitine의 용량을 生附子의 1/10정도로 낮출 수 있으며24) 이런 결과로 인해 독성이 낮아진다고 사료된다. 또한 摩法을 사용할 경우 內服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양상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에서 鹽附子를 사용하여 摩法을 응용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소금의 淸하고 하강하는 능력과 소금의 附子를 制毒하는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礬石湯은 脚氣衝心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다. 脚氣가 지금 Vit. B1 부족으로 인한 각기(Beriberi)와 같은지는 불분명하다. 氣上衝心에 대하여 《景岳全書》26)도 《金匱要略》의 “脚氣衝心”이 고대에는 없었고, 후대에 삽입된 문장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脚氣의 증상이 다리에 마비, 냉감, 위약, 경련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기가 심장으로 상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亦能殺人”이라 하여 매우 위중한 증세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Vit. B1의 부족으로 인한 각기(Beriberi)는 일차적으로는 심혈관계 증상, 심장비대, 빈맥, 심박출량의 증가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증, 말초정맥 울혈, 말초신경염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현대적으로 보기에도 각기에 의한 심부전(Heart Failure from Beriberi)과도 증상이 비슷해 보인다27). 礬石湯은 礬石 즉 白礬 單味로 구성된 처방이며 浸法을 응용한다. 浸法은 탕액에 환부를 담구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洗法과 비슷하다. 漿水에 白礬粉末을 넣고 3-5차례 끓을 정도로 달여서 약액을 만든다. 따라서 임상에서 白礬은 결정이거나 가루 형태로 보관 유통한다. 또한 약액으로 만들어 유통할 수도 있다. 白礬은 味酸氣寒하고 性이 수렴하며 외용하면 燥濕止痒시키는 효능을 가진다12). 白礬은 KAl(SO4)2 ·12H2O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변형균(bacillus proteus), 대장균, 녹농균, 탄저균, 적리균, 장티푸스균, 파라디푸스균 녹색연쇄상구균 용혈성 연쇄구균, 폐렴구균, 디프테리아균 등에 대한 향균작용, 항트리코모나스 작용, 수렴 작용 등이 있다28). 白礬의 경우 外用으로 사용 시 대체로 안전하지만 《中藥及其製劑不良反應大典》에 따르면 “외용하면 약용 부위에 痛痒이 심해지고 水腫이 있으며 표피에는 점상의 탈락 삼액이 있으며 手指 및 手掌에는 좁쌀 크기의 황색 구진이 출현한다.”라고 하였다29).
王不留行散은 《金匱要略》 외용제 중 유일한 복합제제로 9味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대다수의 외용제가 單味 혹은 二味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王不留行散은 후세에 補入된 처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 등3)은 王不留行散에 대해 胡庚辰, 陳紀番의 의견을 인용하여 “후인들의 附方”라고 하였다. 王不留行散은 金瘡을 치료하는 약이다. 金瘡이란 칼 등으로 다쳐서 발생한 질환31)을 가리킨다. 강 등32)은, “파상풍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출물이 많지 않고, 상처가 작은 경우에 王不留行散 粉劑를 사용하면 지혈, 진통 효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王不留行散은 《金匱要略》에 나타난 대다수의 외치약과 다르게 內治와 外治를 같이 할 수 있는 처방이다. 원문의 제법에서는 “상처가 작으면 분말로 외용하고, 상처가 심하면 복용만하라.”고 하였다. 王不留行散의 효능에 대해 陳修園은 “王不留行은 通利血脈하고, 蒴藋는 通利氣血하고, 桑根白皮는 利肺氣하고, 甘草는 解毒和營하고, 川椒와 乾薑은 胸中之陽을 養하고, 厚朴은 內結한 기를 소통시키며, 黃芩 芍藥은 陰分의 熱을 淸한다.”라고 하였다16). 또한 현대 약리 연구에서 王不留行은 메탄올 추출물의 헥산 및 부탄올 분획과 일성 성분들은 5-LOX 저해를 통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24). 王不留行散은 敷法을 응용한다. 敷法은 약을 敷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대의 드레싱 요법과 거의 비슷하다. 敷法을 응용하기 위해 고대에는 散劑의 형태로 약물을 보존하며 작은 상처의 치료 시 敷包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散劑를 뿌리거나 바르고 敷包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현대적 제형을 변형하고 임상에서 응용할 경우 반고형제제(첩부제(plasters)나 카타플라스마제(cataplasms))로 만들면 실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王不留行에 대한 특별한 독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
黃連粉은 浸淫瘡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처방이다. 浸淫瘡에 대하여 《金匱要略》은 점차 퍼지는 병으로 인식하였다. 강 등은, “서양의학의 습진 농포창 등의 수포성 질환이나 습진형 아토피” 유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32). 黃連粉의 처방내용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처방 목적에 의거하여 黃連 單味 또는 黃連 甘草 二味로 추측하고 있다. 尤在經은 “黃連 一味를 가루 내어 뿌린다.”고 주장하였으며32), 《桂林古本》에 따르면 “黃連粉方 黃連 10分 甘草 10分 右二味를 분말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33). 黃連은 性味가 大苦大寒하며 大寒은 淸熱하고 苦味는 燥濕하여 瀉火燥濕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12). 甘草는 性味가 甘平하며 癰疽瘡毒을 치료하며12), 성분 중 glycyrrhetic acid는 항염증의 작용이 있어서30) 浸淫瘡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黃連의 주성분은 berberine으로, berberine은 항염 작용이 있으며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의 신호 전달과 세포 활성 산소(cellular active oxygen) 생성을 억제하여 전-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黃連粉은 敷法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敷法은 약을 敷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대의 드레싱 요법과 거의 비슷한데, 黃連가루나 黃連, 甘草가루 분말을 뿌리고 드레싱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역시 현대적 제형을 변형하면 보다 실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黃連의 독성은 주로 berberine이지만 독성 메커니즘은 복잡할 수 있다. 현재 권장되는 黃連 알칼로이드 및 黃連 소비량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單用 투여 대신 일반적으로 독성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약과 함께 처방된다35). 이런 방법이 안전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처방의 경우 甘草를 넣어 응용하는 것이 單用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礬石丸은 “婦人經水閉不利(폐경 양상)”, “藏堅癖不止(자궁 안에 뭉친 덩어리가 있는 것)”, “下白物(백대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다36). 礬石丸은 二味劑이다. 礬石 杏仁 2가지 약재를 가루 내어 정제된 꿀로 대추씨만한 크기의 환을 만들어 子臟 안으로 넣는다. 현대의 질 좌약과 거의 비슷하다. 白礬은 味酸氣寒하고 性이 수렴하며 외용하면 燥濕止痒시키는 효능을 가진다12). 杏仁은 性味가 苦하고 潤하여 기를 이롭게 하여 건조한 것을 치료한다36). 白蜜도 性이 平하고 味가 甘하여 滋養緩和시키는 효능이 있으며12),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36). 세 가지 약물이 합쳐지면 열을 내려 습을 없애고, 대하를 멈추게 하며, 살충하여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36). 白礬의 경우 외용으로 사용 시 대체로 안전하지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29).
蛇床子散는 《金匱要略》에 명확한 주치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脈經》에서 “婦人陰寒”에 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37). 婦人陰寒은 음부가 차가운 것을 말한다. 蛇床子散은 蛇床子를 가루 내어 白粉을 조금 섞은 二味劑로 散劑이며, 溫陰中하기 위한 坐藥이다. 蛇床子는 性味가 辛溫하여 散寒하고 助陽하며 苦燥하여 除濕시키므로 止痒시키는 효능이 있다. 외용하면 燥濕殺蟲시키는 효능이 있어 陰痒帶下를 치료한다12). 白粉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李克光 主編의 《金匱要略》에서는 “趙以德 같은 경우는 ‘白粉은 米粉 쌀가루’라고 주장하였고. 《藥微》에서는 ‘白粉은 鉛粉이고 지금의 胡粉이다.’라고 하였다. 白粉이 어떤 약물인지 지금까지 정론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금 사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鉛粉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36). 또한 白礬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3). 鉛粉은 性味가 辛寒有毒하고 質이 重하여 散劑나 膏藥에 넣어 외과질환에 적용하는 주요한 약재로, 식물성유를 조화하여 膏藥을 만들어 外貼하면 拔毒 收斂生肌의 작용이 비교적 양호하고 瘡瘍腫毒이 未潰하였을 때는 膿潰消腫하고 이미 膿潰하였을 때는 拔毒生肌하므로 외과에 상용하는 약물이다12). 白礬은 味酸氣寒하고 性이 수렴하며 외용하면 燥濕止痒키는 효능을 가진다12). 鉛粉으로 蛇床子散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 사용 시 납중독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납중독은 60-80μmol/L 이상의 급성중독의 경우 신경전달 장애와 신경 세포 괴사를 일으키며 80-120μmol/L 이상의 고농도 노출은 경련이나 혼수를 동반한 급성 뇌병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蛇床子散 등의 외용제 사용 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만성 무증상성 납중독으로 40μmol/L 이하이지만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빈혈, 탈수초성 말초신경병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7). 따라서 독성이 강한 鉛粉을 응용하는 방법보다는 白礬이나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
狼牙湯方은 單味劑로 陰中蝕瘡爛을 치료하기 위해 狼牙를 사용한다. 陰中蝕瘡爛은 음부에 종기가 나서 헐고 문드러지는 데까지 이른 상태이다, 浸湯瀝陰中하는 방법은 瀝法을 사용한다. 瀝法은 세척법의 일종으로 洗法이 특정약재를 우려낸 물로 환부를 씻어내는 방법11)인데 반해 瀝法은 씻어내는 대신 탕액을 방울처럼 환부에 떨어뜨려 사용하는 시술법이다. 洗法안에 瀝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제형과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 현대적으로는 탕액을 추출하거나 증류하여, 점안액의 형태로 제형을 만들어 응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狼牙는 仙鶴草의 冬芽로 條蟲病(촌충으로 발생한 병)과 트리코모나스질염 등에 적용하여 양호한 치료 효과가 있다12)고 알려져 있다. 陳修園은 “狼牙草는 味가 酸苦하여 邪熱氣 疥瘙惡瘡을 除하고 白蟲을 去하기 때문에 取治한다.”고 하였다16). 仙鶴草는 狼牙의 전초로 性味가 苦澁하고 平하며 오로지 收斂止血하는 효능이 있다12). 仙鶴草 및 함유 성분 중 agrimophol은 촌충 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질염을 유발하는 Trichomonas vaginalis에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24). 狼牙의 경우 복용을 하면 안 되고 외용해야 한다. 狼牙의 경우 agrimopholum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전분이나 extract(extractum)를 복용 시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중하면 頭暈, 面色潮紅, 大汗淋漓를 나타내며, 또 狼牙의 extract (extractum)를 복용하면 中毒性 球後視神經炎(retrobulbar neuritis, orbital optic neuritis)을 나타내어 실명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5).
小兒疳蟲蝕齒方는 소아가 疳으로 蟲蝕齒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疳病은 마르는 병이다38). 二味로 구성된 처방으로 烙法을 사용한다. 烙法은 환부를 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현대의 레이저 치료와 비슷한 외과시술로 보인다. 雄黃, 葶藶 2가지 약재를 가루 내어 散劑로 만든 후 돼지기름을 녹인 후 섞는다. 돼지기름은 부패되지 않도록 하며 해독살충약과 함께 섞어 膏藥으로 만들 수 있게36) 만든 첨가제이다. 음력 12월에 돼지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약효가 과도하게 되는 것을 찬 성질로 막는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약성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豚脂의 경우 현대 제약기술에서 연고기제에 소수성 기제로 응용하며 보통 흰색의 연하고 부드러운 덩어리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고 주성분은 palmitic acid, stearic acid 또는 지방산의 tirglyceride이며 이외에도 다소의 수분 및 염분을 함유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보통 다른 약물과 혼화가 용이하며 피부로부터 흡수성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공기나 열, 습기 등 외부 환경에 의한 변패의 가능성이 높다39). 회화나뭇가지 끝을 솜으로 싼 것 4-5개에 묻혀 환부를 지진다. 槐枝의 경우 약을 발라 烙法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약성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雄黃은 辛溫有毒하고 해독작용이 비교적 강하며 피부의 개선충을 살충시키므로 외과의 要藥이 되는 약12)이다. 葶藶은 性味가 苦寒沈降하며12) 水濕을 잘 통하게 하고36), 상기 처방에서는 通氣行血한다16). 하지만 雄黃이 들어감으로 독성에 주의를 요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雄黃에 烙法을 응용하는 경우 薰法과 마찬가지로 AS2O3를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金匱要略》 외용제 11처방은 적은 藥味로 인한 간편성과 좋은 효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현대 임상에서 잘 응용하지 않는 광물성 독성 약물 제제(雄黃, 鉛丹) 등이 《金匱要略》 외용제 11처방 중 여러 처방에 들어있고, 내복약처럼 탕제로 달여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고대의 제법과 제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약제들이 많이 있으며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현대적 형태로 제형과 제법을 변형하고 약물의 독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金匱要略》 외용제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가령 제형의 경우 苦蔘湯은 훈증기라는 현대적 도구를 이용하여 熏法을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王不留行散은 첩부제(plasters)나 카타플라스마제(cataplasms)로 만들면 실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黃連分의 경우는 분말을 뿌리고 드레싱 요법처럼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狼牙湯方은 점안액의 형태로 제형을 만드는 것이 실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頭風摩散은 ‘중풍으로 인한 감각마비’나 ‘편두통’에 鹽炮附子를 갈아서 散劑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 편의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독성에 있어서도 礬石湯, 礬石丸 같은 경우 국소 부위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蛇床子散을 사용할 때, 鉛粉을 응용하는 것은 독성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蛇床子散을 임상에서 사용할 경우, 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좋다고 사료된다. 雄黃, 小兒疳蟲蝕齒方은 현대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독성에 주의하여 섬세하게 법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金匱要略》의 처방 중 외용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金匱要略》의 처방 중 외용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약 5.36%),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부인과 질환, 치과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어왔다.
-
《金匱要略》의 외용제는 洗熏摩侵敷坐瀝烙法으로 임상에서 응용되었다. 또한 散劑, 液劑, 坐劑, 기타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성을 위해 현대적 제형으로 변형하여 응용할 수 있다.
-
《金匱要略》의 외용제는 적은 藥味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하고, 간편하게 탕전 후 洗法, 熏法 등을 쓰기 용이하지만, 雄黃이나 鉛粉같이 독성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임상 한의사들이 《金匱要略》 외용제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