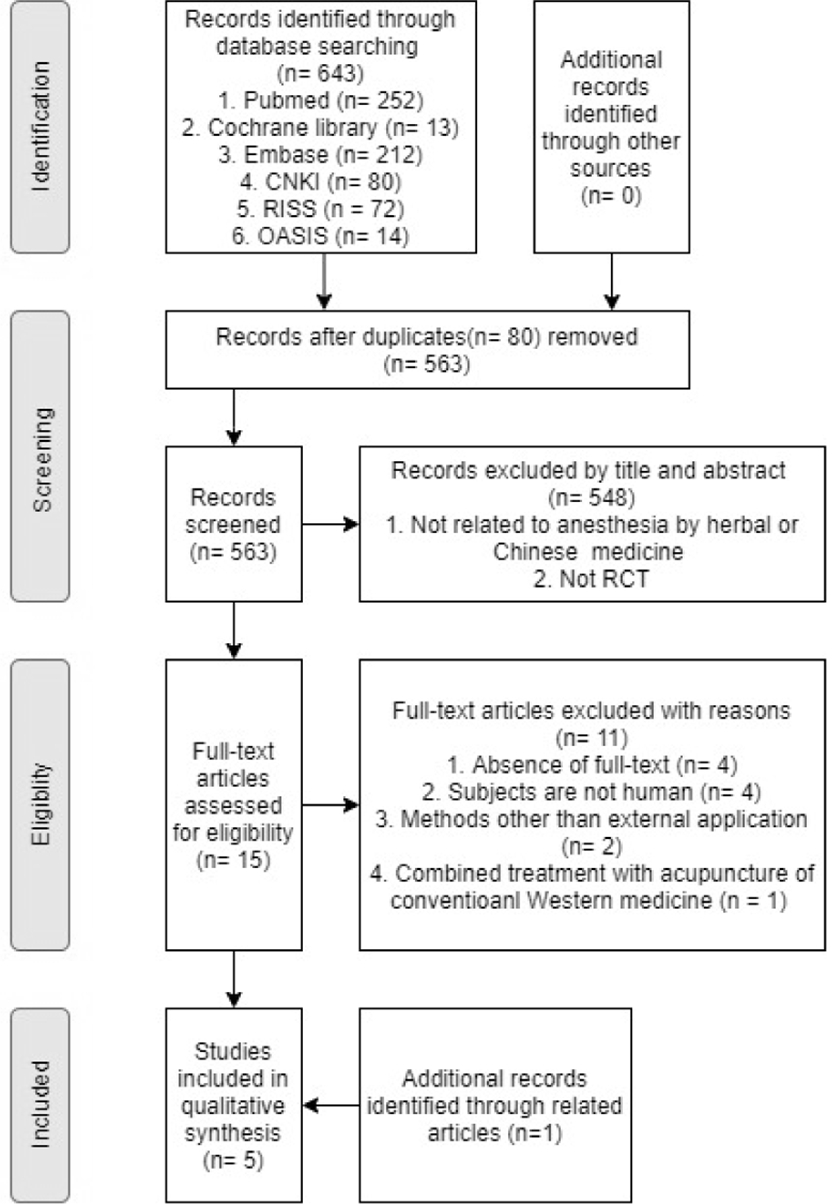Ⅰ. 서 론
한의계에서 마취를 통한 외과적 수술처치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의계 외과수술의 역사는 기원전 중국의 華佗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神醫로 불리는 華佗는 麻沸散이라는 독특한 처방을 사용하여 開胸術 및 開頭術을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華佗의 麻沸散의 경우 그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어 실제 처방 구성을 알 수 없지만, 세계 최초로 마취에 의한 수술을 집도한 1804년 일본의 華岡靑洲(1760-1835)의 경우 華佗의 麻沸散이 실재했다고 믿고 이를 복원시키도록 노력하여 수차례 임상에 활용하였다. 1796년 華岡靑洲와 同門이었던 中川修亭(1771-1850)에 의해 이루어진 《麻藥考》에는 華岡靑洲가 사용했던 처방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된 마취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류를 찾아보면 危亦林의 《世醫得效方》과 조선전기 간행된 《醫方類聚》, 이후의 《醫林撮要》, 그리고 許浚(1546-1615)의 《東醫寶鑑》에 비슷한 처방구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草烏散이라는 마취제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1).
이 외에도 한약 마취 처방 및 활용에 대한 기록은 고대 문헌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東醫寶鑑·雜病篇》에서는 骨折筋斷傷에 痲藥(草烏散)을 복용하여 통증을 없앤 후 정골법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에서는 종독으로 헌 부위를 치료할 때 瓊酥散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약을 사용하면 침으로 째도 아프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살촉 제거 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整骨麻藥의 처방 구성 및 복용법과 함께 마취를 푸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外敷麻藥을 사용하면 칼로 절개해도 아프지 않은 효능과 함께 구성 및 복용법이 수록되어 있다2,3).
한의계의 외과술은 근대에 이르러 외과술이 주를 이루는 서양의학에게 그 자리를 뺏겨 연구나 임상적 실천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한약을 마취제로 응용하거나 침술마취를 활용하여 외과적 시술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4). Chen5)에 따르면 마취 및 진통 영역에서 단일 한약제제, 처방, 경혈 자극, 침술 등의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마취 및 진통 분야에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확인하였으나, 한의학 이론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 및 서양 의학 연구 사상을 버리지 못해 한의학을 마취에 적용하는 연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섬수약침을 이용해 국소 마취 후 표피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한 사례가 발표되어 한의사가 정제된 한약 추출물을 이용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바 있다6). 이후 섬수약침은 도침시술시 순응도 향상을 위해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었다7).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 중 한약을 임상적으로 마취에 활용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논문들뿐이며 어떤 한약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취제로서 활용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한약의 마취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 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약을 마취제로 활용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들 중 우선적으로 외용 마취제로서의 한약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외용 마취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에 대해 알아보고 한의사들의 외용 마취제 사용 확대를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한약 외용 마취의 국내·외 임상 적용 현황 조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20년 8월 13일까지 발표 된 연구를 검색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전통의학정보포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Integrated System, OAS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Service,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 ‘마취’ 및 ‘국소마취’를 조건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해외 연구의 경우 중문 연구와 영문 연구로 크게 나누어 검색하였으며, 중문 연구의 경우 CNKI에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또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Herbs‘의 카테고리 조건 하에 Title 및 Keyword로 ‘痲醉 and 外用’ 또는 Title로 ‘痲醉 and 中藥’의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영문 연구의 경우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데이터베이스에서 ‘anesthesia and herb’, ‘local anaesthesia and herb’, ‘anesthetic and herb’, ‘local anesthetic and herb’로 검색하였다.
Ⅲ. 연구 결과
국내 연구의 경우 마취, 국소마취, 한방, 한약 단어의 조합으로 RISS 72편, OASIS 14편으로 총 86편이 검색되었고 중복제거 후 70편이 포함되었다. 국외 연구 중 중문 연구의 경우 Title 및 Keyword로 ‘痲醉 and 外用’의 검색어를 사용한 경우 총 2개, Title로 ‘痲醉 and 中藥’을 사용한 경우 총 78개가 검색되었고 중복 제거 후 78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영문 연구는 Embase 212편, Pubmed는 252편, Cochrane library 13편으로 총 47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중복제거 후 415편이 포함되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포함된 논문들 중 중복제거를 거쳐 총 56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중 제목과 초록 등을 검토하여 마취제로써의 한약의 사용과 관련 없는 논문과 RCT가 아닌 문헌들을 배제하는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1차 스크린을 거쳐 남은 15개의(영문은 4편) 문헌의 원문을 검토하여 전문을 확인 할 수 없어 실험내용이 불명확한 논문(4편),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4편), 정맥주입과 같이 외용이 아닌 방식을 취한 연구(2편)와 한약 단독 사용이 아닌 연구(1편)을 제외하였다. 이 외에 검색어로 찾아지지 않았으나 최종 검색된 논문과 관련된 논문 중 주제와 관련된 논문 1편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중문 연구에서 2편, 영문 연구에서 3편, 총 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선정된 논문은 2편은 중국, 2편은 이스라엘, 1편은 쿠웨이트에서 진행 된 연구였다.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출간년도는 각각 2013년, 2016년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진행 된 연구의 출간년도는 각각 2001년, 2003년이었으며, 쿠웨이트에서 진행 된 연구는 출간년도는 2006년이었다(Table 1).
| Author (Year) | Title | Journal |
|---|---|---|
| Sarrell E.M.10) (2001) | Efficacy of Naturopathic Extracts in the Management of Ear Pain Associated With Acute Otitis Media |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
| Sarrell E.M.11) (2003) | Naturopathic Treatment for Ear Pain in Children | Pediatrics |
| Alqareer A.9) (2006) | The Effect of Clove and Benzocaine versus Placebo as Topical Anesthetics | Journal of Dentistry |
| Wang L.8) (2013) | Observation on the Clinical Application Effec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esthesia | Medical Journal of Chinese People’s Health. |
| Chen X.5) (2016) | The Clinical Effect of the External Appl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esthesia in Dermatology |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 대상자의 나이구간, 한약 마취제 투여 목적, 군 분류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총 대상자의 수는 825명이었고, 이 중 중도탈락자는 16명이었다. 각 연구마다 시험군과 대조군을 합한 총 피험자 수는 최소 73명에서 171명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147.2명으로 100명을 넘는 연구가 3편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최소 5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하였다. 논문마다 한약 마취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하였는데, 연속종 치료 시 통증감소가 목적인 경우와 발치, 낭종 제거, 농양 제거와 같은 수술시 마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약 마취제를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구강점막 통증 유발 시 통증감소를 목적으로 한 연구와 소아의 귀 통증에 쓰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군 분류 방법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무작위배정을 실시하였고 2편의 논문에서 이중맹검이 실시되었다(Table 2).
| Author (year) | Sample size | Age (year) | Condition or purpose | Time |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 Outcome measurement | Result | Adverse reaction |
|---|---|---|---|---|---|---|---|---|---|
| Sarrell (2001)10) | 103 | 6-18 | Ear pain from AOMS | every 8 hrs 3t/d | Control Otikon Otic solution (NHED) |
Anaesthetic ear drops (amethocaine) | Pain-O-Meter (OSBD) | *Mean Pain Score(MPS) reduced Control(Anesthetic) : 8.53(TA0)→ 1.4(TC0) Otikon Otic solution(NHED): 8.46(TA0)→1.1(TC0) * Difference in MPS between 2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7) * Last data point shows less pain in NHED group |
Not mentioned |
| Sarrell (2003)11) | 171 | 5-18 | Ear pain from AOMS | every 8 hrs 3t/d | Control NHED alone NHED + antibiotic Anesthetic + antibiotic |
Anaesthetic ear drops (amethocaine) | Pain-O-Meter (OSBD) | *Mean Pain Score decreased NHED alone : 0.3 NHED + antibiotic : 0.8 Anestheic alone(Control) : 1.2 Anesthetic + antibiotic : 2.0 |
Not mentioned |
| Alqareer (2006)9) | 73 | 19-25 | 25-gauge needle inserted on mucogingival border until bone contact | 5mins before the procedure | Control Clove gel Placebo C (Pumice + Glycerin) Placebo B (Petrolleum jelly) |
benzocaine 20% gel | 100-㎜ VAS | *Mean Pain Score Benzocaine: 13.31 Clove: 10.51 Placebo C: 16.54 Placebo B: 24.5 |
Most – slight burning sensation during application 1 – pain-like feeling after application 4 – Small aphthous-like ulcers |
| Wang (2013)8) | 376 | 22-85 | Tooth extraction | 10mins before the procedure | Control Herbal compound |
General western medicine anesthesia | Changes in clinical signs and symptoms in three stages (Significantly effective,effective, ineffective) |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effective: 156 Effective: 33 Ineffective: 11 *Control Group Significantly effective: 128 Effective: 24 Ineffective: 24 |
None |
| Chen (2016)5) | 86 | 11-36 | Molluscum contagiosum | 8~10 mins before the procedure | Control Herbal coumpound |
Lidocaine | Degree of pain into three grades I°: little pain II°: obvious but bearable III° : unbearable |
*Experimental group I°: 23, II°:18, III°: 2 *Control Group I°:32, II°: 10, III° :1 |
Not mentioned |
연구에 사용된 한약의 처방 구성을 조사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쓰인 처방 구성은 모두 달랐으며 구성 약재들은 草烏, 蟾酥, 川烏, 薄荷, 洋金花, 胡椒, 細辛, 生半夏, 生南星, 蜀椒, 丁香, 毛蕊花, 大蒜, 金盞花, 貫葉連翹가 포함되었다. 이들 처방 중에는 중복되는 약재들도 존재하였다(Table 3).
| Author (Year) | Title |
|---|---|
| Sarrell10) (2001) | Otikon: allium sativum, verbascum thapsus, calendula flores, hypericum perfoliatum, lavender, vitamin E in olive oil |
| Sarrell11) (2003) | Otikon: allium sativum, verbascum thapsus, calendula flores, hypericum perfoliatum, lavender, vitamin E in olive oil |
| Alqareer9) (2006) | Clove gel: grind clove to fine power and mix with liquid glycerin in a ration of 2:3(clove:glycerin) by volume. |
| Wang8) (2013) | Cao Wu 15g, Ban Xia 15g, Chan Su 5g, Tian Nan Xing 15g, Hua Jiao 5g and Xi Xin 15g: soak in 100-120㎖ of 70% alcohol for 2~3 days and add Zhang nao(Camphor) 5g and Bo He 5g |
| Chen5) (2016) | Cao Wu 6g, Chan Su 6g, Chuan Wu 6g, Bo He 4g, Yang Jin Hua 10g, Hu Jiao 4g and Xi Xin 12g : dry and make them in powder to soak in 500㎖ of 70% alcohol for about a week. |
한약 투여 기간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일까지로 마취효과를 위해 통증유발 시술직전 10분이내로 적용한 논문이 3편, 3일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투여하면서 통증감소 효과를 지켜본 논문이 2편이었다(Table 2).
실험 시행 시 설정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조군에 쓰인 약물들의 경우 종류는 다양하였지만 공통적으로 기존에 쓰이던 양약 마취제였다(Table 2). Chen5)의 연구에서는 대조군 약물로 lidocain을 사용하였고, Wang8)은 일반적인 양약 마취제를 사용하였으나 마취에 사용 된 약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이 두 연구에서의 대조군 약물의 적용 방법에 대한 상세 언급은 없었다. Sarrell10,11)은 마취효과가 있는 amethocaine와 진통효과가 있는 phenasone를 글리세린에 섞은 외용점적을 아픈 쪽 귀에 다섯 방울씩 넣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Alqareer9)의 경우 벤조카인 20% 젤을 2g정도 솜에 묻힌 후 좌우 상악 견치잇몸 중 무작위로 정해진 한 쪽의 윗부분 볼 점막 약 지름 1.5cm의 너비에 접촉하도록 한 후 4분 동안 유지한 후 타액에 의해 매체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한 번 바른 후 1분간 유지하였다(Table 2).
실험군의 경우 Chen5)은 준비된 한약 외용 마취 용액을 의료용 면봉을 사용하여 해당 부위에 도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Wang8)은 준비된 한약 외용 마취 용액을 무균 거즈에 적셔 시술부위에 10분간 올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Sarrell10,11)과 Alqareer9)은 실험군과 위약 모두 대조군과 같은 사용방식을 취하였다(Table 3).
한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각 연구들마다 측정방법은 달랐지만, Wang8)의 연구를 제외한 4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참가자들이 통증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약물 적용에 따른 통증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en5)은 치료의 결과평가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Ⅰ°는 약간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정도, Ⅱ°는 더 뚜렷한 통증이나 견딜 수 있으며 간신히 치료에 협조 할 수 있는 정도, Ⅲ°는 참기 어렵고 치료에 협조 할 수 없거나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평가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Wang8)은 치료 전후 두 그룹의 임상 증상 변화를 관찰하여 통증 평가를 顯效, 有效, 無效로 나누었으나 명확한 기준 및 적용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Sarrell10,11)은 참가자들의 통증지수를 Observational Scale of Behavioral Distress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이 평가지의 한쪽 면에는 통증지수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와 색깔로 구분(파랑이 통증 없음, 빨강으로 갈수록 매우 통증 느낌)이 되어있고 반대쪽 면에는 5가지 얼굴표정으로 구분이 되어있어 통증지수를 보다 시각화하여 두 면의 종합 점수의 평균을 전체 통증지수로 기록하였다. 평가 시간의 경우 각 외용 점적이 적용된 15분 후와 30분 후에 통증지수를 각각 기록하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8시간마다 하루 세 번 반복하여 3일 동안 진행되었다. 2번째 날과 3번째 날에는 집에서 통증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이후 24시간이 되는 시점과 48시간 되는 시점에 부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이의 외관이나 행동 레벨의 호전, 수면의 질을 파악하여 통증평가지수에 반영하였다. Alqareer9)는 100-㎜ VAS를 이용하여 참가자가 표시한 점을 자로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는데, 5분간 상악견치 잇몸 위 볼 점막에 적용된 마취제를 바른 솜을 빼내고 입술을 들어올려 25게이지 침(needle stick)으로 점막과 잇몸 사이 경계에 3㎜ 정도를 뼈가 닿을 때까지 찌른 후 빼내었을 때의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입을 헹구고 잠시 동안 쉬게 한 후 두 번째 매체를 반대쪽에 발라 똑같은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참가자에게 다음 며칠간 어떤 변화나 증상이 있는지 보고하게 하였다(Table 2).
5편의 논문 모두 중재로 사용된 한약 마취제의 적용이 통증 감소 혹은 마취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선정된 모든 논문의 연구에서 통증 유발 상황에서의 한약 마취제의 효과와 일반적인 국소 마취제의 효과를 비교하였고, 5편의 연구 모두에서 한약 마취제가 국소 마취제보다 더 큰 통증 감소의 효과를 보였으나, 4편의 연구에서 한약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의 통증 감소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Wang8)의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한약마취제의 효과가 기존 국소 마취제의 효과 못지않음을 의미한다.
Alqareer9)의 연구에서 유일하게 위약을 활용하여 음성 대조군을 형성하여 유효율을 비교하였는데, 위약과 한약 마취제, 위약과 기존 국소 마취제의 유효율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arrell10,11)의 경우 먼저 한약 마취제와 기존 국소 마취제의 효과를 비교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이듬해 항생제의 사용유무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는데, 두 연구 결과 모두에서 한약 마취제의 사용이 기존 국소 마취제보다 높은 유효율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Table 2).
Ⅳ. 고 찰
수술과 마취의 역사는 기원전 중국 華佗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華佗는 麻沸散라는 처방을 사용하여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방의 자세한 구성에 대한 기록은 유실된 상태로 이후 1804년 華岡靑洲가 華佗의 麻沸散을 복원시키려 노력하여 개발한 독자적인 처방으로 세계 최초로 공인된 수술을 집도하였다고 한다. 1796년 華岡靑洲와 同門이었던 中川修亭에 의해 이루어진 《麻藥考》에 의하면 華岡靑洲 이전부터 마취술이 연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이외에도 針과 刀를 이용한 종기 절개술은 황제내경 이후의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마취술도 찾아볼 수 있다. 한의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무기에 의한 상처를 봉합했던 기록13)과 국가적으로 종기를 절제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치종의학이 발달했던 조선시대의 기록14)을 보면 한의계의 외과수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이에 따라 마취술도 발달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의약 억압정책 이후 한의학 복원 과정에서 외과술이 신체보존을 중시하던 유교사상에 의해 하층민을 중심으로 발전했기에 서적이 부족했던 점, 도제식 전수가 끊어졌던 점,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 외과적 시술을 대체한 점 등의 이유로 한의사 제도 부활 이후에도 한의 외과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마취술의 연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5).
그러나 1950년대부터 중국에서 한의 마취술에 대한 연구4)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침자 마취술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으나 한약을 이용한 마취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국내에서는 2017년 섬수 약침 마취를 통해 표피낭종 제거 수술에 성공하여 한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였고 이후 섬수약침은 마취효과를 활용하여 도침 시술시 순응도 조절에 사용되기도 하였다6,7).
이처럼 국내·외로 한약 마취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도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약 마취제의 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가 다뤄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을 통해 한약 마취제의 효과에 대해 밝힌 RCT 연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하여 한약 마취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국에서 발표 된 한약 마취의 임상 연구는 발치술에 적용한 연구가 5개, 발치 또는 피부질환 수술에 적용한 연구가 1개, 발치 및 구강질환에 적용한 연구가 1개, 구강 수술에 적용한 연구가 1개, 연속종에 적용한 연구가 2개로 대다수의 연구가 발치 및 구강질환에 적용 된 연구였다.
먼저 언급된 2개의 중국의 연구 중 Chen5)의 연구는 병원에서 직접 제조한 한약 마취제와 리도카인을 비교하였을 때 총 유효율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 마취제의 임상 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만한 연구로 생각된다. Wang8)의 연구는 정확히 顯效, 有效, 無效의 기준, 실험군과 대조군에 포함된 각 수술별 배정된 환자 수, 수술 효과가 더 좋았다는 기준 등이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발치, 낭종 제거, 농양 제거와 같은 다양한 외치술에 한약 마취제와 양약 마취제를 비교하여 한약 마취제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 또한 임상에서의 한약 마취를 고려해봄직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CNKI 검색 결과 한약 마취제를 임상 응용 연구는 1959년에 보고된 연구4)가 제일 오래 된 연구였다. 오두팅크제 15g(生川烏 0.5g, 生草烏 0.5g, 生南星 0.5g, 生半夏 0.5g, 蟾酥 0.4g, 胡椒 1g, 細辛 1g을 75% 알코올 25㎖에 넣어 제조) 및 한약 마취제(蟾酥 1g, 川烏 2g, 蓽撥 2g, 細辛 1g, 草烏 1g을 95% 알코올 50㎖에 넣고 1일간 담가 여과한 후 사용)를 녹두 크기의 솜이나 작은 면봉에 약물을 묻혀 발치 및 구강 농양 절개 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효과 양호 25례, 유효 21례, 무효 3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외에도 발치술 및 구강 질환에 사용하여 효과를 보인 연구들16-21)이 계속해서 보고되었다.
Chen5)의 연구처럼 연속종의 혈관 클램프 치료 시 발생하는 통증 감소 목적으로 한약 마취를 적용한 Miao의 증례 보고 연구22)도 있었다. 총 60명의 환자(남성 40명, 여성 20명, 평균 연령 14.5세)를 대상으로 2% 포비돈, 한약 표면 마취액, 2% 포비돈+리도카인을 사용하였을 때 각각 느끼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60개 이상의 연속종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의 치료법으로 나누어 각 치료법 당 20개씩 시술하여 첫 번째 치료 시 2% 포비돈 거즈 패드를 외부에서 10분 동안 도포, 두 번째 치료 시 한약 마취제(乳香, 沒藥, 白鮮皮, 生半夏, 蛇床子, 苦蔘, 薄荷 각 15g, 銀花, 大靑根, 紫草 각 30g을 200-300㎖에 水煎)를 바른 거즈를 10분 동안 부착, 세 번째 치료 시 2% 포비돈+리도카인 거즈를 10분간 부착의 방법으로 해당 처치가 끝난 후 피부 병변을 혈관 클램프로 압착하여 환자의 통증을 기록 하였다. 통증 정도는 Ⅰ도(칼날과 같은 견딜 수없는 통증), Ⅱ도(통증은 명백하지만 견딜 수 있음), Ⅲ도(약간 고통, 견딜 수 있음)로 환자가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2% 포비돈 처치 시 Ⅰ도 45건, Ⅱ도 15건, 한약 표면 마취제 처치 시 Ⅰ도 12건, Ⅱ도 16건, Ⅲ도 32건, 2% 포비돈+리도카인 처치 시 Ⅰ도 40건, Ⅱ도 20건의 결과를 보였다.
영문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약 마취제에 관한 RCT 연구는 총 3편으로, 구강 점막에 통증을 유발하였을 때 丁香을 활용한 마취제와 일반적인 국소마취제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9)가 있었고, 소아 급성 중이염으로 유발된 귀 통증에 한약을 활용한 마취 점적과 일반적인 국소 마취점적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10,11)가 있었다. 이들 모두 한약 마취제와 기존의 국소마취제의 유효율에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한약 마취제를 쓴 경우의 통증 감소가 높다는 점으로 보아 한약 마취제가 기존의 국소마취제를 대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비록 한약의 표준화의 부족, 부작용에 대한 후향적 연구의 필요성 등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기존 마취제에 비해 비용 절약적인 측면과 자연적 치료제로서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한약 마취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연구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마취제로써 사용 될 수 있는 본초의 경향성과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정한 RCT 연구뿐만 아니라 고찰에 서술한 증례 보고 연구들에서 사용된 본초를 정리하였다(Table 4). 그 결과 임상 연구에서 마취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된 본초는 선정된 중국 RCT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는 細辛(10회), 草烏(9회), 蟾酥(8회)임을 알 수 있었다. 細辛은 한의학적으로 祛風散寒·通竅止痛하는 효능과 牙痛도 치료할 있으며, 草烏는 祛風除濕·溫經止痛 및 痲醉止痛에 대한 효능이 알려져 있고, 蟾酥는 解毒消腫·止痛하는 효능과 다양한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風蟲牙痛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본초학의 이론상으로 止痛의 효능이 있는 본초들이 많은 연구에 활용되었고, 실제 임상에서도 이론처럼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재까지 국내·외를 비롯해 한약의 마취효과에 대한 연구들과 임상적 활용에 대한 논문들의 숫자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본초들의 마취 효과를 활용하여 한약 마취제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Sarrell10) (2001) | Sarrell11) (2003) | Alqareer9) (2006) | Chen5) (2016) | Wang8) (2013) | Conference*4) testI(1959) | Conference*4) testII(1959) | John16) (1963) | Hospital†17) (1975) | Ding18) (1985) | Sun19) (1995) | Ma20) (1997) | Jin21) (2000) | Miao22) (2004) | |
|---|---|---|---|---|---|---|---|---|---|---|---|---|---|---|
| Cao Wu | ○ | ○ | ○ | ○ | ○ | ○ | ○ | ○ | ○ | |||||
| Chuan Wu | ○ | ○ | ○ | ○ | ○ | |||||||||
| Chan Su | ○ | ○ | ○ | ○ | ○ | ○ | ○ | ○ | ||||||
| Xi Xin | ○ | ○ | ○ | ○ | ○ | ○ | ○ | ○ | ○ | ○ | ||||
| Bo He | ○ | ○ | ○ | △(or) | ○ | |||||||||
| Yang Jin Hua | ○ | ○ | ||||||||||||
| Hu Jiao | ○ | ○ | ○ | ○ | △(or) | |||||||||
| Ban Xi | ○ | ○ | ○ | ○ | ○ | |||||||||
| Hua Jiao | ○ | ○ | ○ | ○ | ||||||||||
| Tian Nan Xing | ○ | ○ | ○ | ○ | ||||||||||
| Zhang nao | ○ | ○ | ||||||||||||
| Ru Xiang | ○ | |||||||||||||
| Mo Yao | ○ | |||||||||||||
| Bai Xian Pi | ○ | |||||||||||||
| She Chuang Zi | ○ | |||||||||||||
| Ku Shen | ○ | |||||||||||||
| Yin Hua | ○ | |||||||||||||
| Da Qing Gen | ○ | |||||||||||||
| Zi Cao | ○ | |||||||||||||
| Bi Ba | ○ | ○ | ||||||||||||
| Bing pian | ○ | |||||||||||||
| Bai Zhi | ○ | |||||||||||||
| Clove | ○ | |||||||||||||
| Allium sativum | ○ | ○ | ||||||||||||
| Verbascum thapsus | ○ | ○ | ||||||||||||
| Hypericum perfoliatum | ○ | ○ |
본 연구는 6개의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구나 타 언어권 연구 및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는 포함하지 못하였고 검색 결과 선정된 논문이 5편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통증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참가자의 주관적인 점수에 의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에 의해 치료의 유효율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 음성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과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힘든 점이 있다. 또한 한약 마취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국과 영문권 연구 사이의 약물 구성이 매우 상이하고 구성 약물의 용량이 정확하게 표기 되지 않은 연구도 존재하였기에 문헌 고찰만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 기전과 평가의 객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약의 마취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체계적인 임상연구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RCT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20년 8월 13일까지 한약이 외용 마취제로 쓰인 RCT연구에 대한 국내·외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선정된 5편의 논문 중 2편은 중국, 2편은 이스라엘, 1편은 쿠웨이트에서 진행 된 RCT연구였으며, 국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
마취 효능에 대한 평가 도구는 100-㎜ VAS나 Pain-O-Meter, 자체적으로 제작한 평가도구 등 연구마다 상이하였으나, 1개의 연구를 제외한 4개의 연구에서 모두 환자가 직접 통증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모든 연구에서 한약 외용 마취제와 양약 마취제의 유효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한약 외용 마취제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편의 논문 중 1편의 논문에서만 한약 마취제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였고 나머지 논문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언급된 부작용은 가벼운 증상에 그쳤으며 적은 수의 참가자들에게서만 보고되었다. 그 외의 특별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
1편의 논문에서는 음성 대조군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4편의 논문에서는 오로지 실험군과 대조군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약마취제의 효능에 대한 정확한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1편의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술에 대해 한약 마취제와 기존 국소 마취제의 효과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를 언급하기에는 실험 설계상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RCT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