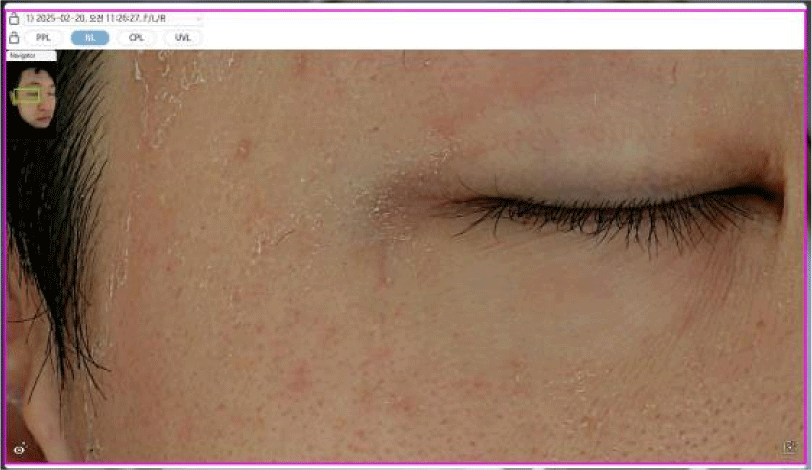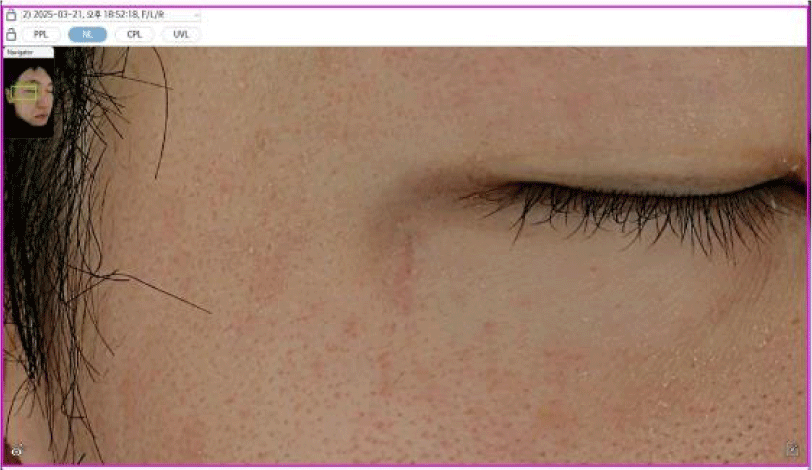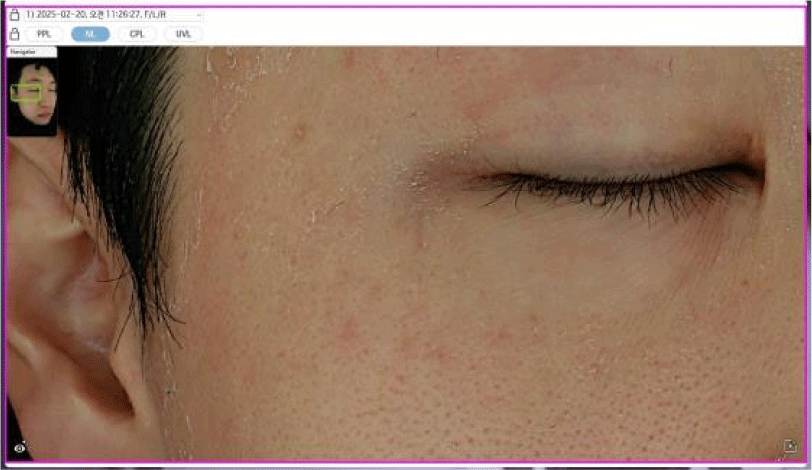Ⅰ. 서 론
흉터는 궤양이나 외상 등으로 조직 결손이 발생한 뒤, 상처 치유 과정에서 형성되는 섬유성 조직이다. 상처 치유는 염증기, 섬유아세포 증식기, 재형성기의 3단계를 거치며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의 합성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이 지속되어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로 발전할 수 있다. 흉터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자신감 저하, 우울감 등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안면부에 발생한 흉터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1,2).
현재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의 치료는 주로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확립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압박요법, 실리콘 시트, 국소 연고,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서브시전, 레이저 치료 등이 사용된다2,3).
도침을 통한 서브시전(Subcision)은 날이 있는 특수 침을 이용해 병변 내 섬유성 유착을 절개· 박리함으로써 진피 내에서 병리적 콜라겐 섬유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이로 인한 미세 출혈을 통해 성장인자 및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유도하여 새로운 콜라겐 재배열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이러한 치료는 흉터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조직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서브시전은 흉터 조직의 콜라겐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여 흉터를 개선하는데, 최근에는 이를 NAFL과 병합하여 더욱 우수한 임상적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Nonablative fractional lasers, NAFLs)는 표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진피층에 미세 열 손상 구역(MTZ)을 형성하여 콜라겐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5). Fulchiero 등은 1320㎚ Nd:YAG 기반 NAFL과 서브시전을 병행한 치료가 단독 치료보다 흉터의 질감, 색소, 외관 개선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6).
한편, Polydeoxyribonucleotide (PDRN)는 아데노신 A2A 수용체를 통해 VEGF 분비를 촉진하고 섬유아세포 활성화,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을 유도함으로써 상처 치유 및 조직 재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 열상 봉합술 후 발생한 비후성 흉터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침을 통한 서브시전으로 콜라겐 유착을 박리하고, 이후 Nd:YAG 기반 NAFL을 통해 콜라겐 재형성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며, PDRN 약침(연아약침TM)으로 VEGF 분비 및 섬유아세포 활성화를 촉진하는 3단계 통합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또한 피부 진단기(Janus® pro hybrid)를 통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한의학 분야에서는 위축성 흉터에 대한 치료 사례는 보고된 바 있으나, 비후성 흉터에 대한 치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도침, NAFL, PDRN 약침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3단계 통합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한 임상 보고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 치료를 통해 유의한 임상적 개선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
성명 : 성○○
-
성별/나이 : M/25
-
주소증 : 안면부 열상 봉합 시술 후 발생한 비후성 흉터
-
발병일 : 2024년 8월
-
현병력 : 환자는 1년 전 농구경기 도중 눈 가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성형외과에서 봉합술을 받은 이후 비후성 흉터가 생겼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평소 흉터가 신경이 쓰이는 편이었다고 한다.
-
과거력 : 별무
-
가족력 : 별무
-
사회력 : 별무
시술 전 시술을 담당한 한의사가 국소마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외용 마취제인 엠마오® 5% 크림(알리코제약)을 사용하여 20분간 국소 마취를 시행한 뒤, 무균장갑 착용 후 포비돈요오드액 10%로 시술 부위를 소독하였다. 이후 우전도침TM(0.40㎜ × 40㎜)을 이용해 흉터 부위 진피 내 콜라겐 유착을 박리하였다. 콜라겐 유착이 주로 진피 내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刺入시 도침 날이 피부와 거의 수평을 이루도록 斜刺 하였으며 피부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0.5㎜를 넘지 않도록 하여 도침 날이 진피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提揷하여 꼼꼼히 유착을 절단하되, 刺入되는 날의 길이가 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구 손상을 방지하였다. 시술 후에는 포비돈요오드액 10%로 재소독을 시행하였다.
Q-Switched Nd:YAG 레이저(PeaklightTM, (주)엘트라 글로벌)의 1064㎚ 파장, 비박피성 프락셔널 모드(MLA 프락셔널 핸드피스(NAFR))를 이용하였다. spot size: 7㎜, fluence: 2.07-2.59J/cm2, frequency: 5-7㎐로 치료후 병변 주변 피부에 delayed petechiae가 나타날 정도로 병변 부위를 1–2회 중첩 조사하였다.
PDRN 약침은 한약재 중 하나인 연어의 생식세포(정소, 정액 등)에서 추출한 저분자량 DNA로, 퓨린 및 피리미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인산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약 50-2000 염기쌍 길이의 중합체로 구성된다9). 본 증례에서는 AJ탕전원에서 조제한 PDRN 약침액(연아약침TM) 2㎖, 1vial를 34gauge x 2㎜ needle을 이용하여 환자의 흉터 부위에 주입하였다.
치료 전후 흉터의 외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피부 진단기(Janus® Pro Hybrid, PIE)를 사용하여 임상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SBSES(Stony Brook Scar Evaluation Scale)를 통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산출하였다. SBSES는 색소 침착, 혈관 확장, 두께, 연속성, 외형 등 5개 항목을 각각 0점(정상에 가까움)에서 1점(비정상 소견 있음)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0-5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미용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의미한다13). 또한 치료 전후의 개선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QIS(Quartile Improvement Scale)를 병행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는 병변부의 시각적 비교를 통해 0점(0%, 개선 없음), 1점(1%-25%, 불량), 2점(26%-50%, 보통), 3점(51%-75%, 양호), 4점(76~100% 우수)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아울러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0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SBSES 3점, 주관적 만족도(Likert 척도) 4점 SBSES 항목별: 색소 침착 1점, 혈관 확장 1점, 두께 0점, 연속성 0점, 외관 1점 → 총 3점
Ⅲ. 고 찰
수술 후 흉터(post-surgical scar)는 외과적 절개나 봉합 부위의 조직 재생 과정에서 진피층 섬유성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발생하는 병변으로, 육안적으로는 융기, 발적, 색소 변화, 조직 경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상처 치유는 염증기, 증식기, 재형성기의 과정을 거치며 균형 있는 콜라겐 대사가 이루어지지만, 외과적 자극, 감염,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 해 이 균형이 붕괴되면 진피 내에서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이 지속되어 비후성 흉터(hypertrophic scar)나 켈로이드(keloid)로 이어질 수 있다1,2,8).
조직학적으로 비후성 흉터는 진피 내에서 비교적 평행하고 물결 모양의 콜라겐 섬유가 상처 경계 내에 국한되어 증식한 것이 관찰된다. 켈로이드는 무질서하거나, 표피와 피부 장력선에 평행하게 배열된 두꺼운 콜라겐 섬유가 상처 경계를 넘어 확장한다. 둘 모두 콜라겐 증식이 진피층에 국한되나 병리적 섬유화와 관련된 만성 염증이 동반된다10). 특히 안면부에 형성된 흉터는 기능적 문제 뿐 아니라 미용적, 심리적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병변은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술 이후 상처 경계 내에 국한되어 융기된 형태로 발생한 비후성 흉터로, 상처 경계를 넘어 성장하는 켈로이드와는 구분된다.
비후성 흉터에 대한 치료는 실리콘 시트, 압박요법,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서브시전, 레이저, 수술적 절제, 방사선 치료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부 방법은 재발률이 높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는 반복 시 피부 위축, 색소 변화, 모세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발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11).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피부 구조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진피 내 재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의 비침습적 또는 병합 치료 전략이 제안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도침치료(Subcision), Nd:YAG 기반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NAFL), 그리고 PDRN 약침을 연계한 3단계 통합 치료를 통해 안면부 비후성 흉터에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시각적 외관 및 환자 만족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참고로, 본 증례에서는 한약 복용은 시행하지 않았다.
도침은 한의학 고유의 치료법으로, 경피·경근·경맥에 刺入하여 유착된 연부조직을 박리하고 병변을 치료하는 기전으로 이해된다. 이는 고대 陶磁器片과 鈹鍼에서 유래하여 《黃帝內經》을 비롯한 고문헌에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까지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침을 이용한 흉터치료는 자락사혈과 유사하게 국소적으로 미세한 출혈을 유도하여 정체된 혈류를 소통시키고, 이를 통해 혈소판유래성장인자(PDGF) 등 다양한 성장인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조직 재생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12). 서브시전(subcision)으로 불리기도 하며, 진피 또는 진피-피하경계부에 바늘을 삽입해 병리적으로 유착된 섬유조직을 기계적으로 절단함으로써 국소적인 유착 해리를 통해 조직의 긴장과 구축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재생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4).
이후 적용한 1064㎚ 파장의 Nd:YAG 기반 NAFL은 진피에 국소적 열 손상 구역(MTZ, microscopic thermal zone)을 형성하여 콜라겐 변성과 리모델링을 유도하면서도 표피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박피성 레이저 대비 안전성이 높다. 특히 Nd:YAG 레이저는 비교적 긴 파장을 가져 진피 깊은 층까지 침투가 가능하며, 흉터와 같은 진피 병변의 개선에 적합하다4). Fulchiero 등의 연구에서는 서브시전과 NAFL 병합 치료가 단독 치료에 비해 흉터의 질감, 색소, 외형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뛰어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6).
NAFL 시술 후에는 조직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PDRN 약침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였다.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은 아데노신 A2A 수용체를 통해 VEGF(혈관내피성장인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섬유아세포를 활성화하여 콜라겐 및 엘라스틴 생합성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조직 회복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한다7,8). 기존 연구에 따르면, PDRN은 화상, 방사선 피부염, 수술 후 상처 등 다양한 손상 모델에서 항염증 및 재생 촉진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8).
치료 효과는 SBSES(Stony Brook Scar Evaluation Scale)와 QIS(Quartile Improvement Scale)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SBSES는 흉터의 색소, 혈관확장, 두께, 연속성, 외형 등 다섯 항목에 대해 0-1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0-5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미용적으로 우수한 상태임을 의미한다13). 본 증례에서는 내원당일 SBSES 3점, 1개월 시점에서 1점, 5개월 시점에서 0점으로 개선되었다. QIS는 치료 전후의 시각적 비교를 통해 개선 정도를 0점(0% 개선 없음)에서 4점(76-100% 우수)까지 평가하는 지표로, 본 증례에서는 1개월 시점에서 QIS 3점, 5개월 시점에서 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주관적 만족도 또한 4점에서 5점으로 증가하였다.
본 증례는 도침–NAFL–PDRN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전을 가진 치료법을 병합하여, 기존 단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후성 흉터에 대한 새로운 통합 치료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서브시전과 NAFL을 병합한 치료 사례는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도침을 이용한 서브시전, Nd:YAG 기반 NAFL, PDRN 약침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3단계 통합 치료 사례는 국내·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는 향후 비후성 흉터 치료에서 침 치료와 레이저, 조직 재생 약침을 융합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증례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향후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와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