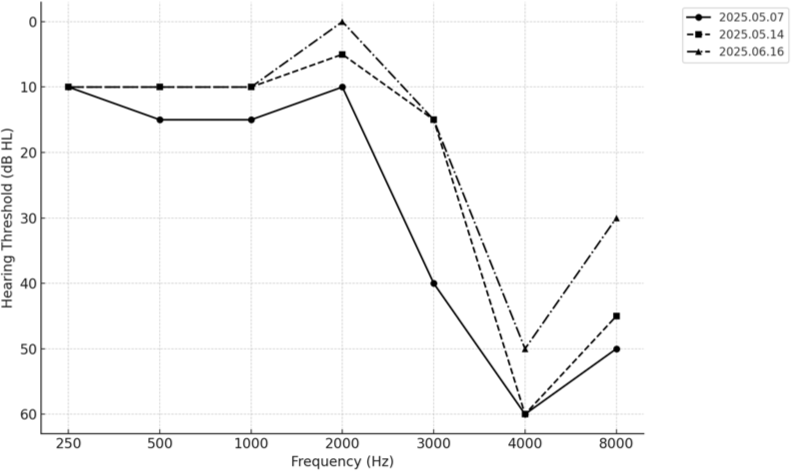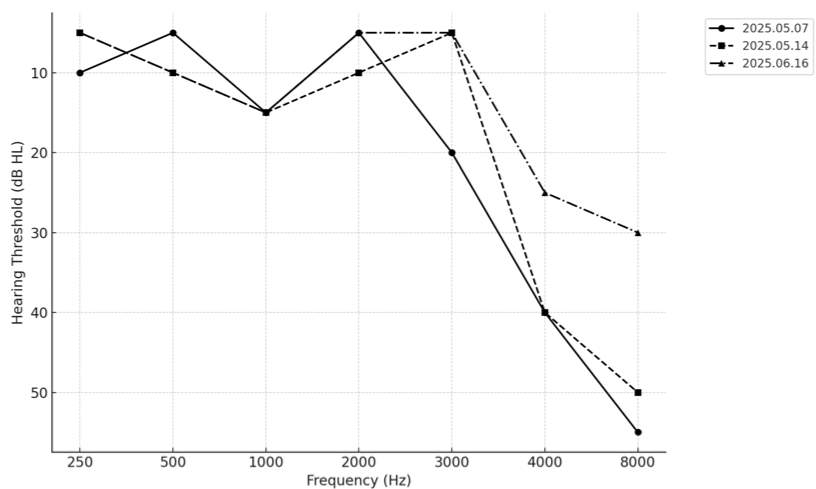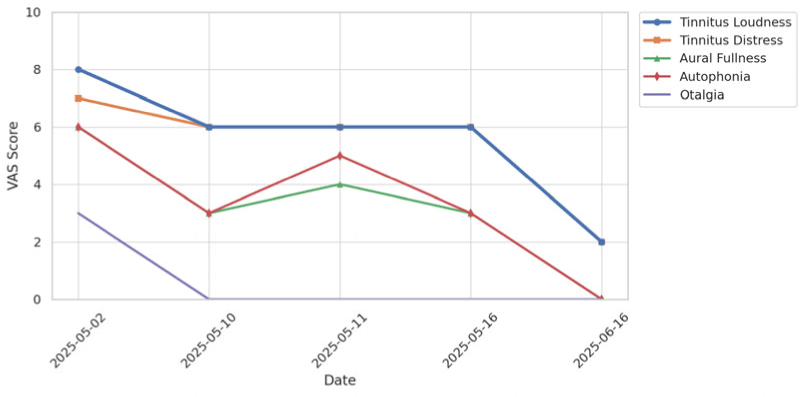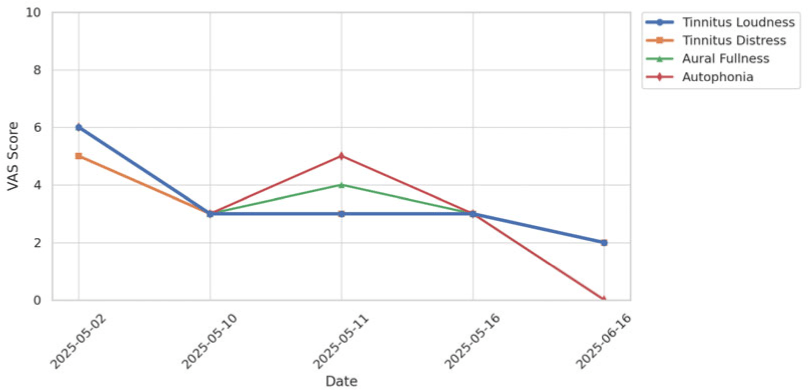Ⅰ. 서 론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이거나 단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3,000㎐-6,000㎐의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이 더 심하게 관찰되고 특히 4,000㎐ 주파수 영역의 청력 손실이 가장 두드러지는 C5 dip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양측성 난청을 특징으로 하고 청력 손실은 소음 노출 10-15년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이며, 청력 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난청의 진행 속도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1).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현황’의 질병 종류별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숫자가 늘어서 2013년-2016년에는 약 300-400명 정도였다가 2017년 1,0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5,611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체부담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2).
서양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에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혈관확장제, 항산화제 등의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확립된 약물치료가 존재하지 않으며1) 특히 청력의 탄성 한계를 초과하는 130㏈ 이상의 큰 소음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난청인 급성 음향외상의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작된 전신적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대부분 반응이 없다는 보고3)가 있는 만큼 그 치료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난청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돌발성 난청에 국한되어 있으며4), 돌발성 난청에 대한 침 치료5) 또는 한약 치료6)와 관련된 임상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소음성 난청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증례보고 및 임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저자는 단속성의 강한 소음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환자에게 한방 및 양방 복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청력개선 및 이명 등 동반 증상의 완화 효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한다.
Ⅱ. 증 례
-
환자명 : 김OO (M/20)
-
발병일 : 2025년 4월 28일
-
내원일 : 2025년 5월 2일
-
주소증 : 난청(Both.), 이명(Both.), 이충만감(Both.), 자성강청(Both.)
-
과거력 :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
사회력 : 별무 음주, 별무 흡연
-
가족력 : 별무 특이
-
현병력
2025년 4월 28일 군대에서 사격 훈련 중 귀마개 착용하지 않아 양쪽 귀의 난청 발생하였고 이후 국군홍천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k㎐의 70㏈ 미만의 소음성 난청 소견으로 경구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5월 2일 청력저하 및 이명 등 동반 증상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 경유하여 입원.
-
계통적 문진 : 별무 이상
-
치료기간
-
① 2025년 5월 2일-2025년 5월 12일 (11일간)
烏藥順氣散(Table 1) 2첩을 3회로 나누어서 식후 2시간 후 하루 세 번 120cc씩 투여했다.
-
② 2025년 5월 13일-2025년 6월 15일 (34일간)
通竅活血湯(Table 2) 처방에서 麝香을 去하고 石菖蒲, 當歸, 澤瀉를 각 4g, 柴胡를 2g 加하여 전탕하여 2첩을 3회로 나누어서 식후 2시간 후 하루 세 번 120cc씩 투여했다.
-
③ 2025년 5월 2일-2025년 5월 15일 (14일간)
牛黃淸心元(익수제약, 대한민국)을 취침 1시간 전 하루 한 알씩 투여하였다.
침 치료는 0.25mm × 40mm 일회용 멸균 호침(동방침, 동방메디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오전과 오후로 1일 2회 시행하였다. 聽宮(SI19), 翳風(TE17), 風池(GB20), 百會(GV20), 合谷(LI4), 迎香(LI20) 등에 자침하였으며, 수기 조작 없이 15분간 留鍼하였다.
紫河車 약침(기린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실, 대한민국)을 29G 1cc 인슐린 주입용 주사기(BD Ultra- Fine™ Needle,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BD), 미국)를 사용하여 1일 1회 양측 聽宮(SI19)에 0.2cc씩 주사하였다.
-
① 2025년 5월 3일-2025년 5월 14일 (12일간)
입원 시 국군홍천병원에서 처방받은 MPDL Tab. 4mg(더유제약, Methylprednisolone 4mg, 부신피질호르몬제)을 아침 식후에 12T부터 2T까지 용량을 감소시켜가며 처방대로 복용하였고 Ome-Q Cap. 20mg(일동제약, Omeprazole 20mg, 프로톤 펌프 저해제)을 아침, 저녁 식후에 1C씩 처방대로 복용하였다.
-
② 2025년 5월 7일-2025년 6월 3일 (28일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추가로 처방받은 Ginexin-F Tab. 80mg(에스케이케미칼, Ginko leaf dried extract 80mg, 순환개선제)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T씩 처방대로 복용하였다.
난청 평가 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난청의 중증도는 40㏈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인 주파수인 3000㎐, 4000㎐, 8000㎐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주파수에서의 치료 전후의 청력 회복 정도는 Siegel’s Criteria(Table 3)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 및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장애지수 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은 “아니다”, “가끔 그렇다”,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점, 2점, 4점으로 점수가 계산된다. 각 문항에 대한 총점의 범위는 0-100점이며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Slight”, “Mild”, “Moderate”, “Severe”, “Catastrophic”의 5개 중 하나로 이명장애지수 등급을 평가한다(Table 4).
이명도 검사는 이명의 높낮이와 크기를 청각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이명의 높낮이와 가장 근접한 자극음 주파수를 찾는 이명 주파수 매칭 및 크기와 가장 근접한 자극음을 찾는 이명 크기 매칭 등이 시행되는 검사이며6) 순음청력검사 시 함께 시행되었다.
좌측 귀의 통증과 양측 귀의 이명 크기 및 괴로움, 이충만감, 자성강청의 항목들에 대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불편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Visual Analogue Scale(VAS)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이며 0점은 불편감이 없는 상태, 10점은 환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불편감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2025년 5월 14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3,000㎐, 4,000㎐, 8,000㎐의 3개 주파수에서의 좌측 평균 청력 역치는 40㏈, 우측 평균 청력 역치는 31.6㏈로 측정되었다
2025년 6월 16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3,000㎐, 4,000㎐, 8,000㎐의 3개 주파수에서의 좌측 평균 청력 역치는 31.6㏈, 우측 평균 청력 역치는 20㏈로 측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Siegel’s Criteria(Table 4)상 좌측은 Partial recovery, 우측은 Complete recovery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25년 5월 7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3,000㎐, 4,000㎐, 8,000㎐의 3개 주파수에서의 좌측 평균 청력 역치는 50㏈, 우측 평균 청력 역치는 38.3㏈로 측정되었다.
2025년 5월 14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3,000㎐, 4,000㎐, 8,000㎐의 3개 주파수에서의 좌측 평균 청력 역치는 40㏈, 우측 평균 청력 역치는 31.6㏈로 측정되었다
2025년 6월 16일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3,000㎐, 4,000㎐, 8,000㎐의 3개 주파수에서의 좌측 평균 청력 역치는 31.6㏈, 우측 평균 청력 역치는 20㏈로 측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Siegel’s Criteria(Table 4)상 좌측은 Partial recovery, 우측은 Complete recovery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25년 5월 2일에 시행한 THI는 80점으로 이명장애지수 등급상 ‘심도’에 해당하였다. 2025년 5월 9일과 2025년 5월 16일에 시행한 THI는 각각 47점, 38점으로 ‘중도’에 해당하였고 2025년 6월 16일에 시행한 THI는 10점으로 ‘미도’에 해당하였다.
| Date | Pitch Mathcing Loudness Matching | |
|---|---|---|
| Right Ear | Left Ear | |
| 2025.05.07 | 8000㎐ 62㏈ |
8000㎐ 62㏈ |
| 2025.05.14 | 4000㎐ 58㏈ |
4000㎐ 65㏈ |
| 2025.06.16 | 8000㎐ 35㏈ |
8000㎐ 37㏈ |
2025년 5월 7일에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양측 모두 주파수와 크기에서 8,000㎐, 62㏈의 자극음이 이명과 가장 근접하다고 측정되었다. 2025년 5월 14일에는 좌측 4,000㎐, 65㏈, 우측 4,000㎐, 58㏈의 자극음이, 2025년 6월 16일에는 좌측 8,000㎐, 37㏈, 우측 8,000㎐, 35㏈의 자극음이 이명과 가장 근접하다고 측정되었다.
2025년 5월 2일-2025년 5월 16일 입원기간 동안 좌측 귀의 통증, 양측 귀의 이명 크기 및 괴로움, 이충만감, 자성강청의 항목들에 대하여 VAS를 총 4번 측정하였으며 2025년 6월 16일 외래로 내원 시 동일 항목들에 대한 VAS를 한 번 더 측정하였다. 2025년 5월 10일 좌측 귀의 통증은 소실되었고 다른 증상들도 완화되었다. 2025년 5월 11일 일시적으로 병원 내 소음 환경에 노출된 후 이충만감, 자성강청 증상의 심화를 보였으나 이후 완화되었다. 2025년 6월 16일 외래 내원 시의 이명의 크기 및 괴로움은 퇴원 시보다 완화되었고 이충만감, 자성강청은 소실되었다.
Ⅲ. 고 찰
소음 노출에 의한 와우 손상의 기전은 기계적 손상과 대사성 손상으로 설명하는데, 기계적 손상의 경우 Reisnner막, 기저막 등 와우내막, 내외 유모세포 및 지지세포, 나선신경절과 혈관조 등에서의 물리학적인 손상과 내이 혈류변화 등이 나타난다. 대사성 손상은 소음에 의한 대사활동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활성산소나 활성질소 같은 유리기(free radical)의 과다 생성으로 와우 혈류를 감소시키고 코르티 기관 세포의 세포자멸사나 괴사를 야기한다1).
소음성 난청은 한의학에서 噪聲聾이라고 하며 病機에 따라 陽氣虧虛, 陰血虧虛, 陽精虧虛, 血瘀氣滯로 분류하며 변증에 따라 益氣昇陽, 健脾養血, 滋腎養陰, 化瘀開竅하여 치료한다8).
소음성 난청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국내의 단독 증례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 등9)이 보고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의치료에 대한 증례 중 1건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증례는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역치만 확인할 수 있었고 주파수별 청력 역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발병 시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고 발병 후 2년 뒤의 치료에 대한 연구이므로 난청의 원인을 소음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증례는 폭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 환자에게 한방 및 양방 복합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고주파에서의 청력역치의 유의미한 회복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20세 남환으로 군대에서 사격 훈련 후 국군홍천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본원에 내원하였다. 발병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하였으며, 한약, 침, 뜸, 약침, 부항의 한의학적 치료와 양약 및 주사치료의 양방적 처치를 함께 시행하였다.
2025년 5월 2일-2025년 5월 12일, 총 12일간 烏藥順氣散을 처방하였다. 이 등10)에 의하면 烏藥順氣散은 一切의 風疾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治風 하기전 氣道를 소통시키는 처방으로,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발병 초기의 氣鬱과 瘀血을 해소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소음성 난청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처방을 사용하였다.
2025년 5월 11일 일시적으로 병원 내의 소음 환경에 노출된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던 이충만감, 자성강청 등 난청에 동반된 증상이 다시 심해졌고 通竅活血湯加減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최 등6)에 의해 발표된 중의학 임상 논문 분석에 따르면 通竅活血湯加減은 돌발성 난청의 한약치료에 가장 빈용된 처방인데, 이는 活血通竅하여 氣血瘀阻證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紅花, 桃仁 등 活血去瘀藥이 君藥으로 쓰인 通竅活血湯으로 처방을 변경하여 일시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동반 증상의 악화를 빠르게 회복하고 난청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본 증례에서 활용된 通竅活血湯加減은 기존의 通竅活血湯에서 麝香을 去하고 石菖蒲, 當歸, 柴胡, 澤瀉를 加하였다. 石菖蒲는 항산화 작용에 의한 신경보호기전이 알려져 있으며11) 當歸 추출물의 데커신(decursin) 성분이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및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알려져 있다12). 柴胡 추출물은 IL-6와 TNF-α와 같은 염증 관련 물질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3). 한편, 최근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소음 등 외부자극에 의한 내이의 외상을 이차성 내림프 수종의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14), 澤瀉는 利水退腫藥으로 腎, 膀胱經에 작용하여 利小便, 淸濕熱하는 효능이 있으므로15) 이명, 이충만감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명의 기전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이명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이 이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긴장, 두통, 홍조 등 자율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6). 환자는 입원 당시 난청과 이명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정서적인 불안도 동반되었다. 이에 입원 기간 동안 牛黃淸心元을 투약하였으며, 牛黃淸心元의 開竅化痰, 養血生津하여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17)이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背部에 부항치료도 시행하였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의 기능은 활성화시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효능18)이 있으므로 신체적 이완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이명 등의 자율신경 부조화로 인한 증상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청 및 동반 증상의 완화를 위해 침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사용한 穴位로는 난청의 한의 치료에 대한 국내 임상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빈용된 聽宮(SI19), 翳風(TE17), 風池(GB20), 百會(GV20), 合谷(LI4), 迎香(LI20) 등을 取穴하였다4).
약침액은 紫河車를 사용하였는데, 紫河車는 益氣養血, 補精 등의 효능19)이 있으므로 耳部의 滋潤 효과를 위해 양측 聽宮(SI19)에 0.2cc씩 총 0.4cc를 주입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발병일로부터 4일 뒤인 2025년 5월 2일부터 2주간의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2025년 6월 16일 본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이명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순음청력검사 상 초기 검사 시 40㏈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였던 3,000㎐, 4,000㎐, 8,000㎐의 청력 역치의 평균은 Siegel’s Criteria 상 좌측이 50㏈에서 31.6㏈로 Partial recovery, 우측이 38.3㏈에서 20㏈로 Complete recovery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주파수별 청력 역치는 좌측의 4,000㎐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양측 모두 30㏈ 이하로 회복되었으며, Siegel’s Criteria상 Partial 또는 Complete recovery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좌측의 4,000㎐는 60㏈에서 50㏈로 회복되었으나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하여 청력 역치의 변화가 적었다. 또한 THI는 초기 80점에서 최종 10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VAS상 환자가 느끼는 이명의 크기, 괴로움의 정도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로 이명도 검사를 통해 이명의 크기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명 외에 좌측 귀의 통증, 이충만감, 자성강청의 동반 증상은 최종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한편, 최 등3)의 연구에서는 단속성의 강한 소음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급성 소음성 난청 환자군의 회복률은 11%로 돌발성 난청 환자군의 78%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함이 보고되었고 발병일 기준 3개월 후 급성 소음성 난청 환자군은 4,000㎐ 영역에서 치료 종료 후 평균 청력의 악화를 보였다. Harada 등20)의 급성 음향외상 환자군의 치료 예후 연구에서는 전체 주파수에서 4,000㎐, 8,000㎐, 2,000㎐ 순서로 청력 회복이 저조하였으며 4,000㎐에서의 청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체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4,000㎐에서의 청력 회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청력 또한 부분적인 회복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낮은 회복률과 주파수별 회복률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본 증례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고주파 영역의 유의미한 청력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좌측 4,000㎐의 청력 역치는 다른 주파수 영역과 비교하여 청력 변화의 정도가 적었으나 발병 이후 약 7주 만에 4,000㎐ 청력역치의 호전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청력에도 확실한 호전이 있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청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에 확인된 이명의 한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그 치료 결과를 증상의 변화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 또는 설문지에만 의존해왔으나 본 증례에서는 이명도 검사를 활용하여 이명의 크기나 높낮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증례는 비록 1건에 불과하며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같은 양방적 중재가 포함되어 한의 치료의 단일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퇴원 후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침구치료나 약침치료를 병행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단일 증례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한의 치료 연구가 전무하며, 서양의학적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치료 후에도 4,000㎐에서 청력의 악화를 보인 기존의 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본 증례는 한의 치료를 통하여 전반적인 청력과 이명 등 동반 증상에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으며, 4,000㎐를 포함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역치의 회복을 보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소음성 난청의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