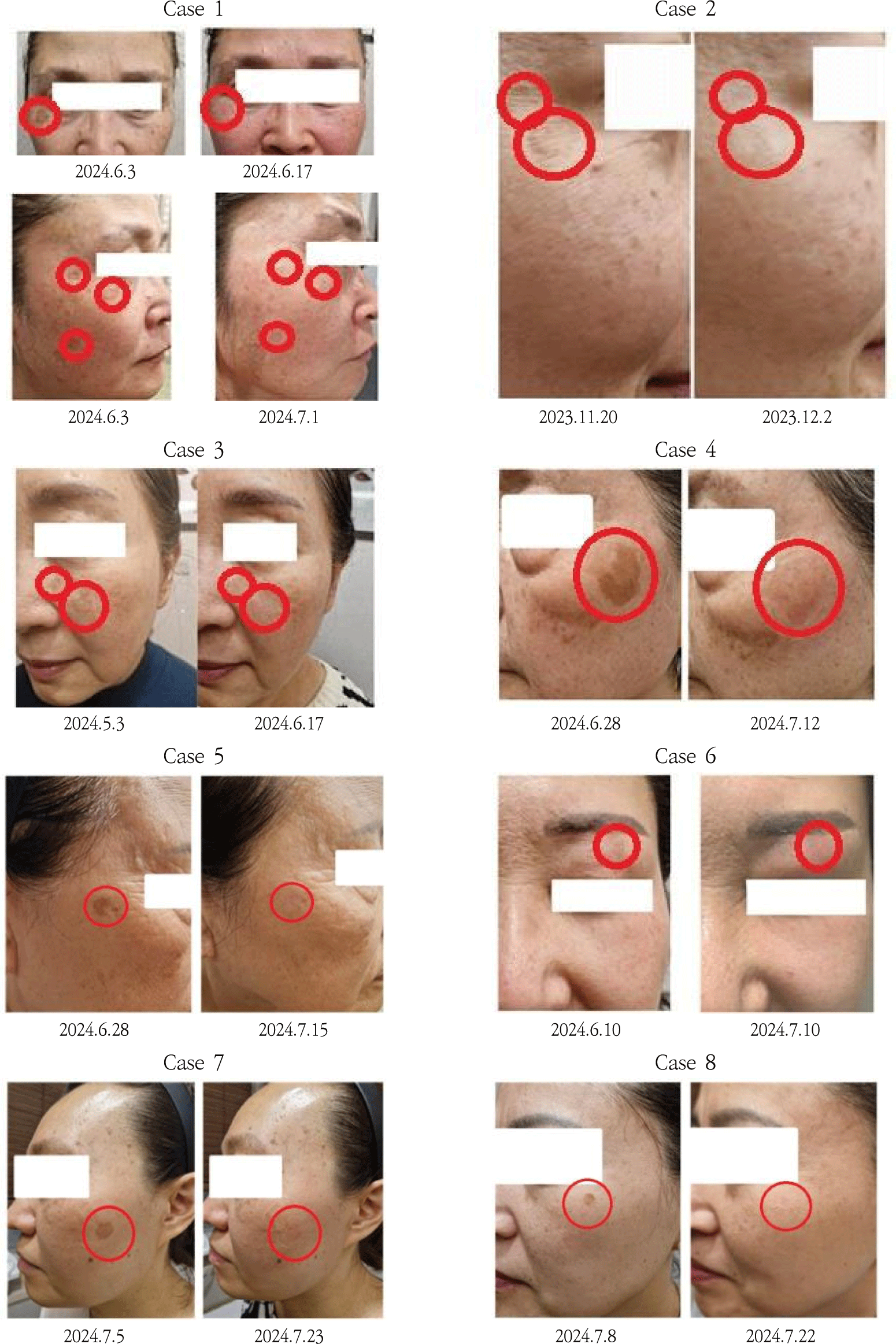Ⅰ. 서 론
일광성 흑자는 표피성 색소 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중 하나로 노화된 피부에서 자주 나타나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그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흑자의 발생에 큰 차이가 있으며 태양광에 대한 노출이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지만2), 유전적 감수성 변이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일광성 흑자의 치료에는 화학적 박피, 레이저, 강렬한 펄스 광선 및 냉동 요법을 포함한 국소 치료 등이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1차적 흑자 치료로 선택되고 있는 냉동요법보다 병행치료 내지 레이저 치료가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다4).
한의학에서는 흑자를 흑지(黑痣) 등으로 표현하였고 락법(烙法)과 소작구(燒灼灸)등의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에 대한 사례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전기를 이용한 고온의 열에너지 치료인 레이저 치료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5).
흑자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반면 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와 발표가 매우 부족하며, 한의계 역시 이에 대한 임상 사례가 거의 없어 본원에 내원한 흑자 환자에게 紫何車 약침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았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II. 증 례
흑자는 검버섯으로 불리우는 지루성 각화증이 일반적으로 밝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둥글고 약간 돌출된 병변임에 비해 표피가 주변 피부보다 색소 침착이 높은 작은 편평한 반점인 것이 특징이며 악성 흑색종의 불규칙한 경계와 고르지 않은 착색을 바탕으로 비대칭적인 양상인데 반해 규칙적이고 고른 색의 분포를 보인다6).
흑자의 정확한 진단은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임상에서 이를 통해 진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흑자로 오인되기 쉬운 지루성 각화증, 흑색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흑자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술 전후 사진을 통해 치료 부위의 개선 정도를 QIS(Quartile Improvement Scale)를 사용하여 개선 없음(0%, 0점), 불량(1%-25%, 1점), 보통(26%-50%, 2점), 양호(51%-75%, 3점), 우수(76%-100%, 4점)로 평가했고 주관적 만족도는 5점 척도(0=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로 조사하였다.
Q-switched ND:YAG Laser((주)엘트라 글로벌)의 532㎚파장으로 3㎜ spot size, Fluence 0.56-1.27J/㎠로 병변부위의 백화현상이 B정도로 나타나는 에너지로 1회 조사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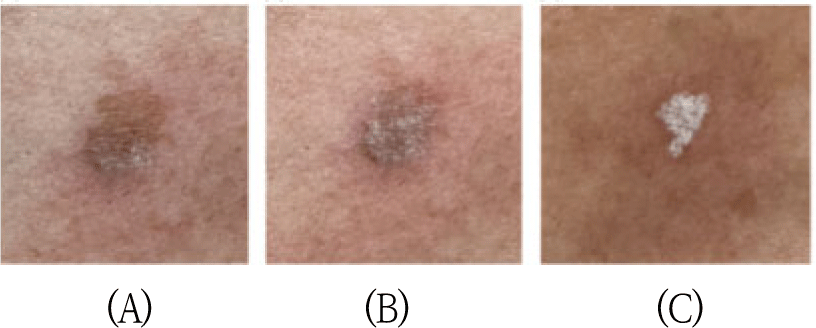
봄빛 공동 탕전실에서 조제한 자하거 약침액 10㏄를 27gauge x 1/2" (12.7㎜) needle과 5㏄ syringe(정림의료기산업㈜) 2개를 이용하여 환자의 앙와위 자세에서 좌우 양측 천추(天樞, ST 25)에 각 5㏄씩 주입하였다.
Ⅲ. 고 찰
일광성 흑자는 직경이 수 ㎜에서 1㎝ 이상까지 다양한 크기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과색소 침착성 반점이다7) 일반적으로 이러한 병변은 얼굴, 목, 팔뚝, 손등과 같이 햇빛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위치한다8).
흑자의 조직학적 소견은 멜라닌 세포의 증식과 기저층을 중심으로 한 색소 증가, 표피능선이 곤봉 모양으로 유두진피로 길어지는 표피증식을 특징으로 한다. 흑자의 발생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직 소견으로 멜라닌 세포의 증식에 의한 종양 혹은 과오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9).
이러한 병변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여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90%에서 발생하며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 가능성이 없으며 외관상의 문제일 뿐 의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10). 외국에서는 표준 치료법으로 액체 질소 냉동 요법을 권장하고 있지만11) 치료 중 통증, 발적, 물집 형성 및 상당히 긴 치유 시간 등의 불편함과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우려가 있다12). 최근에는 흑자 치료에 국소 제품이나 화학적 박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10,11,13) 그 중 Nd:YAG 레이저는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다14).
하지만 이9)는 흑자에 색소 레이저를 조사하면 멜라닌 세포가 먼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멜라노좀이 갖고 있는 각질형성세포와 멜라닌세포의 가지돌기가 먼저 손상되어 흑자의 치료의 목표조직인 멜라닌 세포가 발색단인 멜라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고 하였다.
흑자는 과색소 침착증의 하나로 멜라닌의 세포 증식이 원인이 되며15), 한의학에서 과색소 침착 질환은 발병부위 및 기타 분류에 의해 여흑반(黧黑斑), 작반(雀斑), 흑지(黑痣)로 나누어 다루고 있고16), 흑변병(黑變病)도 여기에 포함된다17). 여흑반(黧黑斑), 작반(雀斑)에 해당하는 최초의 기록은 《諸病源候論》 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한의학 임상에서 과색소 침착 질환을 질병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18).
흑자와 유사한 용어로 《外科正宗》에서 “黑子, 痣名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굴에 발생하는 검은색의 융기를 말하였다. 외과정종에서 말하는 흑지는 검은색의 융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현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흑자보다 검버섯으로 불리우는 지루성 각화증에 가까울 수 있으나 현재도 노인성 지루성 각화증과 일광성 흑자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9). 한편 Zheng17)은 안면, 경부 및 사지의 흑갈색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인 흑변병(黑變病)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화장품 자극으로 인한 염증이나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피부의 염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또한 “面部不善者去之.宜細銅管將痣套入孔內, 捻六七轉, 令痣入管, 一拔便去.有芝浮淺不能拔者, 用鍼挑損痣上”이라고 하여 얼굴에 생긴 색소 질환인 흑지를 가는 동관이나 침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 이미 160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병변의 직접적인 제거에 집중하여 열을 이용한 화침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하였다20).
이 등5)은 락법(烙法)과 소작구(燒灼灸)등은 활용하는 도구의 차이를 보일뿐 고온의 열에너지를 외과적 시술에 이용하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술법으로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높은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레이저, 전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고출력 레이저 수술기,고주파 수술기(BOVIE) 등으로 과거의 락법(烙法)과 소작구(燒灼灸)에서 발전되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紫何車 약침요법은 사람의 태반을 탈지처리 후 산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거대분자를 제거한 紫何車 가수분해물을 특정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紫何車와 침술의 효과를 결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일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1).
조 등22)은 紫何車 추출물을 경혈점에 주사했을 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영양작용, 조직 재생 작용 등이 있다고 하였고, Chang23)은 紫何車 추출물이 생체 내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세포외 기질 관련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여 피부를 재생시켜 노화를 방지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앞선 연구들에 기반하여 紫何車 약침이 과색소 침착 질환인 흑자 치료에도 유효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Q-switched Nd:YAG 레이저 치료와 紫何車 약침치료를 병행하였다. 흑자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532㎚ 파장의 레이저를 피부색의 변화를 관찰하며 병변 부위에 1회 조사하였고 이후 복부의 족양명위경의 양측 천추혈에 紫何車 약침을 각각 5㏄ 주입하였다. 복부의 천추혈을 주입점으로 선택한 것은 천추혈이 얼굴을 주행하는 대표적 경락인 족양명위경의 경혈점이고 복부의 지방층으로 인해 자입시 통증이 적어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시술 후 흑자 병변 부위에 듀오덤을 부착하여 2주 동안 유지하게 한 후 본 원에 내원하게 하였다. 저자가 직접 듀오덤을 제거하여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8 증례 모두 흑자 병변의 잔여물 없이 말끔히 제거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 2). 차후 흑자 병변 부위의 염증 후 색소침착(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PIH) 및 재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색소 변화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흑자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검버섯으로 불리우는 지루성 각화증 역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하였는데1), 본 사례의 환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나이가 40대 이상이었고 병력을 살펴본 바 출산 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적은 수의 임상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흑자에 있어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 여성 호르몬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