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수족냉증은 일종의 주관적 증상으로, 냉감을 느끼지 않을 환경에서도 손이나 발에 과도한 냉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인구집단, 특히 여성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약 20-30%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하다1,2).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陽虛, 脾胃虛, 腎陽虛, 氣血不足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 중 하나로 인식하여 수족냉증 및 관련 질환을 辨證하여 치료하고 있다3). 수족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1), 일종의 체질로 인식되기도 하여 다양한 질환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4,5). 최근에는 최 등6)이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수족냉증이 동반된 사례를 발표하였고, Flammer 등7)이 혈관조절 장애로 수족냉증과 이명 및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 증상 간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이명은 외부 소리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주관적인 청각 경험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청력 손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8,9). 《醫學入門》에서는 “耳鳴乃是聾之漸也”라 하여 이명과 난청을 경중을 달리하면서도 동반되는 증상으로 표현하였다10). 수족냉증과 마찬가지로 耳鳴, 耳聾 역시 寒熱, 虛實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脾胃虛, 腎虛에 해당하는 辨證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증상 간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8,11).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을 인구집단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족냉증과 주관적 청력 불편감, 이명, 그리고 난청 간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분석하여 그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자료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5기에 해당하는 2010, 2011, 2012년 총 3개년에 걸쳐 모집된 대상자 25,534명의 데이터이다. 대상의 선정 및 조사는 전국을 읍/면/동과 주택유형별로 나누어 19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당 20개 가구를 선택한 다음, 해당 가구원을 이동검진센터에 방문케 하여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를 받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https://knhanes.kdca.go.kr/knhanes/main.do)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부터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받은 주요 설문 및 청력검사, 계측 정보 값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단면연구로 수행되었다. 25,534명의 대상자 중 19세 미만인 5,935명, 가구소득, 직업, 체질량지수, 결혼상태, 음주, 흡연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누락된 2,155명, 수족냉증 설문 정보가 누락된 158명, 그리고 이명 및 청력 설문, 순음 청력검사 기록이 없는 1,336명이 제외되었고, 따라서 총 15,950명이 본 연구 대상자가 되었다(Fig. 1).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I-2409/009-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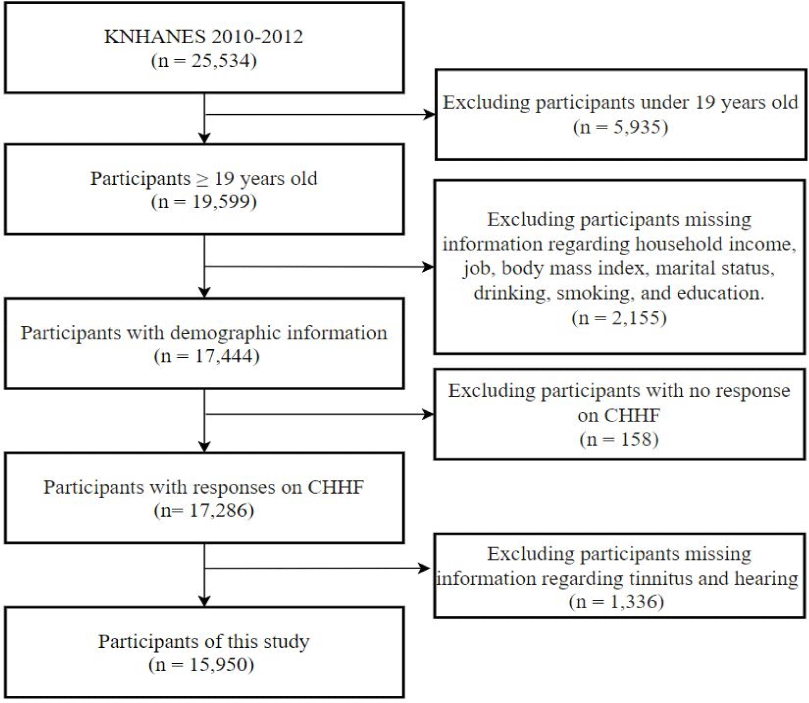
수족냉증 유무, 이명, 청력 불편감 정보는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족냉증은 증상의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이명은 최근 1년 내 이명 경험 유무를 응답한 뒤, 이명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불편하지 않다’/ ‘성가시고 신경이 쓰인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이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청력 불편감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의 청력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약간 불편하다’/‘많이 불편하다’/‘전혀 들리지 않는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조사자는 사전에 집체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질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청력검사는 순음 청력검사로 진행되었으며, 소음 차단을 위해 이중벽 구조의 청력부스에서 시행되었다. 자동화 청력기기(SA-203, Entomed, Malmö, Sweden)를 통해 양측의 청력 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사용된 주파수는 0.5, 1, 2, 3, 4, 6 ㎑로, 주파수별 청력역치(피검자가 50% 확률로 맞추는 최소 음의 강도)에 대한 값을 ㏈로 표기하였다. 난청의 판정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0.5, 1, 2, 3㎑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일측성 난청은 좌우 어느 한쪽의 청력 평균값만이 41㏈이상인 경우로, 양측성 난청은 좌우 모두 청력 평균값이 41㏈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12).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상태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도 응답률, 추출률, 인구 구조가 반영된 샘플 가중치가 적용되었다12,1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속형 변수인 연령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및 청력검사에서 각 주파수 결과는 t-test를 이용하여 추정된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그 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빈도와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검정이 사용되었다. 이명 및 청력 불편감, 난청에 대한 수족냉증의 오즈비(odds ratio, OR)를 추정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되었으며, 보정 변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보정(unadjusted, Model 1), 연령, 성별 보정(Model 2), 연령, 성별, BMI,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직업, 흡연, 음주, 거주지역 보정(Model 3) 모델로 구분하여 OR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software (version 29.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III. 결 과
수족냉증 그룹은 3,622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22.7%에 해당하였고, 그중 여성 비율 76.6%, BMI 22.55㎏/m2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여성 43.5%, BMI 24.01㎏/m2 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도 결혼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 직업, 흡연, 음주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반면 연령, 거주지역은 그룹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Values are given as weighted mean ± standard error or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age). P values were analyzed using weighted two-sample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Rao-Scott chi-square test for nominal variables. NCHHF: non-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CHHF: 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BMI: body mass index
청력 불편감에 대해 비수족냉증 그룹 중 89.0%가 ‘불편하지 않다’로 응답했으나 수족냉증 그룹은 85.5%만 ‘불편하지 않다’로 답하였다. ‘약간 불편하다’로 답한 비율은 비수족냉증 그룹에서 9.2%, 수족냉증 그룹에서 12.0%였으며, ‘많이 불편하다’로 답한 경우는 비수족냉 증 그룹에서 1.6%, 수족냉증 그룹에서 2.4%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01).
최근 1년 이내 이명을 경험한 경우는 비수족냉증 그룹에서 19.4%였으나 수족냉증 그룹은 28.1%로 더 높았으며(p < 0.001), 이명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성가시고 신경이 쓰인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이다’로 답한 비율이 수족냉증 그룹에서 각각 29.5%, 3.3%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27.5%, 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Table 2).
0.5㎑, 1㎑, 2㎑ 주파수에서 수족냉증 그룹의 역치 평균값은 각각 우측 15.00, 12.48, 14.83㏈, 좌측 15.80, 11.68, 14.84㏈로 비수족냉증 그룹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4㎑, 6㎑ 주파수에서 수족냉증 그룹의 역치 평균값은 각각 우측 19.53, 30.04㏈, 좌측 20.18, 31.24㏈로 비수족냉증의 우측 22.28, 31.34㏈, 좌측 22.93, 32.76㏈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0.5㎑, 1㎑, 2㎑ 세 주파수 항목의 평균값은 좌측, 우측 모두 두 그룹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측성 난청 및 양측성 난청 비율은 수족냉증 그룹에서 각각 6.6%, 3.8%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5.9%, 3.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Table 3).
Values are given as weighted mean ± standard error or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age). P values were analyzed using weighted two-sample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Rao-Scott chi-square test for nominal variables. NCHHF: non-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CHHF: 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무보정 모델(Model 1), 연령, 성별 보정 모델(Model 2) 및 연령, 성별, BMI,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 직업, 흡연, 음주, 거주지역 보정 모델(Model 3)에서 수족냉증 그룹은 비수족냉증 그룹 대비 이명에 대한 오즈비가 각각 1.624, 1.535, 1.493배 높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p < 0.001). 반면, 일측성 난청 및 양측성 난청은 세 모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청력 불편감 중 ‘약간 불편하다’에 대한 오즈비는 수족내증 그룹이 각각 1.350, 1.402, 1.411배로 높았으며(p < 0.001), ‘많이 불편하다’에 대한 오즈비 역시 각각 1.602, 1.719, 1.629배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반면 ‘전혀 들리지 않는다’에 대한 오즈비는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the complex sample. Non-cold hypersensitivity in the hands and feet group was the reference in all three models.
IV. 고 찰
수족냉증은 20-30%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그 증상 자체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1,2). 한의학에서는 陽虛, 脾胃虛에서 자주 관찰되는 주요 증상이기도 하며3), 최근에는 수족냉증과 여러 증상 및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4,5,14).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명 및 난청이 동반된 임상 증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6,7), 지금까지 이를 인구집단 기반의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 강영양조사 5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족냉증과 청력 불편감, 이명, 난청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족냉증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22.7%였으며, 이는 갤럽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수냉증 21.6%, 족냉증 23.0%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1). 또한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수족냉증 그룹은 비수족냉증에 비해 낮은 BMI, 높은 여성 비율을 보였고, 음주, 흡연, 소득수준, 학력, 결혼상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1,15). 하지만 흡연의 경우 다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갤럽 설문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수족냉증 그룹에서 흡연자 비율이 더 낮았으며, 남성으로만 국한된 경우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여전히 비율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1). 하지만 Chang 등의 연구14)에서 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족냉증 그룹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과 비흡연을 구분한 방법론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흡연/과거 흡연 또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Chang 등의 연구14)에서는 현재흡연/과거흡연 또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여 조사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담배에는 혈관 내피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산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상동맥에서 말초혈관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하지만 수족냉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흔하고, 여성의 흡연 비율은 남성과 비교하여 매우 낮기에 지금까지 흡연의 영향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향후 흡연이 수족냉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2에서 수족냉증 유무에 따른 이명 및 청력 불편감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명이 있는 비율은 수족냉증 그룹에서 28.1%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19.4%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청력 불편감은 수족냉증 그룹에서 ‘약간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로 답한 비율이 각각 12.0%와 2.4%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9.2%, 1.6%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보정한 logistic regress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족냉증 그룹은 비수족냉증 대비 이명 증상과 청력 불편감 중 ‘약간’ 또는 ‘많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오즈비가 유의하게 1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수족냉증과 이명, 난청의 발생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현 수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한의학적 辨證 이론과 이 증상들 간 공통적인 병리적 특징에 근거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명과 수족냉증은 같은 辨證機轉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黃帝內經》에서 實證과 虛證의 병기에 대해 모두 언급하고 있으나 “故胃中空則宗脈虛, 虛則下, 溜脈有所竭者,故耳鳴”, “故上氣不足, 腦爲之不滿, 耳爲之苦鳴”,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등 脾胃虛弱, 氣虛, 腎虛에 해당하는 기전을 강조하고 있고18,19), 김의 연구20)에서 한방병원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명 환자 중 脾胃虛弱型, 腎精虧損型, 肝火上擾型, 膽火壅結型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는 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20). 수족냉증 역시 《壽世保元》 ‘痼冷’에서 “脾胃虛弱 加食冷物 有傷脾胃 結其寒於臟腑不散 以至手足厥冷 畏冷憎寒 飮食不化 嘔吐涎沫 或大腸洞泄 或小便頻數 治法宜暖下元兼理脾胃”라 하여 脾胃虛弱의 기전을 강조하고 있으며21), 임상적으로 實證과 虛證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陽虛, 脾胃虛, 腎虛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3). 또한 권의 연구11)에서도 여성 수족냉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虛證에 해당하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수족냉증과 이명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신경 기능 부조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등의 연구22)에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명 환자에서 high frequency component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low frequency to high frequency raio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의 연구23)에서는 cold pressor test로 이명환자의 교감신경 과활성을 보고하였다. 수족냉증 원인 중 교감신경 과활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존재하기에24,25), 이 두 질환 간 연관성이 관찰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체성감각 시스템 기능 문제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체성감각 자극은 달팽이핵의 억제를 해제하고 청각 경로 내에서 흥분성 신경 활동을 생성하여 이명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26). 수족냉증은 손, 발의 과도한 냉각과민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증상 또는 증상을 유발하는 소인이 이명 발생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병과의 연관성도 공유하고 있는데, 악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나 편두통(migraine)이 있는 경우 이명의 빈도, 수족냉증의 빈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7-9). 이들 질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각과민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질환 간 연관성과 발생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난청은 그 병인 및 분류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다르고 辨證 역시 달라지는 경향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난청은 이명과 흔히 동반하며, 한의학적으로 耳鳴이 耳聾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8,9,30). 또한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경우 腎虛, 脾胃虛의 병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8,31), 자율신경의 문제 역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이명과 수족냉증에 연관된 병리적 특성이 상당 부분 난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32,33).
그 외에 난청과 수족냉증의 공통된 특징은 말초 혈류 조절의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Konieczka 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족냉증을 비롯한 제반 증상은 1차 혈관 조절 장애(primary vascular dysregulation) 가 있는 경우 관찰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손발만이 아니라 말초기관에 필요한 혈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34). 이러한 조절 장애에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가 endothelin-1인데, 몇몇 연구에서 난청이 있는 경우,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에 이 물질의 혈장 농도가 정상 그룹에 비해 상승한다고 보고되었다35,36). 또한 수족냉증과 주관적 난청을 동반할 수 있는 편두통 역시 혈관 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족냉증과 난청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말초 혈관조절 장애의 기전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28,37,38).
그러나 주관적 설문 결과와는 달리 순음 청력검사에서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족냉증에서 청력 역치 및 난청의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0.5㎑, 1㎑, 2㎑에서 청력역치가 수족냉증 그룹에서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4㎑와 6㎑, 그리고 좌측 3㎑에서 수족냉증 그룹의 청력역치가 비수족냉증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수족냉증과 청력 상태의 관계는 본 연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수족냉증을 비롯한 일련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민감성이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청력역치의 차이가 아닌 주관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7,34).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 역시 감각 과민성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인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안구건조증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고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역치가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한 임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3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수족냉증과 이명, 청력 불편감, 난청을 포함한 청력검사 결과를 단면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수족냉증의 유무를 설문 응답에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대상자의 연령, 건강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표현이 다양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찰에 따라 진단된 수족냉증 환자와 본 연구에서 수족냉증으로 정의된 대상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명과 난청을 평가함에 그 원인과 발생 양상에 따라 임상 경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순음 청력검사에 의한 난청의 진단 기준 역시 청력검사의 종류와 그 분류법에 따라 다양하며, 그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수족냉증과 청력 상태의 관계를 확인한 첫 연구이며, 이 증상 간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기존 辨證 이론의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성인 15,95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족냉증과 이명 및 청력 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향적 단면연구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족냉증 그룹은 22.7%에 해당하였고, 그중 여성 비율 76.6%, BMI 22.55㎏/m2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여성 43.5%, BMI 24.01㎏/m2 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도 결혼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 직업, 흡연, 음주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둘째, 청력 불편감에 대해 수족냉증 그룹은 ‘약간 불편하다’ 12.0%, ‘많이 불편하다’ 2.4%로 응답하여 비수족냉증 그룹의 9.2%, 1.6%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수족냉증 그룹에서 28.1%로 비수족냉증의 1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순음 청력 검사상, 0.5㎑, 1㎑, 2㎑ 주파수에서 수족냉증 유무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4㎑, 6㎑ 주파수에서 수족냉증 그룹의 역치 평균값은 각각 우측 19.53, 30.04㏈, 좌측 20.18, 31.24㏈로 비수족냉증의 우측 22.28, 31.34㏈, 좌측 22.93, 32.76㏈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일측성 난청 및 양측성 난청 비율은 수족냉증 그룹에서 각각 6.6%, 3.8%로 비수족냉증 그룹의 5.9%, 3.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넷째,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Model 3)에서 수족냉증 그룹은 비수족냉증 그룹 대비 이명에 대한 오즈비가 1.493배 높았으며, 청력 불편감 중 ‘약간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에 대한 오즈비도 비수족냉증 대비 각각 1.411배, 1.629배 높았다. 난청에 대한 오즈비는 그룹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