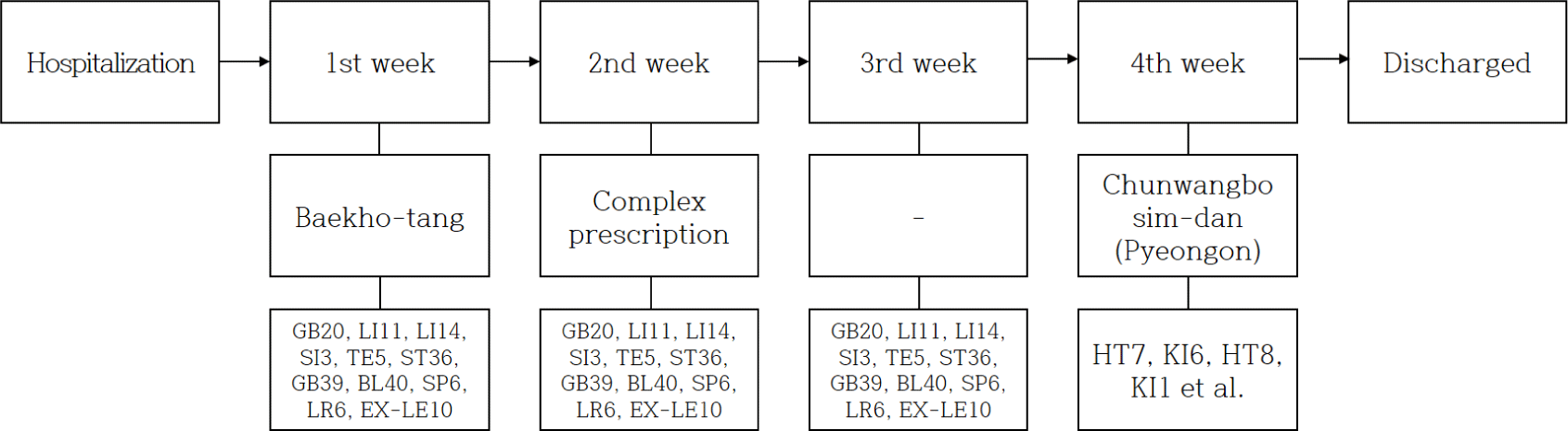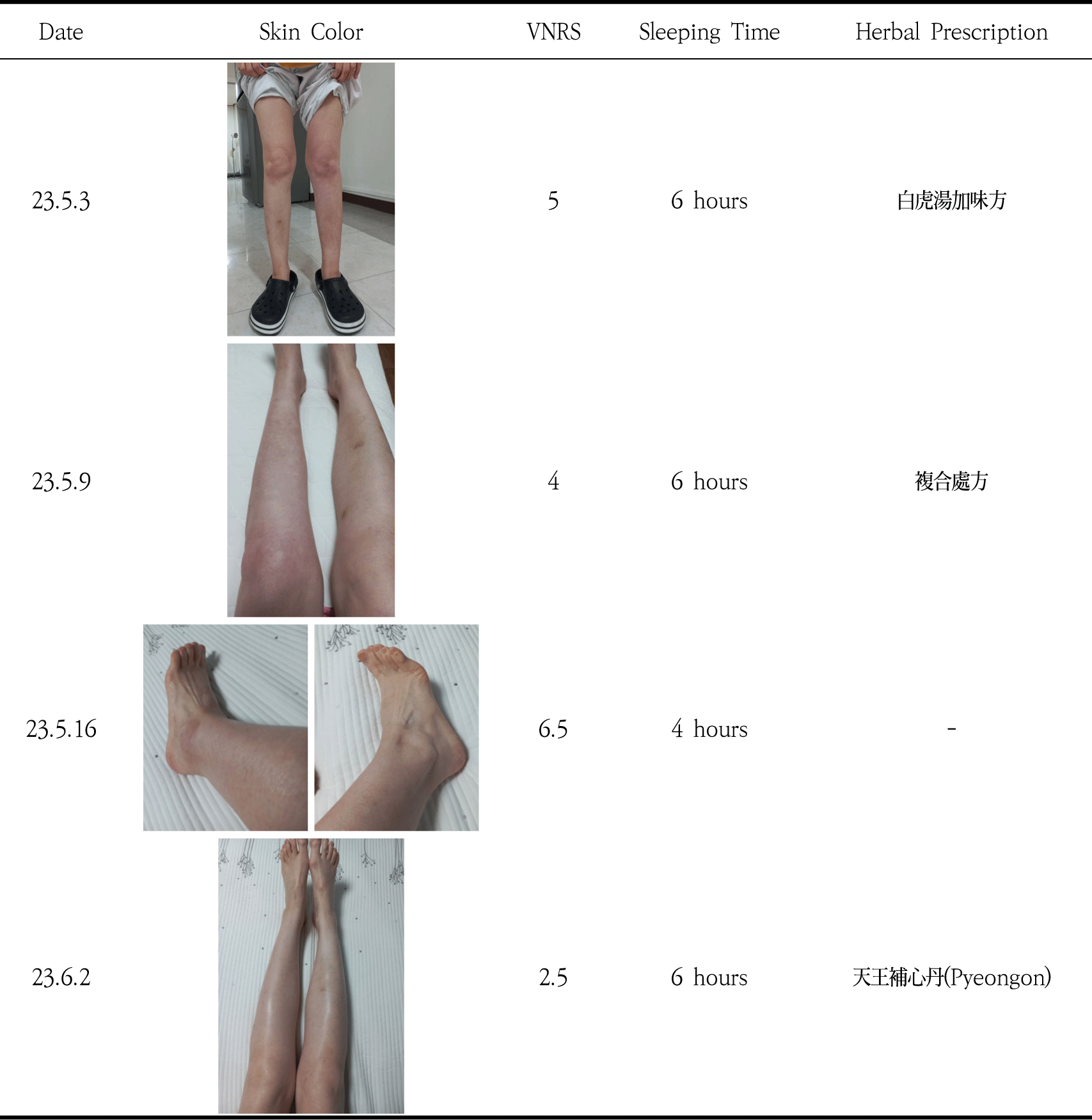Ⅰ. 서 론
반사성 교감 신경성 위축증 또는 작열통을 통칭하는 새 용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이 1994년 IASP 만성 통증 질환 분류에 처음 등장하였으며1)골절이나 외상 혹은 염좌나 화상 후에 생기며 명백하게 신경의 손상은 보이지 않는 CRPS Ⅰ형과 열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것을 CRPS Ⅱ형으로 구분하였다2).
CRPS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들의 기전은 외상과 연관된 cytokine, 교감신경 유지성 통증(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SMP), 신경인성 염증 증가와 만성적인 통증에 의한 중추 구조의 재구성에 의한 신경성형(neuroplasty) 등으로3) 이에 의해 사지에 자발통, 감각 과민, 이질통과 운동 장애가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혈류 및 발한, 그리고 피부, 손톱, 혹은 체모에서 나타나는 영양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4).
CRPS의 진단은 임상적 증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진단 기준으로 국제 통증학회(IASP)에서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2004년 Baron과 Janig가 제시한 제2차 진단 기준5)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Table 1). 인구 10만 명 가운데 26.2명이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년 이후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3배 이상 잘 발생한다6). 하지보다는 상지에 잘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타박이나 수술 후에도 종종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PS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치료나 운동 및 재활치료, 교감신경 절제술, 정신과적 치료, 척추 자극술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 면에서는 개인차가 있으며 제한적이다.
본 질환의 특성상 한의학적으로 CRPS와 일치하는 병명이나 증후를 정확히 찾기는 어렵지만, 통증의 복잡 다양성과 더불어 순환계나 영양계의 이상 변화를 보이는 양상 등으로 痛痺, 陽痺, 瘀血, 痲木, 痿症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CRPS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질통을 정형화하게 유발하는 동물 모델은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실험적 연구는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국내의 한의학적 연구 또한 질환의 희귀성 등으로 인해 봉약침이나 뜸 치료를 통하거나 통합적 한방치료에 의한 호전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형편이다7-9).
이에 저자는 좌측 발목의 골절로 인한 수술 시행 이후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색의 변화와 피부 온도의 변화, 움직이거나 자극이 있을 경우 심해지는 작열통과 통각 과민 등을 주소로 하는 CRPS 추정 환자에 대해 한방 치료를 시행하여 경도의 호전과 더불어 관련된 증후의 변화상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Ⅲ. 증 례
본 증례는 환자에게 개인정보를 비롯한 의무기록 및 촬영한 사진에 대해 그 목적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한 후 작성하였다.
-
1) 성명/성별/연령 : 이○○(F/56)
-
2) 재원 기간 : 2023.05.02-2023.06.03
-
3) 진단명 : R/O CRPS
-
4) 발병일 : 2022년 11월
-
5) 주소증 : 좌측 하지통 및 감각 이상, 전신 유주통, 우울증
-
6) 과거력 : none
-
7) 가족력 : 아들이 성인형 아토피로 인해 현재 약물 복용 중
2022년 11월 중순 경 왼쪽 발목 골절로 인해 2차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별다른 상황 발생하지 않다가 약 2주 후인 11월 말부터 수술 부위인 좌측 발목 부위 통증이 시작됨. 이러한 통증 양상이 지속되다가 2023년 2월경부터는 오른쪽 발목의 경미한 통증을 비롯하여 양측의 하지를 번갈아 침습하는 작열감을 동반하는 양상의 통증이 발현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족부 전문 2차 병원 내방하여 산소흡입 시술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증상 더욱 심해짐. 당시 전신 CT나 MRI, 혈액 검사상의 염증 소견 등은 정상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점점 심화되어 3월경부터는 상지부 말단 부위나 족저 부위에 작열감 심화되어 4월경 아주대 병원 내원 후 입원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 시행하였으나 큰 변화 나타나지 않아 본원에 내방함.
-
① 환자의 가장 큰 불편함은 작열통이었는데 그 양상은 전신 유주성으로 “마치 촛농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만큼 통증이 상당히 심각함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사지 말단부나 족저 부위를 중심으로 작열감이나 통각 과민이 심했다. 하지의 피부색은 靑紫色으로 전형적인 혈액순환 장애의 징표를 보였으며, 발한은 없었지만, 증상 발현 시 전신의 열감을 호소하였는데 이 경우 설질이나 설태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맥상은 弦細에서 弦數으로 변화함을 감지할 수 있었다. 통증이 심화되었을 경우 경항부의 긴장도가 고조되며 불면과 우울 등을 동반하여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
② 활력 징후는 혈압 130/80㎜Hg, 체온 36.5℃, 맥박 75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정상
-
③ 수면 : 증상 없을 때 평균 6시간/일로 정상이나 통증이 발현하면 상응하는 천면 혹은 불면 양상
-
④ 방사선, 신전도, 검사실 소견 : Nonspecific
환자의 주소증으로 가장 큰 것은 “뜨거운 촛농이 온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하다”였는데 입원 2일째 오후부터 본 증상이 나타나서 淸熱生津의 목적으로 白虎湯(Table 2)에 桂枝와 竹茹, 그리고 葛根을 가하여 복약시켰다. 桂枝는 골절통이 혈류 장애로부터 비롯된 일반적 관점과 더불어 裏熱證을 호소하면서도 피부색이 靑紫色을 띠는 裏熱表冷의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며, 竹茹는 淸心熱, 葛根은 降胃熱 및 生津 작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가미하였다. 환자는 통증으로 인한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경도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 통증이 심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 본 처방과 더불어 침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침은 0.30×0.40㎜의 일회용 호침(동방침구사, 한국)을 사용하였고 유침 시간은 1회에 20분을 예정하였지만 자극에 의해 상기의 불편함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발침하였다. 경혈은 祛風解表의 효능이 있는 風池(GB20), 疎風淸熱의 목적으로 曲池(LI11), 通絡止痛의 목적으로 合谷(LI4), 祛風解表의 목적으로 後谿(SI3), 祛風止痛의 목적으로 外關(TE5), 健脾降火의 목적으로 足三里(ST36), 平肝熄風의 목적으로 懸鍾(GB39), 舒筋通絡의 목적으로 委中(BL40), 調肝腎의 목적으로 三陰交(SP6), 平肝疏通의 목적으로 太衝(LR6) 등을 위주로 취혈하였고 泄熱 작용이 있는 八風(EX-LE10)도 자극하였다10).
| Herbal Name | Scientific Name | Amount (g) |
|---|---|---|
| 石膏 | Gypsum Fibrosum | 20 |
| 知母 | Anemarrhenae Rhizoma | 8 |
| 甘草 |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 4 |
| 粳米 | Oryzae Semen | 8 |
| Total | 40 |
입원 초기의 적응 기간이었지만 감정의 동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기간 VNRS는 1에서 7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5 정도로 진술하였다. 심한 통증이나 상흉부를 비롯한 답답함에 의해 야간 수면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가 하루 있었던 영향으로 수면 시간은 기복이 있는 편이었지만, 극심한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주간 수면을 포함하여 평균 6시간 이상 유지하였다.
이 기간 특징적인 점은, 상기의 침 치료에 의해 증상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을 진술하였으나 背兪穴의 경미한 刺絡에 대해 심한 과민성 불편을 호소하였다는 점으로, 이 또한 자극에 민감한 본 질환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후 자락요법은 시행하지 않았고 침 치료 시 유침 시간을 20분에서 10-15분 정도로 단축하였다.
환자는 족부에 극한의 열감과 이상 감각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침 치료 후 수족부의 작열감은 호전되었으나 두부의 압박감이나 조이는 증상을 토로하였으며 한약 처방을 변경하였는데, 하지부의 극심한 작열감과 상부의 압박감이 근골이나 피부의 자양이 부족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肝腎의 精血을 보충하고 전신의 기혈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를 위한 본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구성 약물을 살펴보면 補陽, 補氣, 補血의 목적으로 人蔘, 拘杞子, 黃耆, 肉蓯蓉, 鹿茸을 선용하였고, 하지의 경락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强筋骨, 去痛을 위해 牛膝, 五加皮, 獨活, 續斷 등의 본초를 선용하였다.
한약 처방을 변경하기 이전 주초에는 종종 VNRS가 7을 기록할 만큼 통증에 대한 조절이 미흡한 상황이었고, 두부나 경항부의 압박이나 견인감 또한 심했기에 肝腎의 精血을 보충하여 사지의 혈류 개선이나 자양을 도모하고자 變方하였다. 복약 후 2일간 환자는 증상의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3일째부터는 “작열통이나 두항부의 불편함이 조금은 가라앉았음”을 진술하여 이 기간 중후반에는 동일 약제를 계속 복용시켰다. VNRS는 2에서 6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變方 후 평균 4 정도
로 평가되었다. 수면 또한 증상의 호전에 비례하여 주간 수면을 포함하여 6시간 이상 유지하는 정상적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에 환자의 증후적 특징의 변화는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나와서 온 몸을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으로 이전에 비해 작열감의 발원지가 상흉부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흉부의 煩燥 및 열감으로 인하여 수면 시간은 7일 중 3일은 4시간 이하로 내려가서 다음 날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감정적인 변화도 심해져서 우울이나 불안의 강도는 한층 가중되었다. 환자는 매일 아침 하지 피부색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에 따른 자각적인 증상을 진술하였는데, 靑紫色의 색조가 진해질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족저부의 열감이 심화됨을 진술하였다. 전 주에 비해 통증은 심화되어 VNRS는 평균 6에서 7 사이를 기록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심계, 불안, 흉민 등이 부수적으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상은 弦數이나 緊數脈으로 상응하게 변하였으나 설질이나 설태는 변화상을 보이지 않은 점이 특이하게 인식되었다. 약물의 복용이나 침 치료 후 증상이 가중되는 자극 민감 현상도 발생하여 기간 후반에는 소량의 섭식 외 일체의 치료를 중단하였다.
3일간 환자의 자극 민감 등으로 인한 치료 중단 후 탕약에 대한 환자의 회피 경향에 따라 복약의 부담을 덜고자 天王補心丹을 원료로 한 평온(한풍제약, 서울)을 1일 3회 복용시켰으며, 아울러 침 치료는 安神을 위해 神門(HT7), 照海(KI6) 그리고 煩燥性 작열감의 해소를 목적으로 少府(HT8)와 湧泉(KI1)을 선혈하여 오전에 약 10분간 유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상기 경혈 중 선택적으로 취혈하였다. 처치 후 익일부터 환자는 경미하지만, 정신적 안정감의 호전과 함께 통증의 감소를 진술하
였다. VNRS는 5로 기록되었고 수면도 5시간 정도 유지되어 5월 25일부터는 평온 대신 天王補心丹(Table 4)을 탕전하여 복용시켰다. 환자의 안정 상태는 계속 유지되며 증상은 한층 호전되어 탕약 복용 2일째에는 VNRS 2-3, 그리고 수면 평균 6시간 유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하지 피부색의 변화상도 우측과 좌측 하지의 색조 차이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였고 족저의 열감도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정도로 줄어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던 중 6월 1일에 환자의 제반 증상이 일시적으로 오후에 악화되어 VNRS 6으로 기록하였고 당일 저녁 수면도 4시간에 머물렀다. 퇴원 하루 전인 6월 2일 환자는 VNRS 4로 회복되었고, 하지 피부색의 특이한 변화 없이 전신의 유주성 작열감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표현하였다. 익일 아주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정기 검진을 위해 퇴원하였는데, 입원 후 검사를 고려하여 퇴원약으로 탕약 대신 평온을 처방하였다. 약 일주일 후 전신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는 회신과 함께 환자 본인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증상의 악화를 두려워 거부한 bone scan 외 각종 검사에서도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이 후 3회의 외래 진료에서도 天王補心丹 탕약 혹은 평온에 의해 비교적 안정된 여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2).
Ⅳ. 고 찰
1864년 Silas WeirMitchell이 총상으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은 후 나타나는 타는 듯한 통증을 ‘causalgia’라고 명명한 후, 1994년 국제 통증 연구학회에서 침해 자극 후 발생하는 피부색과 체온의 이상 변화, 발한 장애, 부종 등을 동반하는 국소 부위의 통증과 이상 감각을 초래하는 질환을 CRPS라 정의하였다11).
이 질환의 원인이나 진단, 치료에 대한 연구나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원인 규명이나 치료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상황으로 그 치료의 목표는 조기 치료를 통해 환자를 직능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는 극심한 통증 뿐 아니라 심한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CRPS의 진단 기준으로 IASP와 더불어 DITI, 정량 감각 검사(quantative sensory testing: QST), 단순 방사선 검사, 정량 땀 분비 축삭반사 검사, 3상 bone scan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진단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12). DITI는 혈행성 질환이나 신경병성 변화의 진단에 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0.6℃ 혹은 1℃의 온도 차이를 비정상의 잣대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13) CRPS에서 촉각 및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시상(thalamus)에서 침해 자극에 대한 처리의 기능적 장애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확실한 기전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황이다14).
한의학적으로 CRPS의 범주는 증후적으로 통증과 감각 이상, 순환 장애에 해당하는 痺證, 麻木, 痿證이나 瘀血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본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골절, 외상, 수술 등은 瘀血로 인한 痺證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영양성 변화에 의해 痲木이나 痿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열통은 陽痺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증례의 환자도 瘀熱互結에 의한 陽痺로 판단된다. 본 질환에 대한 치법으로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疏通經絡과 行氣祛瘀活血을 위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補氣除痛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울러 정신적인 불안감의 해소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CRPS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50대 중후반의 여성이었으며 골절 이후 발생한 작열통과 전신에 유주하는 작열감, 그리고 상흉부나 두경부 위주의 압박감을 가장 힘들어 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도 심한 편이어서 CRPS의 전형적인 증후를 보여주었으나 이전에 내원했던 3차 병원에서 확진 소견은 받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였다. 이는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 소견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영향도 있겠지만, 본 질환을 진단하는 객관적 도구가 정립되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피하에 靑紫色 瘀斑이 있었는데 이의 색조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증상은 한층 심화됨을 보여주었고 이때 전신의 열감을 호소하였으나 체온은 정상 범위로 측정되었다.
입원 초기에 사용한 白虎湯加味方은 전신에 유주하는 작열통을 瘀熱互結證에서 기인하는 陽痺로 판단하여 淸熱生津을 통해 증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처방이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증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침 치료도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물리적 자극에 오히려 불편감이 심화되는 자극 민감 현상이 가끔 나타났으며, 특히 泄熱을 위한 委中(BL40)이나 曲澤(PC3) 혹은 背兪穴 刺絡 이후 증상이 한층 가중되어 발현하였다.
이에 처방을 변경하였는데, 족저를 비롯한 사지 말단과 두경부의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호소하였기에, 水昇火降과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약재를 위주로 복용시켰다. 이는 肝, 脾, 腎을 보양함으로써 四肢에 滋養을 할 수 있는 精血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는데 처방이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하여 환자는 한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각종 증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아 통증의 강도나 수면 시간이 치료의 기대치에 근접하는 상황이 유지되던 중, 특별한 동기가 없이 환자는 상흉부나 두항부에서 기시된 작열감이 반대로 하지로 내려가서 족저부의 열감이 심화되는 새로운 양상의 증후와 함께 좌측 하지의 색조도 심층 짙어지는 증상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환자의 번민감을 극도로 악화시켜 불면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天王補心丹을 투약하게 되었고 침법으로는 安神과 泄熱을 위한 單刺法을 시행하였다. 본 처치는 환자의 증후를 일정 기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煩燥로 인한 제반 증상을 개선시켰고, 하지 변색 또한 양측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타 병원으로의 검사를 위한 퇴원으로 인해 입원 중 관찰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외래에 3회 내원하였을 때도 天王補心丹 제제약에 의해 비교적 큰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의 직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본 증례 연구를 통해 극심한 통증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CRPS의 전형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작열통이나 이상 감각, 사지 유주 순환의 변화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피부 색조의 변화나 불안, 우울, 그리고 수면 장애 등 전신의 많은 영역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본 질환의 특질을 실감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학적 치법이 본 질환으로부터의 고통을 심신적으로 경감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골절 후 발생한 CRPS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증례 연구를 통해 주관적인 지표를 통한 통증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수면 시간이나 피부색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바 한의학적 처치가 일정 부분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 정신과적 처치를 경험하는 본 질환에서 불안과 우울 등을 개선하는 調神 및 사지로의 영양을 滋養함으로써 전신의 유주를 원활하게 하는 처치가 증상 완화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향후 치료적 접근에서 보다 많은 증례의 수집과 장기적인 추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