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약시는 안구의 이상이나 신경학적인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교정시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시약시(strabismus amblyopia), 굴절약시(refractive amblyopia), 시각차단약시(visual deprivation amblyopia), 차폐약시(occlusion amblyopia)로 분류된다1). 이중 소아에서 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시는 굴절약시에 해당하는데, 망막오목에 시상을 적합하게 맺히지 못해 대뇌로 시각 자극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안경을 통해 시상을 잘 맺히게 하면 많은 경우 약시는 호전이 된다2). 다만 환아의 순응도가 낮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안과 영역에서 침은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침의 비특이적인 효과로는 항염증 작용, 국소 혈류속도 증가 작용이 대표적인데, 이는 안과 영역에서도 역시 보고되어 안구건조증, 망막색소상피증, 망막분지정맥폐쇄증에 침의 유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3). 이외에도 침 자극은 시유발자극전위(VEP, Visual evoked potential) 검사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시신경질환에도 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 또한 부동시성약시에서 차폐요법보다 침 치료가 더욱 유효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5). 하지만 기존 굴절이상약시 연구들은 Best corrected visual acuity(BCVA)로 증상 호전을 평가하였을 뿐 굴절약시에서 실제 굴절 이상이 호전되는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시로 인해 발생한 약시 환아를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침 치료를 통하여 시력 호전 및 난시의 호전을 확인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상기 환자 유아 검진 상 우안 시력이 저하됨이 관찰되어 타 안과에서 검사상 사시를 비롯한기타 기질적 안과 질환은 없었으며, 난시 및 약시로 진단받아 안경을 처방받았다. 이에 한방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
치료기간은 2014년 5월 24일부터 2018년 4월 28일이었으며, 일주일에 1-2회씩 지속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침 치료는 일회용 스테인레스호침(0.25㎜×40㎜ 동방의료기, 보령,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양측 合谷(LI4), 睛明(BL1), 攢竹(BL2), 陽白(GB14), 絲竹空(TE23), 太陽(EX-HN5), 四神聰(EX-HN1) 및 四白(ST2)에 자침한 후 15분간 안면에 경피적외선을 조사하며 유침하였다. 침 치료 후 별다른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평가는 6개월마다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Shin-Nippon ACCUREF-K 9001, Japan)를 통한 자동굴절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 및 부모의 동의하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침 치료를 수행하였다. 초기 내원 시 나안시력은 0.1/0.7(OD/OS)이었으며, 자동굴절검사상 우안은 Sph. +0.00D, Cyl. -2.25D, AXIS 148°, 좌안은 Sph. +0.00D, Cyl. –0.25D, AXIS 49°이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우안의 시력이 점차 호전되었으며, 난시 도수 또한 2015년 5월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4월경에는 우안의 나안시력은 1.0이었으며, 자동굴절검사상 우안은 Sph. +0.00D, Cyl. -0.50D, AXIS 146°이며 좌안은 Sph. -0.25D, Cyl. -0.50D, AXIS 154°이었다. 1년 뒤인 2019년 3월에 나안시력을 재차 측정하였을 때 0.9/1.0(OD/OS)으로서 시력이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었다(Fig. 1,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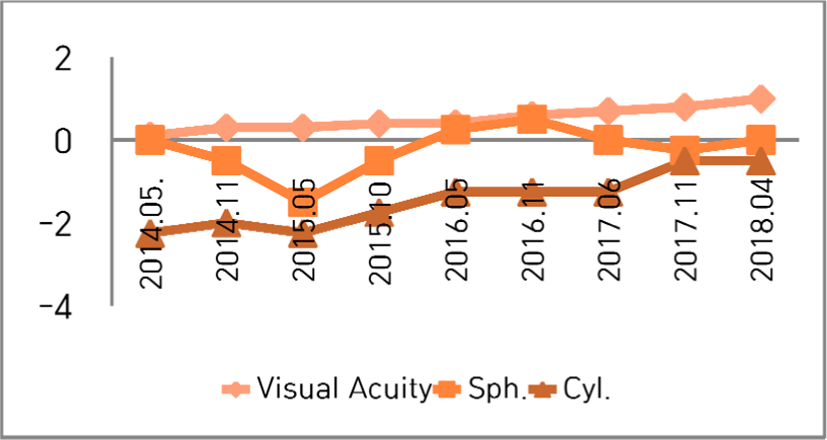
Ⅲ. 고 찰
약시는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시자극에 의한 형태시 형성의 결핍이나 양안의 상호 견제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 저하를 의미한다. 태생 시 영아들은 대개 고도원시 및 난시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굴절이상은 보통 생후 24개월 내에 교정된다. 그러나 생후 36개월 이후로는 난시 도수에서 큰 변동을 기대할 수 없다6). 따라서 정상시력 획득을 돕기 위해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안경 처방이나, 더 나아가서는 가림 치료, 처벌 치료 등을 이용하여 약시안의 사용을 유도하기도 한다7). 본 증례의 환아는 –2.25D의 고도 난시를 가졌으나 39개월 월령이었기에 자연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였다. 최근 대한안과학회지에서 보고된 바로 임상에서 2.01±1.90D를 기준으로 안경처방을 시행하며7), 본 증례의 환아 또한 안경 처방을 받았으나 착용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 치료를 시도하였으며, 검사 결과 상 호전을 보여 본 증례를 보고한다.
본 증례의 특이한 점은 환아 우안의 시력 회복과 더불어 난시도수가 1.75D 가량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굴절이상약시 환아의 침 치료 효과 연구는 안경을 사용한 환아에게서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한 연구였으며5,8), 침 치료를 통한 안구 자극의 빈도 증가가 시력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안경 착용 없이 침 치료만으로 굴절 이상 자체의 변화를 동반한 시력의 회복을 보였으며, 이에 침이 단순히 자극을 주는 것을 넘어서 굴절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굴절이상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각막의 굴절력과 안축길이가 있다. 근시와 원시는 안축길이, 굴절력에 모두 영향을 받지만, 난시의 경우 각막의 굴절력과 크게 연관된다. 난시 환아에 대한 침 치료 임상연구 보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지만 근시 환아에 대한 침 치료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9). 여기에서 침 치료가 환아의 시력 저하는 억제할 수 있었으나 안축 길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침 치료는 안축길이보다는 각막의 굴절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본 증례의 환아가 근시의 회복뿐만 아니라 난시 시력의 회복을 보인 것 또한 각막의 굴절력에 대한 침 치료의 개선 효과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침 치료가 안구 주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氣血 순환을 촉진하여 각막의 굴절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본 증례는 치료 기간이 4년 정도로 긴 편이었으며, 치료 기간 동안 다른 여러 요인이 시력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난시 도수 측정결과가 불충분하다. 본 증례에서는 자동굴절검사 결과 검사 수치의 변동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막곡률계, 각막지형도검사, 안축길이 측정 등의 정밀검사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굴절검사 시에도 조절마비제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검영법을 덧붙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D 가량의 난시도수 호전은 측정오류라고 보기에는 큰 수치이며, 6개월 간격으로 확인한 검사 결과상의 변화가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며, 도수의 호전 또한 동반되었다는 사실에 말미암아, 상기한 검사방법 상의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환아의 호전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증례 보고가 향후 약시 환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연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더해서, 현 의료정책 내의 한의 임상에서는 검사기기의 활용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