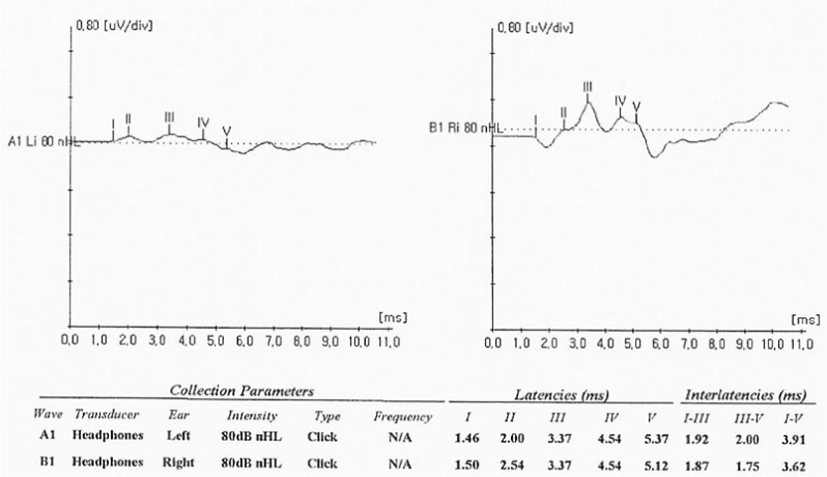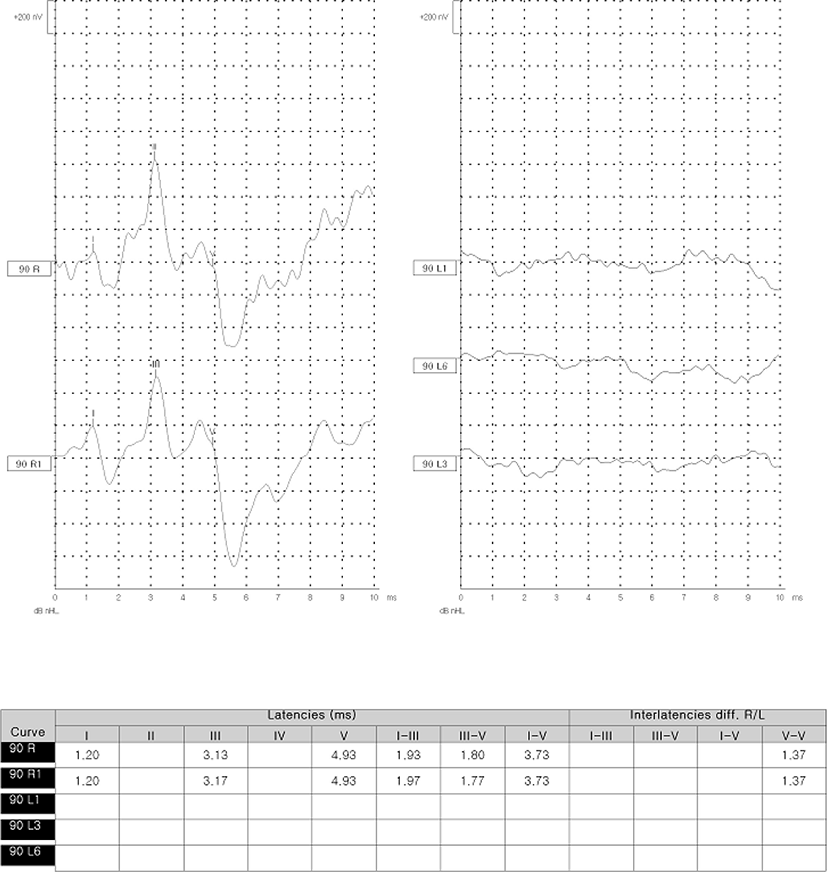Ⅰ. 서 론
청신경 종양(vestibular schwannoma)은 8번째 뇌신경인 전정와우신경 분지의 수초성 슈반세포(myelinating schwann cells)에서 생기는 양성 신경초종이다. 두개내 종양의 8%를 차지하며, 성인에서 소뇌교각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하다. 청신경 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기 공명 영상의 발달과 광범위한 사용으로 매우 작은 청신경 종양도 진단되고 있어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70년도에는 10만 명당 1명이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만 명당 3-4명 정도로 보고된다1).
순음 청력 검사 및 어음 청력 검사로 후미로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고, 청성 뇌간 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검사가 청신경 종양의 선별 검사로 많이 사용되어왔으며2), 진단을 위한 표준 검사는 두부 가돌리늄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이용한다3).
청신경 종양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환자의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동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그 외 최대 61%에서 어지럼증과 균형감 소실이 나타날 수 있고, 51%에서는 비대칭적인 이명이 나타난다3).
특발성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순음 청력 검사에서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될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이명이나 이충만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약 20-60%에서 동반된다.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50-60대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연간 유병률은 10만명당 8-15명 정도로 보고된다4).
청신경 종양과 특발성 돌발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역학은 비슷하지만 치료 방법이 다르므로 특발성 돌발성 난청 진단 시에는 청신경 종양과의 감별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청신경 종양이 나타날 가능성은 1%에서 5% 사이로 보고되고 있다5,6).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돌발성 난청을 주소로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전에 방문한 병원에서 특발성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2차적으로 내원한다. 이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간과할 수 있으며,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전 병원에서 비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포함한 여러 검사 후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오인되고, 본 병원에서 기존 검사 결과 검토 시 후미로성 병변이 의심되어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진행 후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받은 1례를 경험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Ⅲ. 증 례
-
대상 : 김OO, 46/F
-
주소증 : Lt. hearing loss, Lt. earfullness, Dizziness, Lt. Upper trapezius pain
-
현병력
2020년 3월 15일 기상 후 이충만감 발생하였고 당일 오후 어지럼증 및 구토 발생함. 익일 아침 회전성 현훈으로 보행 불가하여, local ER 내원하여 Br-MRI (unenhanced)상 Within normal limit 판정. 2020년 3월 16일 – 2020년 3월 23일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치료 하며,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및 고실내 스테로이드(dexamethasone) 주입술 5회 시행함. 2020년 4월 17일 지역 소재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청력 검사만 시행 후 별무 치료. 2020년 4월 23일 지역 소재 한의원 내원하여 침 치료 및 한약 복용함. 2020년 5월 4일 본원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 내원하여,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입원하여 집중 치료 시행함.
-
과거력 및 가족력 : none
-
복용 중인 약물
-
계통적 문진
-
① 영상검사(2020년 3월 16일)
[검사방법] Axial DWI, T2, T1, FLAIR, sagittal T1, intracranial-neck TOF MRA / unenhanced
[판독소견] No evidence of hemorrhage, infarction, mass, hydrocephalus, atrophy in the brain. No evidence of stenosis, o㏄lusion, aneurysm on MR angio.
-
② Puretone audiometry (PTA) (Table 1)
-
③ Evoked Potential Report (2020년 3월 16일) (Fig. 1)
-
① 영상검사 (2020년 5월 16일) (Fig. 2)
[검사방법] MRI for temporal bone with enhancement
-
② Puretone audiometry (PTA) (Table 2)
[판독소견] Probable vestibular schwannoma, left size : about 0.8 ㎝ with involvement of IAC fundus. Others, unremarkable
-
③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 (ABR) (2020년 5월 15일)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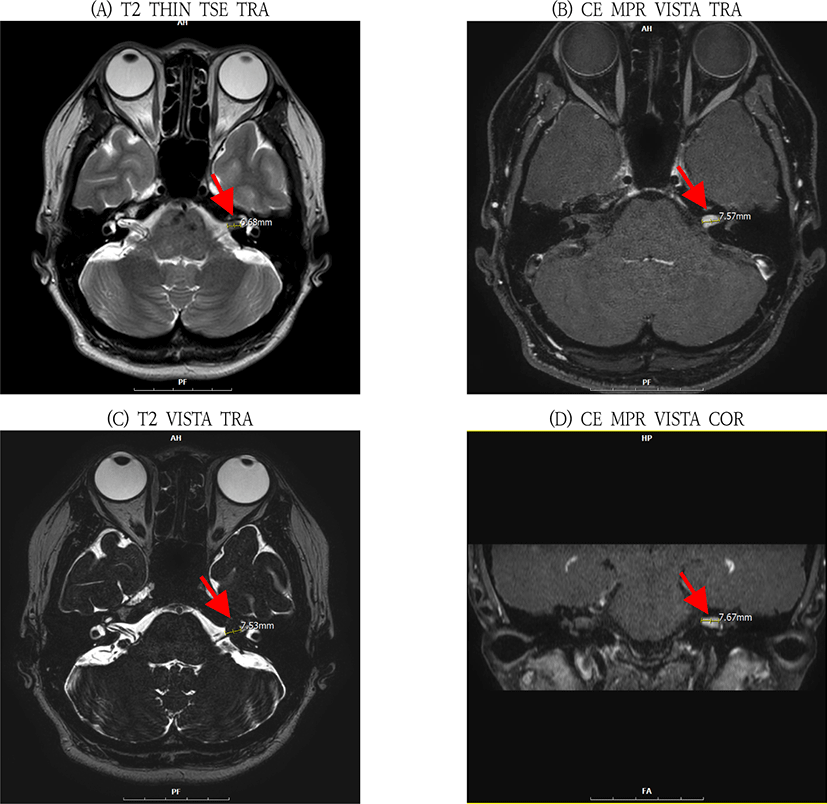
| Date\Hz | 250 | 500 | 1k | 2k | 4k | 8k | PTA (R/L) |
|---|---|---|---|---|---|---|---|
| 20.5.08 | 75 | 80 | 90 | 85 | 75 | 90 | 8/85 |
| 20.6.17 | 80 | 80 | 90 | 85 | 75 | 85 | 13/85 |
-
① 2020년 5월 7일 – 2020년 5월 19일 加味逍遙散을 加減하여 2첩을 3팩으로 팩당 120㏄씩 1일 3회, 식후 2시간 복용하도록 하였다.
-
㉠ 2020년 5월 7일(치료 1일 차) : 입원한 당일로 탕약 조제가 어려워 加味逍遙散 보험제제약으로 2포씩 식후 2시간 복용하였다.
-
㉡ 2020년 5월 8일(치료 2일 차) : 加味逍遙散(當歸 6g, 茯笭 白朮 芍藥 柴胡 각 6g, 牧丹皮, 梔子 각 4g, 甘草 3g, 薄荷[後下] 乾薑 각 2g)
-
㉢ 2020년 5월 9일 – 2020년 5월 13일(치료 3-7일 차) : 加味逍遙散 加 酸棗仁, 柏子仁 각 3g
-
㉣ 2020년 5월 14일 – 2020년 5월 19일 아침(치료 8-12일 차) : 加味逍遙散 加 酸棗仁, 柏子仁 각 3g 大腹皮, 木香 각 2g
-
-
② 2020년 5월 12일 – 2020년 5월 19일(치료 6-13일 차) : 癒風丹(蜂蜜 1.24g 金箔 1.03g 大棗 1.01g 山藥 0.38g 炙甘草 0.27g 神麴(炒) 蒲黃(炒) 人蔘 각 0.14g 大豆黃卷 阿膠 肉桂 烏犀角 각 0.1g, 白朮 白芍藥 當歸 黃芩 麥門冬 防風 각 0.08g 白茯苓 川芎 桔梗 杏仁 柴胡 각 0.07g 牛黃 龍腦 羚羊角 각 0.05g 白蘞 柏子仁 乾薑 石菖蒲 麝香 酸棗仁 각 0.04g)을 丸劑로 하여 1일 1회 1환, 기상 후 복용하도록 하였다.
일회용 스테인레스 호침(동방침구제작소, 0.25×30㎜)을 사용하여, 환측의 翳風(TE17), 耳門(TE21), 聽宮(SI19), 聽會(GB2), 天容(SI17)과 天牖(TE16) 주변 경결부, 양쪽 足三里(ST36), 合谷(LI4) 및 기타 증상에 따라 변증하여 穴位를 취하여 15-20분간 留針하였으며, 매일 2회 시술하였다.
침 전기 자극은 침구 치료 시, 환측의 耳門(TE21)-聽會(GB2), 天容(SI17)-扶突(LI18), 양측 足三里(S T36), 양측 合谷(LI4)을 연결하여 총 4쌍에 침 전기 자극기(ISO-ES-160, program 1)를 이용하여 전기 자극을 회당 15-20분간 매일 2회 시행하였다.
침 치료와 함께 무연 전자뜸(한상메딕스, On뜸기기)을 환측 聽宮(SI19), 흉쇄유돌근에 1개씩 부착하여 10분간 시행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탕전실에서 제조한 黃連解毒湯(黃蓮, 黃芩, 黃柏, 梔子)을 성분으로 하는 肩井 약침액을 사용하였다. 환측 翳風(TE17), 耳門(TE21), 聽宮(SI19), 양측 肩井(GB21) 주변 경결부, 扶突(LI18) 주변 경결부에 치료를 시행하였다. 약물은 1㏄ 일회용 주사기(화진메디칼, 한국)을 이용하여, 부위에 따라 깊이 0.5-1㎝, 한 부위당 용량 약 0.1㎖씩 총 1㏄를 매일 1회 주입하였다.
1일 2회, 仰臥位 자세로 15분간 환측 翳風(TE17)과 양 肩部에 부착하여 실시하였다.
부항 치료는 건식 부항과 습식 부항을 격일로 시행하였다. 습식 부항은 주 3회(월, 수, 금) 환측 翳風(TE17)과 양측 肩井(GB21)에 1회용 습식 부항컵 4호와 2호(성호통상)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건식 부항은 주 4회 환측 翳風(TE17)과 양측 肩井(GB21) 및 승모근 경결 부위에 시행하였다.
본 증례에서 이전 병원의 유발 반응 청력 검사(Fig. 1) 결과상 후미로성 병변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 본원에서 2020년 5월 15일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환측에서 모든 파형의 소실이 나타났다. 이에 2020년 5월 16일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하였고 2020년 5월 18일 판독 결과상 환측 내이도 안을 침범한 0.8㎝의 청신경 종양이 발견되었다. 이후 환자는 청신경 종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위한 3차 병원 진료를 원하여 퇴원을 진행하였다.
치료 후 좌측 이충만감, 어지럼증, 상부 승모근 통증 등 제반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Table 7). 청력 검사상 호전은 보이지 않았으며(Table 2), 치료로 인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Ⅳ. 고찰 및 결론
청신경 종양은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는 몇십 년간 발견되지 않고 자라난 크기가 큰 종양만이 주로 발견되었기에 발병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신경 종양 조기 진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일측성 난청에서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신경 종양은 500명당 1명을 초과하는 평생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7). 특히 7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8),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의 접근성 증가로 인해 직경 몇 ㎜의 작은 청신경 종양도 발견되고 있다7,8).
청신경 종양의 증상으로는 환자의 90%이상에서 나타나는 환측의 감각신경성 난청, 최대 61%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소실, 51%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이명 등이 있다3). 특히 돌발성 난청은 7-20%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9). 이에 양이 간 청력차이가 두 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단일 주파수에서 15㏈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청신경 종양 감별을 위한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 필요하다10).
돌발성 난청 환자 중 청신경 종양 환자는 1%에서 5% 사이로 보고되고 있으나5,6), 발견하지 못한 청신경 종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청신경 종양이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청신경 종양에 의한 와우의 미세혈관 손상, 와우 신경의 전도 장애 그리고 내림프 수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종양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와우의 미세혈관, 신경 등에 영향을 미치면 갑작스런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1).
청신경 종양 환자 중, 점진적 청력 손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자각하고 병원을 내원하기까지 오래 걸려 초기에 청신경 종양을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돌발성 난청은 환자가 즉시 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청신경 종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12). 청신경 종양은 크기가 작을수록 수술 후의 예후가 좋아,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과 청신경 종양의 임상증상은 유사하지만 치료 방법이 상이하므로, 난청에서의 청신경 종양에 대한 감별 진단은 필수적이다. 청신경 종양임에도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자연적으로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본 증례에서도 스테로이드 치료 과정 중에 PTA 109㏈에서 78㏈로 약 20㏈ 정도 청력이 회복되었다(Table 1). 이는 스테로이드의 작용을 통해 종양 내 액체가 흡수되고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여 신경 압박의 완화로 청신경 전도가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외 혈류 장애가 개선되어 청력이 호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로 청력이 회복되었더라도 청력 검사 및 청성 뇌간 반응 검사에서 이상 등이 나타난다면 청신경 종양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12).
청신경 종양은 순음 청력 검사 및 어음 청력 검사로 후미로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고, 청성 뇌간 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검사를 선별 검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청력검사 상 일측성의 고음역 난청이 있고 어음 명료도가 낮은 경우는 후미로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후미로성 난청인 경우에는 자극강도가 커질수록 점수가 더 떨어지는 롤오버(Roll over)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시행한다13). 청성 뇌간 반응 검사는 1㎝보다 작은 종양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져서 진단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어왔으나14),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 청신경 종양에 대한 청성 뇌간 반응 검사의 민감도는 93.4%로 보 고된 바 있다. 1㎝ 미만의 종양에 대한 민감도는 85.8%로, 1㎝ 이상의 종양에 대해서는 95.6%로 보고되어있다. 비록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이 가장 표준 진단 검사지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제한이 있는 조건에서는 후미로성 병변의 감별을 위해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임상적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15). 이에 청성 뇌간 반응 검사의 결과 값에 대한 숙련된 분석이 필요하며, 임상의들은 후미로성 병변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한다. 청성 뇌간 반응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들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8)15).
본 증례에서 이전 병원의 유발 반응 청력 검사(Fig. 1)를 살펴보면 Ⅴ파의 양이 간 잠복기의 차이가 0.25msec, Ⅰ-Ⅴ 파간 잠복기의 양이 간 차이가 0.29msec로 상기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계 값을 보이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Ⅰ-Ⅴ 파간 잠복기의 양이 간 차이가 0.2msec 이상인 경우에도 비정상으로 보기도 한다(Table 8)15). 그러므로 비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에 병변이 없었다 하더라도 표준 검사인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해볼 수 있다. 본원에서는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환측에서 모든 파형이 소실되어 보이지 않았다(Fig. 3).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한 결과 환측 내이도 안을 침범한 0.8㎝의 청신경 종양이 발견되었다(Fig. 2). 이후 환자는 3차 병원 진료를 원하여 퇴원을 진행하였다.
즉, 청성 뇌간 반응 검사의 청신경 종양에 대한 민감 도는 높다고 평가되지만, 작은 크기의 종양이나 내이도 내에만 존재하는(intracanalicular) 종양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청신경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자기 공명 영상을 표준 진단법으로 사용해야한다15). 이전 병원에서 비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에서 병변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특발성 돌발성 난청 치료를 진행해온 환자라도 기존 검사 결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후미로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표준 검사인 가돌리늄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재촬영을 통해 청신경종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3).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재촬영이 힘든 상황이라면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통한 감별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청신경 종양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한다.
한의학에서는 돌발성 난청은 耳聾에 해당한다. 《東醫寶鑑》에 따르면 耳聾은 원인별로 風邪가 침범하여 瘙痒感이 발생하면 風聾, 濕邪의 침범을 받아 귀 내부가 腫痛하면 濕聾, 오랜 설사나 중병을 앓은 뒤에 오면 虛聾, 精氣가 虛한 상태에서 힘든 일이나 房事를 하면 발생하는 勞聾, 五臟의 氣가 逆厥되어 발생하면 厥聾, 腎氣가 虛할때 風邪가 經絡에 침범하여 발생하면 卒聾 등으로 분류된다16).
본 증례 보고의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증상에 대한 걱정과 우울감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보였으며, 우울증과 관련된 설문지인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점수가 36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이에 환자를 鬱證으로 진단하여 加味逍遙散을 기본방으로 하여 증상에 따라 가감하였다. 수면 장애의 완화를 위해 酸棗仁, 柏子仁을 加味하였고, 식후 服滿으로 大腹皮, 木香을 加味하였다. 加味逍遙散은 鬱證에 사용하는 대표방으로 舒肝, 解鬱, 淸熱의 작용이 있어 七情鬱結로 인하여 발생하는 寒熱, 上氣, 頭暈, 脇痛, 倦怠, 女子經水不調, 心悸, 口苦 등의 症에 활용되고 있는 처방이다17). 癒風丹은 牛黃淸心丸을 기본방으로 한 처방으로 환자의 심한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조약으로 사용하였다.
본 보고에서 침 치료를 비롯한 여러 한방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부항 치료는 頭頸部 및 肩部, 背部 근육의 경결 또는 위축된 근육 등에 자극을 주고, 조직의 이완을 통해 청력 개선 및 이명, 이충만감 등의 증상을 개선시키고자 시행되었다18). TENS는 경피 신경 전기 자극 치료로, 돌발성 난청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이명 환자의 50% 이상에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돌발성 난청과 병발한 이명의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다19). 또한 肩井약침은 黃連解毒湯(黃芩, 黃蓮, 黃柏, 梔子)으로 구성되며 消炎, 鎭痛, 淸熱解毒, 淸熱止痛 등의 작용이 있으며, 頭痛 項强, 不眠, 熱性皮膚病, 心火, 肝痰火, 肺火 등에 응용한다20).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돌발성 난청을 주소로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전에 방문한 병원에서 특발성 돌발성 난청 진단 하에 표준 치료를 받은 후 2차적으로 내원한다. 이에 한의사들은 청신경 종양을 포함한 후미로성 난청에 대한 감별을 간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청신경 종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3) 기존 검사 결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를 시행하여, 후미로성 질환을 배제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한다. 또한 본 증례에서는 한방 치료를 통해 이충만감, 어지럼증 등의 제반 증상의 호전을 관찰하였다(Table 7). 청신경 종양에서 한방 치료를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제반 증상에 대한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Ⅴ. 요 약
-
청신경 종양 진단의 표준 검사는 두부 가돌리늄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성 뇌간 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받은 후,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서도 기존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후미로성 질환을 배제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한다.
-
비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 후미로성 질환을 배제한 환자에서도 임상적으로 후미로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준 검사인 가돌리늄 조영 증강 자기 공명 영상 재촬영을 통해 청신경종을 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신경 종양에서 한방 치료를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제반 증상에 대한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