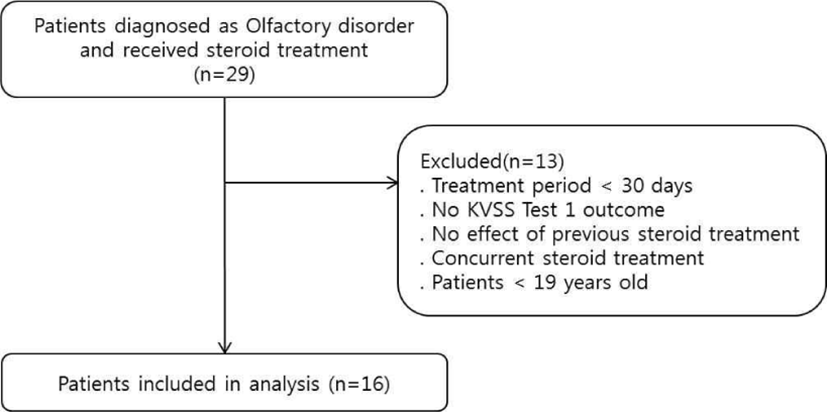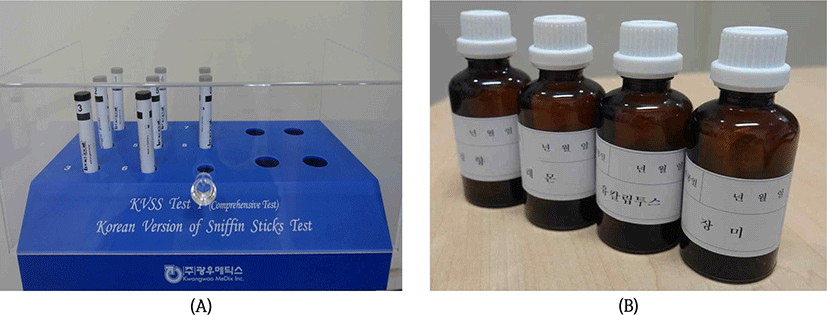Ⅰ. 서 론
후각장애는 냄새를 맡는 기능의 저하 혹은 완전한 상실로 냄새분자가 후각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후각 세포 또는 후각 신경에 이상이 생긴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뉜다. 후각장애는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후각식욕저하, 상한 음식 및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 증가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1). 유병률은 19-22% 정도이며2), 국내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3.8-24.5%로 보고되고 있다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국내에서 후각 및 미각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2014년 30,483명에서 2017년 36,60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4).
후각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상기도 감염이 18-45% 정도로 가장 흔하며, 이 외에도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과 같은 비부비동 질환이 7-59%, 두부외상이 8-20%로 흔한 원인에 속한다5). 후각장애는 약물치료, 수술, 후각훈련법이 주된 치료방법이다. 약물치료로는 경구 혹은 국소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이 외에 비타민B, 아연, 알파리포산(Alpha lipoic acid, ALA)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치료의 효과가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효과적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후각장애에는 제한적이며, 다른 약물들에 대해서는 치료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폐색, 비강내염증, 비용종 등을 제거하는 비중격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 내시경부비동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1).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등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는 거의 비부비동 질환으로 인한 후각장애에 제한적이며, 장기 투약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며, 스테로이드의 투여방법에 대한 확립된 방법이 없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후각의 호전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보고도 있다6).
현재까지 후각장애에 대한 한방치료에 관한 연구는 독일7) 및 중국8)에서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에 침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서 보고된 바로는 麗澤通氣湯을 활용한 증례 1례9), 當歸芍藥散을 활용한 증례 1례10), 비강내 침술을 병행한 후각장애 치험2례11), 한의약 치료로 호전된 만성부비동염으로 인한 후각장애 2례12)로 한방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보고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 후각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었으며, 내원 시 KVSS Ⅰ test(Korean Version of Sniffin' Sticks Ⅰ Test)를 통해 후각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환자 16명에 대해 후향적 의무기록 관찰을 시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방법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 후각장애를 주소로 방문한 환자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었으며, 한방 치료를 1개월 이상 지속하고, 치료 전후의 KVSS Ⅰ test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는 전신 및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시 변화가 없었던 환자와 사용 당시에는 후각기능이 회복되지만 사용 중단 시에는 다시 후각기능이 저하 혹은 소실되는 환자를 포함하였다.
후각장애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해서 치료 전후로 KVSS I test(KVSS I test, Kwangwoo MeDix Inc., Seoul, Korea)을 시행하였다(Fig. 2). KVSS I test은 선별검사로 0~4점이면 무후각증, 5~6점이면 후각저하증, 7~8점이면 정상후각을 뜻한다13).
탕약, 침, 전자뜸, 비강 내 약침액 점적, 후각재활훈련을 시행하였다.
-
① 한약
通竅湯, 仙方敗毒湯, 蠲痛導淡湯, 補心建脾湯을 각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하였으며, 2첩을 3포로 달여 1회, 1포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
② 침
멸균된 1회용 호침(stainless steel 0.25×30㎜,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용하였고, 15분간 유침하였다. 혈위는 百會(GV20), 上星(GV23), 印堂(EX-HN3), 迎香(LI20), 風池(GB20), 鏇機(CV21), 睛明(BL1), 列缺(LU7), 合谷(LI4), 曲池(LI11), 後谿(SI3), 足三里(ST36), 三陰交(SP6), 太衝(LR3)을 중심으로 취혈하였으며, 치료횟수는 주 1-2회를 기본으로 하여 시술하였다.
-
③ 뜸
전자뜸(CETTUM, HansangMedix, Gyeonggi-do, Korea)을 양 迎香, 百會에 10분간 유지하였으며 주 1-2회 침 치료 시 함께 시행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조제한 生地黃, 金銀花, 連翹, 黃蓮, 黃芩, 黃柏, 梔子를 성분으로 하는 소염제를 사용하였으며, 주 1-2회 양 비강 내에 0.25㏄씩 점적하였다.
장미(Rose pure essential oil, NATURE HUE, USA), 유칼립투스(Eucalyptus pure oil, KONI, Seoul, Korea), 레몬(Lemon pure oil, KONI, Seoul, Korea), 정향(Clove pure essential oil, NATURE HUE, USA)의 후각원 4가지를 제공하여 1일 2회, 총 12주간 시행하도록 하였다. 후각재활훈련 1회는 하나의 후각원을 10초간 냄새를 맡고, 10초간 환기한 후 다시 같은 후각원의 냄새를 10초간 맡기를 4가지 후각원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 1회 후각훈련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Fig. 2).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연령, 치료기간, 치료횟수, 유병기간, 후각장애 유형, 짐작되는 원인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치료전후의 KVSS I test 점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독립표본 T 검정,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고, 원인에 따른 치료효과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 과
총 16명의 연령은 38-70세였으며,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기간은 32-202일이었으며 평균 치료기간은 98.4일이었다. 치료기간 동안 내원한 횟수는 3-47회였으며 평균 내원 횟수는 17.8회였으며, 발병 후 본원에 내원하기까지의 유병기간은 5-3795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유병기간은 530.5일이었다. 처음 내원 당시 호소한 후각장애의 유형은 후각저하증이 무후각증보다 많았다. 추정되는 원인은 감기 후유증이 가장 많았으며 특발성, 비부비동질환, 두부외상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환자들의 특성에 따른 KVSS I test 점수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치료를 받은 군과 3개월 이상 치료 받은 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횟수가 18회 미만인 군과 18회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발병일로부터 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530일을 기준으로 군을 나누어 관찰하였으나 두 군 간에 KVSS I test 점수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상기도 감염이 원인인 후각장애에서 KVSS I test 평균 점수는 3.8±2.3점에서 5.5±1.8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7). 그러나 특발성인 경우 2.6±3.7점에서 3.2±2.9점으로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93). 또한, 모든 환자의 치료 전 KVSS I test 평균 점수는 3.3±2.8에서 4.2±2.5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89)(Table 3).
Ⅳ. 고찰 및 결론
후각장애의 치료에서 독성 약물에의 노출, 신경퇴행성 질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 후각 수용체 뉴런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후각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상기도 감염 혹은 두부외상이 원인인 경우에는 효과가 적다3). 한 연구에 따르면 무후각증을 나타내는 두부외상성 환자들과 후각저하증을 보이는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한 후각장애 환자는 단기간 추적관찰한 결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부외상성 후각장애 환자와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5년 뒤 추적관찰한 결과 각각 35%, 67%에서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호전속도가 느려 단기간에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고 하였다14). 이처럼 스테로이드 치료의 효과가 원인에 따라 제한적이며,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후각장애의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시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한계가 있어 스테로이드 외의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 후각장애에 대한 한방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치료기간, 치료횟수에 따른 치료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각장애에서 고령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5) 60세를 기준으로 60세 미만인 군과 60세 이상인 군에서의 KVSS I test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3), 유병기간에 따른 치료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원인에 따른 치료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비부비동 질환, 두부외상, 특발성이 원인인 경우는 치료 전후의 KVSS I test 점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기도 감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 환자에게 한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록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의 1년 자연경과 시 30%에서 후각기능의 회복을 보인다는 보고1)는 있지만, 3개월 내외의 치료로 후각기능향상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기도 감염은 비점막 부종을 유발하여 전도성 후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비점막 부종이 완화된 이후에도 후각장애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후각장애는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분류한다10).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는 바이러스 자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후각 상피 세포의 직접적인 손상 또는 후각 신경로의 변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후각 신경은 수용체 세포 말단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손상에 취약하지만 중추신경계에서는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하며, 후각 신경의 재생에 의해 후각기능의 자연적인 회복이 가능하다16). 이에 후각상피의 세포자멸사와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후각 신경의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후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7).
침 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염증효과, 신경보호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17). 특히 침 치료 혈위 중 百會, 上星, 迎香 등은 기존에 특발성 및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한 후각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들에서 무처치군에 비해 후각기능검사 점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合谷, 太衝에 전침 치료를 시행할 경우 BDNF 발현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BDNF는 후각신경계의 유지와 재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0). 또한 후각신경의 재생을 위해 후각훈련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12주간의 후각훈련이 상기도 감염 및 두부외상이 원인인 후각장애 환자에서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8). 상기도 감염 후 후각장애에 대한 한방치료의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한방치료가 후각신경의 재생에 일정한 역할을 해 후각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 대조군이 없고, 분석한 환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후각장애의 호전 여부 판단은 KVSS Ⅱ test의 TDI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 KVSS Ⅱ test는 후각 역치검사(Olfactory threshold test), 후각 식별검사(Odor discrimination test), 후각 인지검사(Odor identification test)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검사의 점수를 합하여 TDI 점수로 산출한다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별검사인 KVSS Ⅰ test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KVSS Ⅱ test로 평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후각장애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관찰하였으며, 한방치료라는 대안을 제시할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